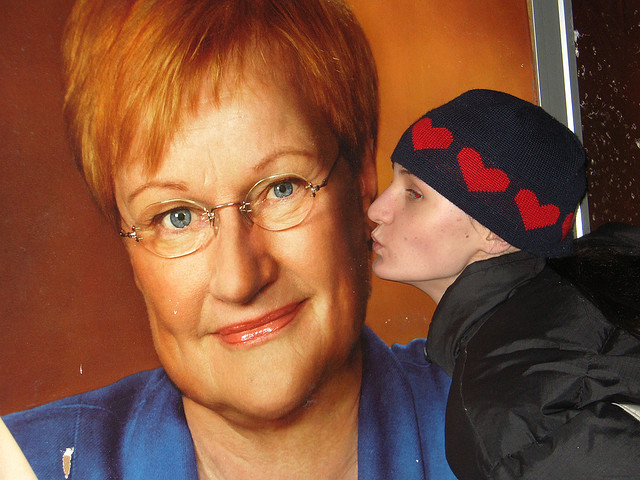[divide style=”2″]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이야기
- 세월은 추억을 남기고, 학교는 사랑을 남기다
- 추억은 따뜻하고, 기억은 촉촉하다
- “태기산에 가면 밥도 공짜, 집도 공짜”
- 태기산 화전 마을의 창세기
- 태기리 화전마을의 주택 변천사
- 천 년 원시림을 불태우는 거대 화전(火田)의 불길
- 낯설고 신기한 강원도의 ‘제5 계절’
- 궁즉통의 묘수, ‘덤벙짠지’를 아시나요?
- 태기산 ‘약초 한우’ 목장의 추억
- ‘하늘 아래 첫 학교’ 꿈은 이루어진다
- ‘처녀 선생님’은 길 잃은 선녀가 아니었어요
- 학교의 힘, 정식 학교의 힘
- ‘시작이 반’이라는 만고의 진실
- 학교는 추억의 보물창고
- 태기리 1966, 그해 겨울은 따뜻하였네
- ‘하늘 아래 첫 학교’ 서울까지 대서특필
- 희미한 ‘옛 학교’의 그림자
- 삶의 고통을 어루만진 세월의 선물 (끝.)
[divide style=”2″]

■ 단군 이래 최대 화전(火田)
아름드리 고목에 머루며 다래, 으름덩굴들이 밀림처럼 뒤엉킨 원시림을 비집고 나무를 찍어내기 시작하여, 임도(林道)를 내고, 그 길로 제무시 트럭들이 드나들며 제대로 산판(山坂)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나무를 비워낸 자리에는 집들이 들어서서 마을을 이루었고, 마을에 집들이 늘어날수록 나무들은 점점 더 빨리 베어져 묵묵히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태가 지났습니다.
이제 산판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목재가 목적이었다면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산판을 확대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만, 애초 태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으니까요. 화전민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농업단지, 철혈통치 대통령의 한 마디로 시작된 ‘태기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화전(火田)이었습니다. 태기산 정상의 분지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화전. 그것도 세상을 피해 숨어든 화전민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연한 화전.
화전을 준비하는 동안 ‘제무시’ 트럭들은 나무를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실어냈습니다. 화전은 마을 옆 골짜기부터 시작해야 하였으므로, 먼저 안전을 위한 방편을 고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할 방향의 나무들을 2차선 도로 폭만큼 베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흡사 바리캉으로 더벅머리 아이들의 머리에 도로를 내듯, 골짜기 가장자리를 따라 매끈하게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목재는 ‘제무시’ 트럭에 싣고, 못난이 나무들이며 쳐낸 가지들은 골짜기 아래에 쌓아두고 말려 불쏘시개로 준비합니다. 다른 산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산등성이 부분은 더욱 두텁게 나무들을 베어내 여유를 두었고, 양쪽 가장자리에서 동시에 맞불을 놓아 중앙에서 불이 만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골짜기에 불을 붙이는 날이 왔습니다. 태기리 살림이란 것이 워낙 열악하여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을 퍼나를 용기조차 변변치 못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얼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나마 태기리 마을 사람들 가운데 불을 다뤄본 화전 전문가들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변수였을 정도입니다.
■ 골짜기에 불을 놓는 운명의 아침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림픽 성화에 점화를 하듯, 미리 말려둔 나뭇가지 불쏘시개들을 골짜기 이곳저곳에 적당하게 배치해두고 관솔 횃불로 일제히 불을 붙입니다.
“횃불은 광솔(관솔의 사투리)이나 소나무 뿌리 썩은 걸 잘게 쪼개 횃불에 묶어서 불을 붙여 사용하는데, 그것들도 태기리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화동리나 신대리까지 가서 구해서 지고 올라왔어요.”
불길은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산 속에서 몰래 화전을 일구던 소규모 산불과는 애초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화염과 열기가 ‘불밭’ 전체를 후끈 달구었습니다. 화르륵… 후드득… 우지끈… 퉁탕…, 불길에 쓰러지는 아름드리 나무들의 아우성으로 골짜기 전체가 일대 아수라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합니다. 불길은 열흘가량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극지방의 백야(白夜)처럼, 낮도 밤도 구분 없이 뜨겁고 요란한 불야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늘까지 그을리려는 듯 불꽃과 불티들이 거대하게 회오리치며 일렁이고, 매캐한 연기와 냄새는 허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골짜기가 불타는 동안 마을의 장정들은 비상 대기조를 짜서 잠 잘 틈도 없이 교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였습니다. 대비라고 해봐야, 예컨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옆 골짜기로 옮겨 가기라도 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낫과 톱으로 소나무나 잣나무 가지들을 잘라내어, 불씨를 두들겨서 끄는 정도의 임시방편에 불과했지만요. 비상대기조 덕분인지 하늘의 보살핌 덕분이었는지, 태기리 화전 작업 중에 옆 산이나 이웃 군으로 불길이 번진 사례는 지적되지 않았으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여전히 유효하였나 봅니다.
태기리 산불 작업 가운데서도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름드리 거목들이 보름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는 대목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화염이 다 스러져 골짜기 전체가 시커멓게 재가 된 뒤에도 거목은 뜨겁게 불붙은 몸으로 난데없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밤이면 여기저기 남아서 불타고 있는 거목의 잔해가 흡사 호랑이의 안광(眼光)과도 같아서, 사람들은 이를 ‘호랑이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아름드리 나무들은 뿌리가 엄청나서, 화전을 일구려 해도 캐낼 수가 없어요. 타고 남은 그루터기가 사람 키만 해. 그래서 다시 거목의 그루터기를 태우기 위해 ‘화덕불’을 놓았어요.”
그걸 ‘화덕불 쌓는다’고 했다지요. 그루터기 위까지 충분히 덮을 만큼 마치 나무로 자그마한 왕릉을 쌓듯이, 통나무와 나뭇가지들을 켜켜이 쌓아올리고는 다시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불덩어리 왕릉’이 며칠 밤을 환하게 밝히다가 스러집니다. 그 잿더미를 파헤쳐보면 그루터기 안쪽으로 커다란 구덩이가 생길 만큼 뿌리 속까지 타들어가서 재가 되었다 합니다.
■ 거목의 그루터기를 재로 만드는 ‘화덕불 쌓기’
한 골짜기가 새까매지면, 다음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골짜기를 선택하고 불을 붙이는 데에 이렇다 할 방향도, 원칙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번에는 저기다가 해보자”하면 잠시 왈가왈부를 거친 뒤에 우르르 몰려가서 골짜기 가장자리에 2차선 도로 넓이로 나무를 베어내고, 목재를 실어내고, 나머지 잔챙이 나무들과 나뭇가지들을 쌓아서 말려 불쏘시개를 만들고….
보름 남짓 새 골짜기가 불타는 동안 대기조 이외의 인원들은 이전에 태워둔 골짜기를 정리합니다. 타다 남아서 전봇대처럼 솟아 있는 나무 줄기들은 톱으로 잘라내어 움푹 패인 저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했습니다.
산불과 산불 사이, 베어낸 나무들을 목재로 다듬어내는 시간 간격이 점점 길어지자 산판업자들도 시나브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토막집’이 바로 이 무렵에 생겨난 신형 주택입니다. 방화 목적으로 골짜기 가장자리에서 미리 베어낸 아름드리 나무들이 산판업자가 떠나는 바람에 주체를 못하게 쌓여가자, 누군가 통나무집을 떠올리며 새로 개발한 주택양식이 ‘토막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잿더미 땅에 계단식 밭을 만들 차례입니다. 타다 남은 나무 줄기들을 베어내고, 아름드리 거목의 그루터기를 ‘화덕불 쌓기’로 불태워 재를 만들고 나면 비로소 잿더미 골짜기를 개간해서 밭을 만듭니다. 계단식 밭은 위에서부터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산불 작업은 위험한지라 마을의 전체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였는데, 계단식 밭 개간과 관련해서는 작업 선정과 성과 나누기 등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을 말해주는 증언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중구난방의 증언을 추려서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개간 위치와 일정 등을 주도하는 리더가 있었고, 당시 태기리 마을의 지위와 산불 및 개간에 참여하는 장정의 수 등에 비례하여 볕과 목이 좋은 밭의 관리권이 정해지는 방식이었던 듯합니다. 밭 개간 작업에는 태기리 이외의 지역에서 막일을 하러 온 일손들도 꽤 있었던 듯한데, 대개는 하루 일당만큼의 배급을 받는 것에 그치고 밭 경영 권한에 참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기리 주민 가운데서도 딸이 많은 경우거나, 자식이 일찍 장성하여 타지로 나간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도 제대로 대접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화전과 화전 사이 자그마한 자투리땅에 스스로 불을 놓아 화전을 일구거나, 불을 놓지 않고 나무만 베어낸 뒤 땅을 갈아서 만든 사전(私田)들도 적잖이 생겨났습니다.
■ 벌거숭이 꼬마 아이들까지 불구경을
지나고 보면 아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 거칠고 위험천만한 산불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골짜기 아래 공터에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장정들의 새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에 마을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불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입성이 태부족이라 아랫도리를 훤히 내놓고 돌아다니는 깨복쟁이 꼬마들까지 마구 뒤섞여서 말이지요. 고래로 ‘재미난 3대 구경거리’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게 불구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거친 산불 현장에 코흘리개 아이들을 얼씬거리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렇습니다. 구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끼니를 때울 곳이 바로 저 산불 놓는 현장 옆의 공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다 산불 놓으러 나가고, 여자들도 현장 공터에 새참 지으러 가거나 산으로 나물이며 버섯이며 열매 채취하러 나가고, 그렇다고 집 안에 아이들 식사를 미리 만들어둘 형편도 아니고…. 결국 새참이래야 밀가루 수제비거나 ‘붕시레미(감자를 긁어내 밀가루와 섞은 것을 끓는 물에 넣어 익힌 수제비 사촌)’ 따위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아이들에게는 먹거리와 불구경이 공존하는 현장 공터야말로 천국이 아니었을까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