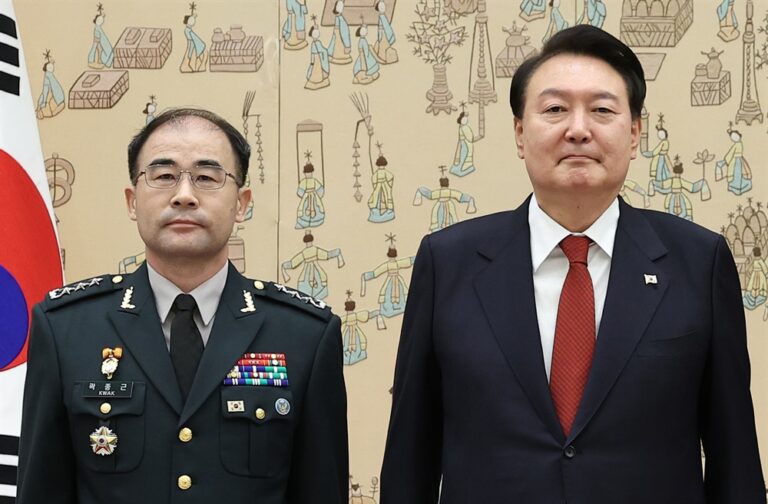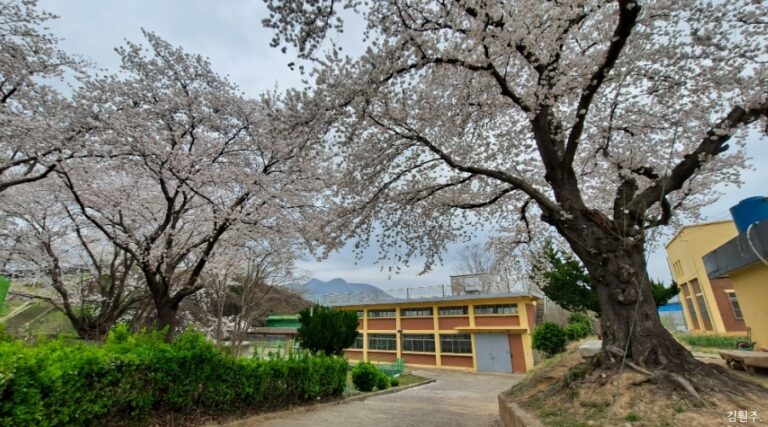[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생태관광 1번지 창원 주남저수지의 모든 것(연재) (⏳4분)
일러두기
경남 창원에는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찍이 철새 도래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저수지이지만 자연경관이 인공저수지답지 않게 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는 드넓은 평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20년 전만 해도 흔적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와 일대 평야가 어떻게 해서 들어서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보는 보람과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2021년 12월 발행한 창원시의 비매품 책자 ‘주남저수지 이야기-주남저수지의 역사와 생태’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매품은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열두 차례에 걸쳐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북부배수문
북부배수문은 유등중앙배수문에서 서쪽으로 2km 남짓 떨어진 대산면 북부리 198-2 일대에 있는데 길이가 40m 안팎입니다. 창원농지개량조합(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 바로 옆에 북부1배수장과 배수문을 새로 만든 1984년부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암반을 뚫고 통로를 네 개 내었는데 상하좌우의 바위 표면을 모두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았습니다.
동아일보 1927년 9월 7일자 보도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당시에 축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36년 8월 대홍수로 여기 제방이 무너졌으므로 그 뒤 복구 과정에서 설치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1916년 처음 측량하고 1930년 두 번째 측량한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면 유등중앙배수문 부분은 수로가 제방 너머까지 표시돼 있지만 북부배수문 부분은 수로가 제방을 넘지 못하고 안쪽에 멈추어 있습니다.
우암배수로 수문
대산면 유등리 434-12 동곡양배수장 앞 수로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천강으로 물을 빼내고 홍수 때는 낙동강의 역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1927년 대산수리조합이 자연암반을 뚫어서 만들었는데 너비가 4척이었습니다.

산남저수지
주남저수지를 구성하는 세 저수지(주남∙산남∙동판)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 산남저수지였습니다. 1927년 동면수리조합이 자연 습지로 있던 산남지를 3분의2 정도에서 잘라 면적 75정보에 이르는 저수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1927년 10월 15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일대 농지에 대한 물을 대기 위한 수원으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인 1925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도 산남저수지가 표시돼 있는 것을 보면 1927년의 조성은 아무래도 확장·증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남저수지는 이후 만들어지는 주남·동판 두 저수지와 함께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농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역할도 겸했습니다.
주남·동판저수지
1925년 지도를 보면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신 자연 상태 소택지들과 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927년 10월 15일자 동아일보 보도에도 산남저수지는 기사에 나오지만 주남과 동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동판과 주남저수지를 이루는 제방은 촌정농장에서 1907년에 일찌감치 쌓아 놓았지만 거기에 물을 모아두고 저수지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은 그 이후 어느 시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곡 저수지
봉곡저수지는 산남저수지를 보조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동읍 봉강리와 봉곡리의 서쪽에 걸터앉은 백월산에서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임시로 모아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남저수지에 물이 모자라면 그리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낙동강으로 방류했습니다. 산남저수지의 북쪽 끝자락(동읍 봉곡리 100)에 조그맣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포 터널
동읍 봉강리 429 일대 일명 분산고개 아래 흙을 파서 만든 터널입니다. 홍수가 나서 산남저수지가 넘칠 지경이 되었을 때 낙동강으로 바로 물을 빼내는 낙동방수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산남저수지에서 분산고개까지는 오르막이고 분산고개에서 낙동강까지는 내리막입니다. 보기 드물게 산을 넘는 인공 물길인 셈입니다.
길이가 122m 남짓으로 겉모습과 내부가 모두 콘크리트로 처리되었습니다. 터널로 뚫린 부분은 너비가 8m 정도이고 높이는 3~4m인데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가운데가 가장 높습니다. 정면과 뒷면의 표면을 콘크리트로 마감한 부분은 높이가 6m 정도 너비가 12m가량으로 짐작됩니다.


정면 한가운데에 세로 80cm 가로 50cm 크기로 박혀 있는 돌액자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윗줄은 ‘대정 12년 5월 준공(大正 十二年 五月 竣工)’이고 아랫줄은 ‘본포수도(本浦隧道)’입니다. 대정 12년은 서기 1923년이고 본포는 터널이 놓여 있는 분산고개와 그 너머까지를 이르는 지명이며 수도는 터널의 일본식 한자표현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장락길(長樂吉)’이 세로로 새겨져 있는데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주남저수지와 대산평야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근대농업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 명칭과 준공 시기가 적혀 있는 시설물은 이 본포 터널과 뒤에 나오는 주천 갑문 두 개가 전부입니다.
분삼배수문
분삼배수문은 제1호 터널 바로 동쪽에 붙어서 동읍 노연리 710-4 일대에 있습니다. 홍수 때 불어난 물을 북쪽 낙동강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시설물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본포 터널과 짝을 이루는 농업시설이므로 1923년 즈음 본포 터널과 동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