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훤주 칼럼] 경남도민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한 필자가 부산과 창원에서 오랫동안 판사 생활한 문형배(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 여러분과 나눕니다. (⏳4분)
👨⚖️문형배 이야기
가족이 모두 이사한 까닭은
1965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문형배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1992년부터 줄곧 부산·경남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이 그의 근무처였다. 이른바 엘리트 법관의 출세 코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법원행정처에서는 일한 적 없는 100% 지역법관이었다.
문형배는 2004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처음으로 부산을 벗어나 창원지방법원으로 옮겨왔고 그때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 합의재판부인 제2형사부와 제3형사부를 맡아 일했다. 당시 부산에 집을 마련하고 살았던 그는 창원지법 발령이 나자 아내와 아들 등 가족을 모두 데리고 창원으로 이사했다.
지금도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산이 원래 본거지였으면 창원으로 출퇴근하거나 가족은 두고 혼자만 오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나 검찰의 구성원만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 대학의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발만 지역에 걸치고 머리는 대도시를 향하는 모양이지만 다들 그러려니 여기는 것이기도 했다.

지역법관 하려면 지역을 알아야
나중에 좀 친해진 뒤에 가족은 두고 혼자만 옮기면 더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대답은 간단했다. “지역법관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지역에 대해 알려면 지역에 들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 전학 등 교육상 불편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했다.
그런 단순한 이치를 나는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문형배가 높은 법대에 앉아 피고인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행한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재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법정을 찾는 지역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는 똑바로 알지 못했다.
2005년 8월 김정부 국회의원 아내의 유권자 매수 사건 선고에서 1960년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를 그가 입에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의거 와중에 숨진 김주열 ‘님’”과 “시위에 참여한 장애 시인 이선관 ‘님’”, 그리고 “‘3·15시민회관’ 명칭 등 민주 성지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산”을 콕 집었었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15의거와 김주열 열사는 널리 알려져 있으니 오히려 예사로 들렸다. 하지만 지역민도 잘 모르는 장애 시인 이선관과 그의 시위 참여를 언급한 것은 새삼스러웠다. 또 3·15시민회관 명칭 운운은 1962년 지은 옛 회관이 헐리는 것과 새 회관이 건축 중인 것을 모두 알아야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시 헐리는 보도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다.
이렇듯 지역에 진심을 다한 그였기에 2019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지방에 살아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을 자주 절감했다. 헌법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방자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의 의지가 장식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이나 수도권 법관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였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에게서 평소에도 몇 번 들은 말이었다. 물론 그가 지난 6년 동안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다 나중에 만나져서 물으면 “자, 보세요.” 하면서 안경 너머로 두 눈을 반짝이며 하나하나 설명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역으로 돌아가 받은 것을 돌려줄 때
이처럼 시작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문형배가 이제 4월 18일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다. 내 기억에 그는 임기가 끝나면 지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서울에서 또다른 고관대작으로 남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부산이 될지 진주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어디가 될지는 돌아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처음이고 유일한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에 문형배 이전에 있었던 지역법관 출신 헌법재판관은 김종대(2006~12년) 1명이고 대법관은 조무제(1998~2004년)와 김신(2012~18년) 2명이다. 그들은 모두 문형배더러 본받으라는 듯이 한결같이 지역으로 돌아가 활동을 이어가는 모범을 보였다.
내 기억에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나서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변호사 개업만 해도 전관예우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돈을 벌 텐데 그는 그런 데 뜻이 없는 사람이었다. 까닭을 묻는 나에게 그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았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받은 것을 돌려줄 때라는 얘기로도 들렸다.
어쨌거나 그가 퇴임하면 아쉽게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중에 지역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인구 기준으로는 서울이 3 지역이 7 정도가 맞지만,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지역 출신이 2~3명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인식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은 사법부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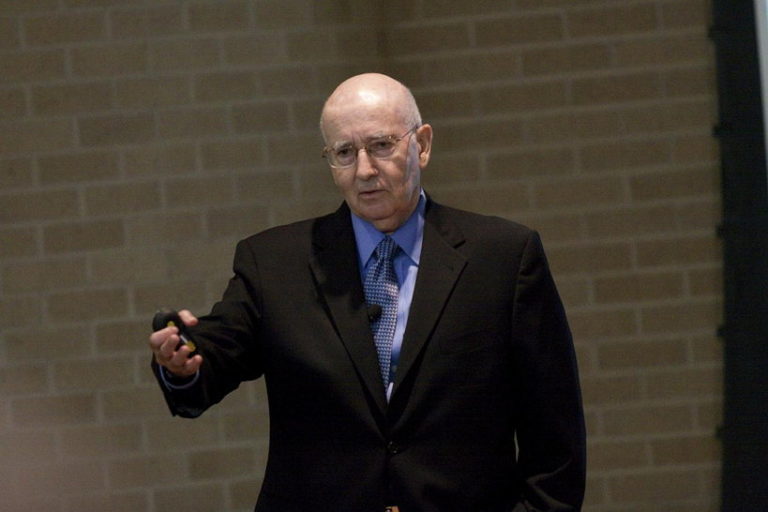




기자님. 오늘 문형배 재판관님 퇴임사를 다른 기사에서 보고 기자님 성함을 알게 되어 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에 법조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님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