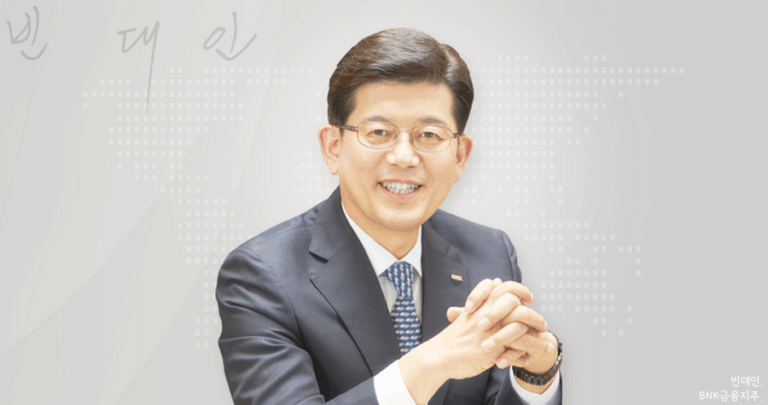[슬로우스팟] 측근으로 이사회 구성, 경쟁력 후보 들러리 세우는 관행… 연임 가능성 높지만 지배구조 건전성 우려. (⏳3분)
🔑 관련 기사: BNK금융 회장 선임 코앞, 민주당 “현 회장 빈대인 사퇴하라.” (2025.12.05)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이 확정됐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2일 숏리스트를 4명으로 압축했다. 우리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은행장 정진완,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이다. 외부 후보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했다.
임추위원장 이강행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 승계 규정 및 승계 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특히 외부 후보군 대상으로는 그룹 경영 현황 자료 제공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외부 후보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내외부 후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한 달여간 4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 계획 PT 발표, 심층 면접 등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이달 안에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차기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금융지주회사*는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 산업은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사업인데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점 구조다. 금융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 리스크도 안고 있다.
- 경영진이 셀프 연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주인 없는 회사의 대리인 딜레마(Governance Failure)에 빠질 수도 있다.
- 정부 개입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자칫 관치 금융에 빠질 우려도 있고 금융이 정치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
- 그래서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이 중요하다. 공정한 절차와 함께 주주 가치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우리·신한·BNK금융 회장 선출 국면.
- BNK금융 임추위는 8일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현재 후보 4인은 BNK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방성빈, BNK캐피탈 대표 김성주, 전 부산은행장 안감찬이다.
-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를 4일 확정한다. 4일 오전 현재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 4인 후보는 신한금융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정상혁, 신한투자증권 사장 이선훈, 외부 후보 1명 등 총 4명이다.
- 3개 금융지주 회장 모두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권 겨냥한 이찬진의 직격 “이사회에 자기편 심어”
-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 쓴소리를 남겼다.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후보자도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분을 들러리로 세운다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 그럴까’ 살펴보니 (기존 회장들이)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점이 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찬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주 회장이 된 뒤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직격했다.

- 특히 BNK금융지주 선임 절차에 관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 검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다.
- 부산 지역지인 부산일보는 이찬진을 겨냥해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금감원의 ‘모범 관행’을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데다 신한·우리금융도 같은 절차로 회장 인선을 추진 중인데 유독 BNK만 문제 삼은 대목은 의구심을 낳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금감원이 구성할 TF에 관심이 모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께 8대 금융지주·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최고 경영자가 ‘셀프 연임’을 위해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의도적으로 경쟁력 없는 후보를 들러리 세우는 관행은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