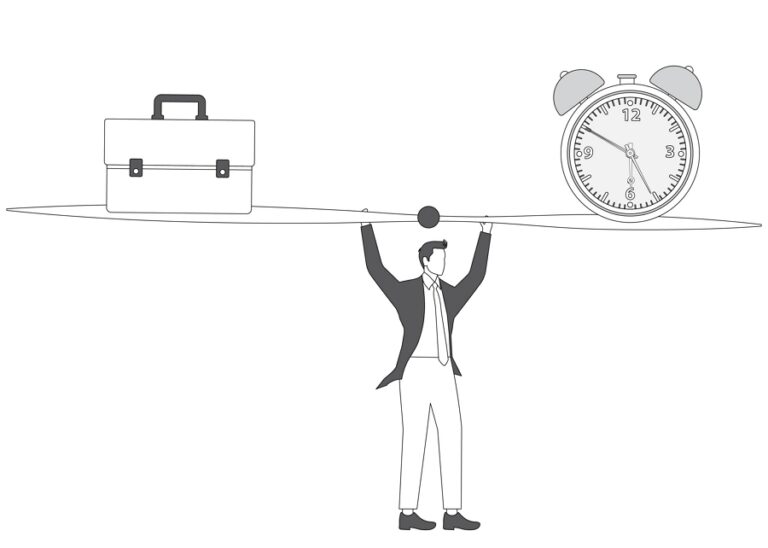“We don’t pay enough attention(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였던 로렌 블룸스타인(Lauren Bloomstein)은 그가 일하던 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딸을 낳은 뒤 20시간 만에 숨졌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00년까지만 해도 산모 10만 명 가운데 9.8명이 죽었는데 2014년에는 21.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프로퍼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거나 아이를 낳은 직후 죽은 여성이 1년에 최대 900명에 이른다. 미국 여성들을 캐나다 여성들보다 출산 이전 1년에서 출산 이후 1년 사이에 죽을 확률이 세 배나 높다. 스칸디나비아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섯 배나 높다.

프로퍼블리카는 2016년에 출산 전후로 사망한 산모 134명을 추적 조사해서 ‘Lost Mothers(잃어버린 엄마들)’라는 연속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뒤지면서 산모 사망 사건의 사례를 수집했고 가족들을 접촉해서 설득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망 원인을 추적해서 분석 기사를 작성했다. 미국의 경우 산모 사망의 13%가 출산 6주 이내에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60%는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6만5000명 정도의 여성이 출산 전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는다고 한다. 영아 사망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산모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원인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로렌 블룸스타인의 사망 원인은 흔히 임신 중독이라고 부르는 자간전증(pre-eclampsia)이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자간전증으로 죽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해마다 50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연결되는 방식과 구조를 읽어야 한다.
프로퍼블리카와 인터뷰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맙소사, 우리는 환자들에게 산후 건강 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훈련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산모가 아니라 아기에게 관심을 집중했죠.”
실제로 로렌 블룸스타인의 병원에서는 신생아가 위독하다고 판단되면 중환자실로 옮기는데 산모들은 갑자기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미국 전체를 봐도 고위험군 아기를 위한 병원은 있었지만 고위험군 산모를 위한 병원은 없었다. 산모들은 퇴원을 앞두고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지만 스스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아이를 낳을 때는 통증이 따르기 마련이고 아기를 낳고 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로렌의 죽음은 비극이 어떻게 반복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준다. 마침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주말에 출산하는 산모는 사망 확률이 50%나 더 높다. 출산 한 시간 뒤 로렌의 혈압은 160/95까지 치솟았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부터 평소보다 혈압이 높았지만 병원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영국은 고혈압 병력이 없는 산모의 혈압이 140/90을 넘으면 자간전증을 의심하고 수축기 160을 넘으면 최대한 빨리 황산마그네슘 치료를 시작한다는 등의 지침이 있었만 로렌의 병원에서는 180/110을 컷오프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로렌은 출산 직후 “기분이 좋지 않다(I don’t feel good)”고 말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식사를 하지 못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로렌의 남편이 혹시 자간전증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의사는 식도염증 같다고 판단했다. 제산제와 진통제를 투여했으나 모두 토해냈고 상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자간전증 테스트를 했지만 진단 기준을 넘지 않았다. 가슴에 통증이 있고 혈압이 치솟을 경우 자간전증을 의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단순히 예 아니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산모 사망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로렌의 경우 자간전증 진단을 받은 건 4시간이 흐른 뒤였다. 혈압이 197/117까지 치솟았고 급기야 바빈스키 검사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의사가 “희망이 있다”고 말했지만 로렌은 뇌출혈을 일으켰고 뒤늦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도착해 수술 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혈소판이 부족했다. 다른 병원들에 수소문을 했지만 혈소판이 도착하기까지 다시 몇 시간이 흘렀다. 로렌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였다.
프로퍼블리카는 단순히 비극을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를 파고 들었다. 부부가 모두 병원에서 근무했던 로렌은 다른 산모들과 비교해서 의료 접근성이 훨씬 높은 편이었다. 최고의 동료 의료진들이 로렌을 돌봤고 특별 대우를 받았다. 문제는 로렌 같은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이를만큼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로렌의 죽음 이후 조사가 진행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보고서에서는 간호사들이 혈압을 제때 체크하지 않았고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 결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의 실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간호사들에게 산전 기록과 혈압을 비교하고 4시간 마다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라는 등의 원론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별다른 징계 없이 끝났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는 이야기다.
영국은 달랐다.
렌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자간전증으로 죽는 산모가 1시간에 5명 꼴이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영국의 대응은 달랐다. 앤드류 셰넌은 “자간전증으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Are most maternal deaths from pre-eclampsia avoidable)”라는 논문에서 “영국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훨씬 더 안전해졌다(Being pregnant in the UK has never been safer)”고 평가했다. 자간전증 사망자 가운데 63%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의심할 여지 없이 피할 수 있다(undoubtedly avoidable)”는 이야기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산모 사망 사건이 문제가 되자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의료 기록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필요하다면 공개 심문을 열어 병원과 의료진이 직접 해명을 하도록 했다. 영국은 자간전증 사망자가 2012~2014년 3년 동안 2명으로 줄었다. 사망률은 100만 명당 1명. 반면 미국은 자간전증으로 죽는 산모가 여전히 1년에 50~70명, 전체 산모 사망의 8%를 차지했다.
뒤늦게 미국에서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 사망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산부인과 의사들의 연구 모임인 CMQCC(California Maternal Quality Care Collaborative)는 출혈과 자간전증의 경우 각각 70%와 60%의 비율로 예방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이 제안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 수술 도구를 담은 출혈 카트를 둔다. 다섯 개의 서랍이 달린 바퀴달린 빨간색 카트 안에 바크리 풍선과 IV라인, 산소 마스크 등의 모든 필요한 장비를 담았다. 둘째, 간호사나 의사가 감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혈액을 수집해서 무게를 측정하도록 한다. 스폰지와 패드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출혈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위기 프로토콜을 만들고 반복해서 훈련한다. 황산마그네슘만 제때 투여했어도 로렌은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NPR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툴킷을 채택한 병원들은 1년 만에 사망률이 21% 줄어들었다. 툴킷을 채택하지 않은 다른 병원들이 1.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변화였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산모 사망률은 55%나 줄어들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산부인과 병원 가운데 88%가 이 툴킷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출산의 95%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프로퍼블리카의 지적이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cookbook medicine(요리책 의학)’라고 불렀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돌발 사건이 쏟아지기 마련이고 “설탕 세 스푼에 우유 반 컵”처럼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그때그때 뒤섞는 것보다 표준화된 방식을 선택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레시피를 도입하라고 설득하는 전문가들과 현장의 감에 자부심을 갖는 의사들의 갈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특히 작은 병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한다. 1년에 500명의 아이를 받는 병원에서는 몇 년 동안 산모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는 게 맞다.
프로퍼블리카와 NPR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시리즈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사례로 소개되는 기사는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첫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구조를 이해해야 하지만 개별 사례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추적한다. 넷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실수와 실패를 피하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외과 의사인 아툴 가완디는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다음은 아툴 가완디의 뉴요커 기고 가운데 일부다.
“우리는 단순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의학에서는 카테터를 삽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든지 심혈관 모니터에 일직선으로 가로줄이 나타나는 심장마비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칼륨 과잉 투여라는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든지 등이 바로 단순한 문제에 속한다. 법률 업무에서는 탈세 사건을 변호하는 주요 방법을 모두 기억해 내지 못했거나 다양한 법정의 마감 시간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단순한 문제가 생긴다. 경찰 업무에서는 목격자가 용의자의 얼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줄로 정렬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목격자에게 줄을 선 사람들 중에 용의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깜박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거나 목격자가 있는 자리에 용의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는 등 단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이처럼 기본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캐나다 요크대학교 교수 브렌다 짐머만(Brenda Zimmerman)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간단한 문제와 복잡한 문제, 복합적인 문제다. 이를 테면 케이크를 굽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다. 달에 로켓을 보내는 건 복잡한 문제고, 아이를 키우는 건 복합적인 문제다. 로켓을 쏘는 건 복잡하지만 한 번 성공하고 나면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다르고 날마다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것이다.
가완디는 “복잡한 일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현대인이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크리스트”라고 강조한다.

가완디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술 도중 죽는 사람이 15만 명인데 이 숫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세 배 규모다. 가완디는 병원에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만 있어도 의료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다. 가완디는 “현대 의학도 B-17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4만 명 이상의 외상 환자들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1224가지 증상을 포함한 3만 2261건의 조합이 있었다. 가완디의 표현에 따르면 3만 2261대의 완전히 다른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과 같은 모험을 일상적으로 치러야 한다.
뉴요커의 기사가 2007년 기사라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이란 말이 유행하기 훨씬 전에, 그리고 기자가 아닌 의사가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델 같은 기사를 쓴 것이다. 단순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문제에서 해법의 아이디어를 얻고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지나치게 단순해서 오히려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완디에 따르면 의사들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프로보노스트의 제안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서류 나부랭이는 치우고 환자나 치료하죠.”
피터 프로노보스트가 시나이그레이스병원 경영진을 처음 만났을 때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라고 요청하는 대신 카테터 감염 비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확인해 봤더니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였다. 그때서야 이 병원도 ‘키스톤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그룹에 참여하기로 했다. 병원마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두고 한 달에 두 번씩 전화회의를 하는 모임이었다. 병원 경영진은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카테터 감염 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인 피터 프로노보스트의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http://www.solutionjournalism.kr/story/2831)
많은 병원에서 경영진과 의사들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경영진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좋아하는 의사는 없다. 그런데 클로르헥시딘이 비치된 집중치료실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클로르헥시딘 구입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키스톤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한 병원들은 18개월 만에 1억 7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1500명 이상의 환자들의 목숨을 살린 것으로 평가했다.
[su_box title=”편집자 주.”]이 글은 이정환이 쓴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발표 자료의 일부로 이정환닷컴(leejeonghwan.com)과 솔루션저널리즘리포트(solutionjournalism.kr)에 게재했던 글입니다.[/su_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