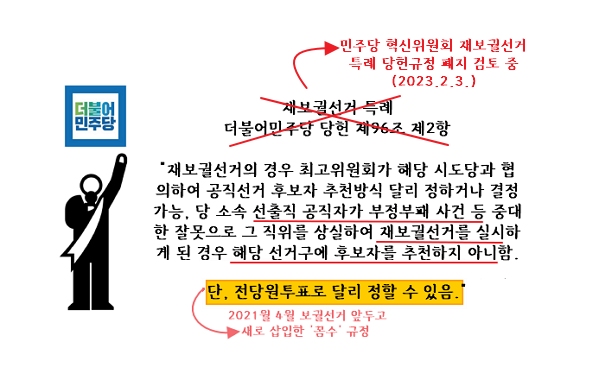어느 젊은 영국 국회의원의 부고 기사를 읽는다.

40대 초반 초선. 힘든 일만 찾아서 했다. 시리아 문제를 끈질기게 잡고 늘어졌다. 웬만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EU 탈퇴를 두고 투표가 임박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었다. 그녀가 앞장서서 EU 잔류를 외쳤다. 그 흔하디흔한 정치판의 ‘요령’을 부리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했다. 상대가 갑자기 줄을 놓아버려 쓰러진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갔다.
그녀가 죽고 나서야 그녀의 ‘요령부득’의 이유를 짐작한다. 그녀는 영국 중부의 조그만 도시 바틀리(Batley)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치약과 헤어스프레이를 만드는 공장에서 평생 일했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가기 전까지 바깥세상을 몰랐다.

가족을 통틀어 그녀가 처음으로 대학에 갔으니 당연한 일이다. 방학 때는 아버지 옆에서 공장 일을 같이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고서야 그녀는 다른 세상을 알았다. 말하는 법(영국 엘리트 식으로 말하는 법)이 중요하고, 누굴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적응하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졸업 후 자연스레 NGO인 옥스팜을 찾아서 난민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의 충격 때문에 국회의원 생활 적응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였다고 했다.
왜 그럴까. 총을 맞고 칼에 찔리는 사람은 늘 이런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계급의 흔적은 남아서, 이튼 스쿨 출신은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해도 멀쩡하고, 조 콕스처럼 서민들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전하는 평민 출신의 국회의원은 무방비다.
칼을 휘둘렀던 사람도,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일 것이다. 죽음에 짙게 깔린 계급 문제, 나는 이제 그것이 두렵다.
젊은 죽음에는 이렇게 웃는 사진이 더 어울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곳에서는 ‘팽팽한 줄을 먼저 놓아버리는 법’도 배우며 편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