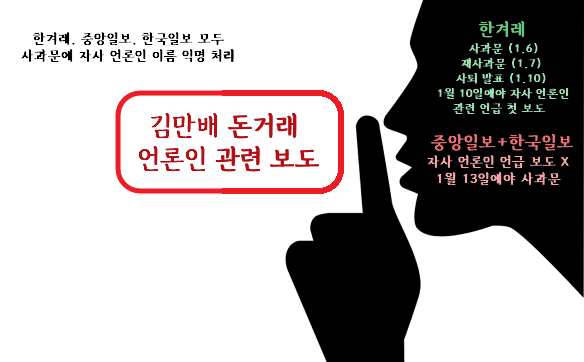2016년 6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절망 속 희망 찾아 움직이는 조선소 노동자들
대한민국 산업을 책임지다 어느새 불황과 파산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선업. 모두가 ‘구조조정’의 당위성만 이야기한다. 당위성 앞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이할 노동자의 운명은 너무나 가볍다. KBS 다큐3일이 조선업의 메카, 경남 거제와 통영 노동자를 72시간 동안 추적했다.
불황은 늘 약자부터 덮친다.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은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이 제일 먼저 맞았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언젠가는 경기가 풀리겠지’라는 실날같은 희망으로 업체를 유지한다. 작업이 끝나는 동시에 해체되는 ‘물량팀’, 즉 조선소 임시직 노동자는 협력업체에도 속하지 않아 칼바람을 더욱 거세게 맞고 있다.
세계 10대 수주량을 자랑하던 중견 조선소로 통영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던 신아SBS, 그곳엔 이제 34명의 직원만이 파산 선고인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지킨다. 작업반장 이종훈 씨는 지난 11월 해고 통지를 받았지만, 인수합병이 되면 살아날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다시 파산 보조인으로 들어왔다.
벼랑 끝에도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야나세 통영조선소는 선박 건조가 아닌 수리업으로 활로를 찾는다. ‘이제 끝났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활로를 찾아가는 조선소, 그곳에 아직 사람이 있다.
● KBS 다큐멘터리3일

[divide style=”2″]
2. 대우조선해양 망하게 한 ‘그때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조선업 불황의 책임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가 떠맡게 됐다. 하지만 조선업을 위기에 몰아넣은 경영진은 어디에 있을까? 경제지 비즈니스워치가 대우조선해양의 비리와 분식회계를 책임져야 할 ‘그때 그 사람들’의 행적을 되짚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들, 부실이 본격화된 기간 동안 이들은 매년 4억~5억 원대 연봉을 받았다. 분식회계 된 성과를 근거로 억대 연봉을 챙진 전직 대우조선 부사장 중 상당수는 임기를 마친 뒤에도 회사 자문역으로 남아 거액 연봉을 추가로 받았고, 일부는 계열사 대표로, 동종업계 고위직을 꿰찼다. ‘그때 그 사람들’은 롯데그룹 고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현역에서 활동 중이다.
감사에 실패한 감사위원들 역시 승승장구다. 청와대 대변인, 재선 국회의원, 다른 기업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등등. ‘그때 그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명단에도 없다. 왜 늘 경영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들만 지는 걸까.
● 비즈니스워치

[divide style=”2″]
3. 수용소 탈출한 원생들,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1997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서해안의 섬 유부도에 위치한 정신질환사 수용시설 ‘장항수심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폭로 한 달 후 수심원은 폐쇄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수심원 원생 출신의 한 남성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찾았다. 원생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심원을 기적적으로 탈출했던 정 씨는 아직도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살기 위해 눈앞에서 맞아 죽어간 동료들을 방치하거나 살인에 동참했다는 괴로움 때문이다. 20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서 “꼭 살려달라”고 말했던 김 씨는 수심원에 대한 고통을 안고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심원 폐쇄 이후 수심원에서 나온 이 씨는 6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19년 전 ‘그것이 알고싶다’가 수심원을 찾았을 때와 꼭 닮은 말을 전한다. “집에 가고 싶다”는 것. 이들은 수심원 건물 바깥으로는 빠져나왔지만, 아직 수심원의 기억으로는 탈출하지 못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divide style=”2″]
4.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내부 고발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폭행사건은 대부분 제보, 즉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에 의해 알려진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사회적 책임 앞에 불러 세워졌지만 어떠한 힘도 없다. 장애인 매체 비마이너가 홀로 내던져진 ‘제보자들’의 제보 그 이후를 취재했다.
제보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내가 신고한 사실을 다음날이면 시설 측에서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설 법인에 제보 사실을 알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무력했다. 정체가 드러난 이후에는 징계와 해고가 거듭됐다.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파면당하거나 권고사직. 배신자 딱지가 붙어 안에서도 왕따가 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시설이 가진 권력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경찰도 시설과 연관되어 있으니 내부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소문은 빨리 퍼지고 사회복지계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기는커녕, 지역사회에서도 취직이 힘들다. 사건의 충격을 소비하는 것과 함께, 그 사건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린 사람의 고통을 바라봐야 할 때다.
● 비마이너

[divide style=”2″]
5. “내가 내 딸을 죽인 것 같다” 가습시 살균제 피해자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대표 사례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안방의 살인자’가 됐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1~4등급) 중 109명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 39명(36%)이 “각종 호흡기 질환이 처음 발견된 이후 가습기 사용을 늘렸다”고 증언했다.
이 중 24명(22%)은 “병원에서 가습기를 더 많이 틀어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답했다. 가습기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살균제 사용도 증가했다. 유가족 조재은 씨는 ” “목이 건조하다며 하루 종일 기침하는 (딸) 지원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가습기를 틀어주고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넣어주는 것밖에 없었다”며 “결국 내가 내 딸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한다. 진짜 책임져야 할 이들은 아직도 책임을 피해 나가고 있다.
● 중앙일보
- “애 살리려 가습기 더 틀었는데…”
- “세균 죽일 정도면 사람에게 나쁠 텐데…병원도 몰랐다”
- 화학물질 4만 개 중 독성 파악 15%뿐…“중독센터 만들자”
- 사진으로 읽는 피해자 109명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