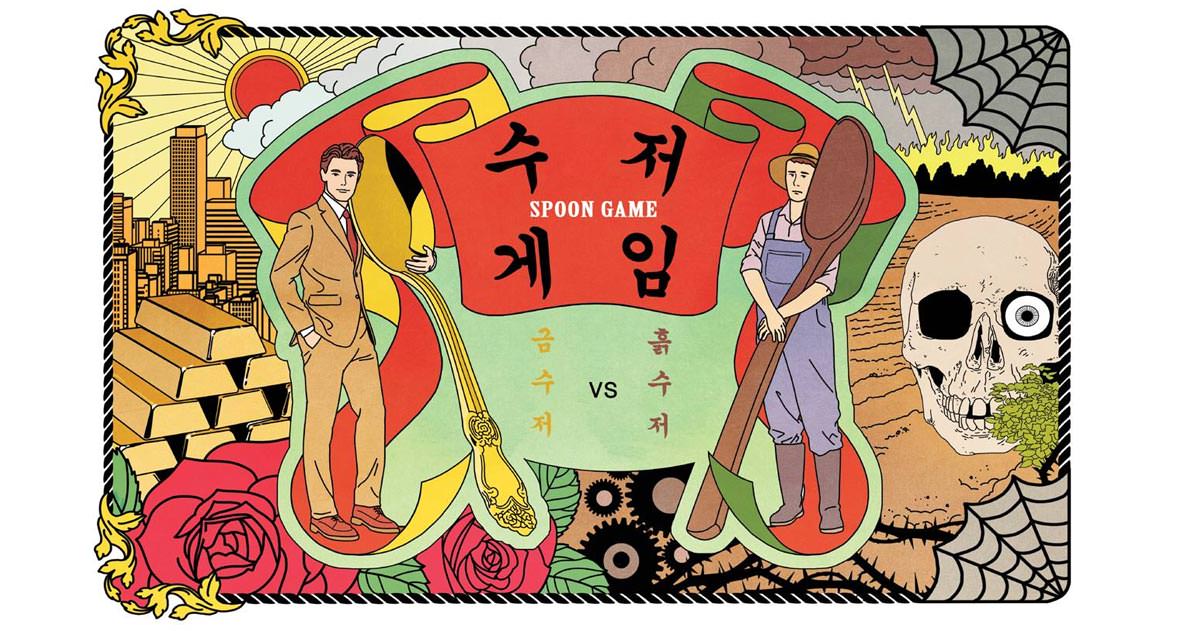조 엘리엇은 한 터프하는 고등학생이었다. 스쿨버스를 놓친 김에 서성거리다가 만난 녀석이 밴드를 한다길래 엉겁결에 자기도 끼워달라고 한 것이 레드 제플린의 철자를 흉내 낸 그룹 데프 레파드(Def Leppard)의 시작이다.

젊은 그들
열여덟 동갑내기 네 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에 세 살 아래 막내 릭 앨런(Rick Allen)이 드럼으로 합류했다. 영국의 작은 고장 셰필드 동네밴드의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고향의 크고 작은 행사, 특히 작은 술집에서 꾸준히 라이브를 하면서 꿈을 키워가던 이들은 리드 싱어를 맡은 조 엘리엇이 노상에서 매니저를 두들겨 패는 바람에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밀려났다.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진출을 염원하며 사운드도 강렬한 미국식으로 바꾸고 심지어 “Hello America”란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변심’에 열 받은 팬들은 라이브에서 술병과 오줌을 담은 페트병을 투척하는 것으로 답했다.
그런 모욕을 무릅쓴 보람이 있었는지 1981년에 발표한 2집 [High and Dry], 1983년에 발표한 3집 [Pyromania] 앨범은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밴드의 성공 가도를 열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운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미국에서의 성공을 앞세우고 돌아온 고향 마을에서 릭 앨런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 결과 릭은 드러머의 생명과도 같은 왼쪽 팔 하나를 잃었다.
밴드는 완전히 좌절했다.
외팔이 드러머
 하지만 리더 조 엘리엇(Joe Elliott, 사진)은 새로운 드러머를 뽑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룹 멤버들 모두 막내 릭이 없는 데프 레파드는 의미가 없다며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함께 무대에 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리더 조 엘리엇(Joe Elliott, 사진)은 새로운 드러머를 뽑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룹 멤버들 모두 막내 릭이 없는 데프 레파드는 의미가 없다며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함께 무대에 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를 위해 릭은 한쪽 팔과 두 다리만으로 연주가 가능한 특수 드럼을 제작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격리된 스튜디오를 만들어 연습한다. 몇 개월간의 훈련의 결과가 공개되던 날, 밴드 멤버들은 모두 부둥켜안고 울었다.
하지만 팔이 하나 없는 드러머의 연주가 온전할 리 없다. 데프 레파드는 릭에 맞추어 그동안 추구해온 음악적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한다.

우선 전체적으로 곡의 속도를 늦추고 단순한 비트로 작곡하며 약한 드럼 파워를 더하기 위해 전자 드럼을 쓰며 허전한 사운드를 메꾸기 위해 드러머를 비롯해 전 멤버가 코러스를 넣었다. AC/DC와 같은 하드록을 추구하던 밴드의 입장에서는 천지개벽이고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였다.
그리고 5년간의 공백 끝에 드디어 발매된 87년 앨범 [Hysteria]는 단일 앨범에서 빌보트 차트 TOP 100에 7개의 싱글이 랭크되는 기록을 세우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 그건 우연이라기보다는 이 앨범이 실패한다면 릭이 얼마나 좌절하고 미안해할지 멤버 모두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공을 갈망하며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두 걸음 뒤에서(Two Steps Behind)
이 글 끝에 나오는 동영상은 1995년 셰필드에서 가진 공연 영상이다.
맞다, 셰필드.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었던 고향이고, 릭 앨런의 끔찍한 사고가 난 곳이고, 그곳에서 만난 고향 친구 기타리스트 스티브 클락(Steve Clark, 1960~1991, 사진)이 약물남용으로 사망한 후였다.

맞다, 그리고 이곳은 그들이 어렸을 적 매일같이 공연했던 그 동네의 작은 펍(Pub)이다. 너무 공간이 좁아서 앰프나 악기도 다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 자의반 타의반 어쿠스틱 공연을 했다.
릭의 특수 드럼도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일반 드럼의 하이햇 위에 작은 심벌을 왕관처럼 올려놓은 장치 정도로 만족했고 관객은 촬영 스태프를 빼면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연이었다.

이 노래, “Two Steps Behind”를 만들기 직전 스티브 클락이 사망하자 밴드는 추가 멤버를 뽑지 않고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가기로 했고, 이 역시 사운드에 변화를 주어 상당히 정적인 발라드곡이 탄생하게 되었다.
‘두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대상은 연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밴드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공연은 그들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 직후 발매된 새 앨범과 라이브 공연들은 처절한 실패를 맛보며 한순간에 밴드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2008년쯤 되면 ‘노땅’ 가수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인 트리뷰트 앨범(Songs from the Sparkle Lounge)과 젊은 가수와의 콜레보레이션을 시도하게 된다.

컨트리 가수인 신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쉴 새 없이 골반을 흔드는 가운데 바이올린과 글라스 기타가 ‘띠웅~’거리는 속에서 조 엘리엇이 부르는 “Hysteria”는 차마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다.
요즘의 계획?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공연한단다. 카지노라도 라스베가스이니 어느 정도 규모는 있다 하겠지만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그들도 미사리 카페 가수같이 추억을 파는 흘러간 이들이 된 것을…
“고향 친구들, 지금의 우리를 꼭 기억해줘!”
동영상 속의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그 쇠락의 직전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 걸음 뒤에서 당신을 지켜볼게요”라고 노래하고 있다.
1977년부터 30년을 함께 한 친구들, 팔을 잃은 막내도 함께, 먼저 간 주정뱅이 친구도 함께, 열여덟 넒게만 보이던 곳이 이렇게 좁았었나 갸우뚱거리며 곡 사이사이 몰래 마시던 맥주 대신 위스키병을 홀짝이며 어른이 된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게 우리의 절정이라고.
이 정도면 환상적이지 않느냐고.
[divide sty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