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영화사봄, 명필름 등 19개 제작사가 무료초대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15년 1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제작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CGV 측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료초대권은 애초에 상영관뿐만 아니라 영화 매출을 높여 제작사와 배급사 등 영화계 전체의 이익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영화업계의 ‘업계표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편집자)[/box]
우리나라에서는 CGV와 롯데시네마 두 개 업체가 전국 스크린의 약 70%를 점유하고, 한국영화의 40~60%(주1)를 스스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투자하고 배급한다. 이들이 배급 상영 각각의 시장에서 자신의 계열사가 아닌 한국영화 배급사들(이하, “비계열사 배급사”)이나 자신의 계열사가 아닌 극장들(이하, “비계열사 극장”)을 경쟁에서 압도하는 것이야 문제도 없고 할 말도 없다. (‘스크린 수’는 ‘상영관 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한국영화계에서는 수평 담합, 수직 계열화, 극장 독과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지역이나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CJ와 롯데다. – 편집자)
1. 독과점으로 만든 ‘업계표준’ 통해 배급사 착취
첫째, CGV와 롯데시네마가 담합하여 70%의 스크린을 무기로 계약조건을 제시하면 비계열사 배급사들이 거부하기 어렵다. 이점을 이용하여 비계열사 배급사들에 착취적인 ‘업계표준’을 만들어 강요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강요한 업계표준은 여러 가지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롯데의 자사 배급부문이나 CJ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롯데시네마나 CGV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할 리 없다. 이렇게 순순히 계열사들이 동의만 해도 이미 한국영화 배급의 50%(2013년 매출기준)가 넘어간다. 즉, CJ그룹과 롯데시네마 2개 기업 집단만 서로 합의만 하면 극장의 60%와 한국영화 배급사의 50%가 동의하는 강력한 “업계표준”이 되어버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이 동의가 의미 없는 자기거래라고 애써 무시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J엔터와 롯데시네마가 한국영화 배급에서 1, 2위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업계표준에 반기를 들 만한 배급사가 있을까? 말 그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업계표준이 ‘시장 표준’이 된다.
배급사는 손 빨고 극장만 돈 버는 무료입장권 시스템
그렇게 약탈적인 업계표준으로 강요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료입장권이다. 현재 CGV와 롯데시네마는 무료입장권을 전체 매출의 10% 선에서 남발하다가 공정거래위의 2008년 시정명령 등이 있고 2014년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상생협의체를 통해 5%대로 줄였을 뿐 아직도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있다.
- 2011년 7월 20일 – 영화진흥위원회 – 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안
- 2014년 10월 2일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보도자료)
무료입장권에는 극장 이름은 쓰여있지만, 영화 이름이 쓰여 있지 않다. 따라서 영화 홍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료입장권은 박스오피스 매출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박스오피스 매출의 반 정도를 부금으로 받아가는 비계열사 배급사들에는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극장은 무료입장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극장은 무료로 입장한 관객들을 상대로 팝콘과 음료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비계열사 배급사들의 영화를 무료로 이용하여 불러들인 관객들을 상대로 극장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무료입장권 관객으로 관객의 수를 늘리면 극장은 높은 광고매출도 올릴 수 있다. 요즘 영화 시작 전 10여 분 동안 나오는 광고를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광고매출이 급상승하였는데 모두 비계열사 배급사들이 힘들게 만든 영화를 극장들이 공짜로 보여주면서 버는 돈이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소송에서 CJ 측이 스스로 제시한 증거를 따르더라도, 무료영화권으로 영화를 본 사람들의 75% 정도가 무료영화권이 없었다면 유료로 봤을 것이라고 하니 비계열사들은 단순히 자신의 영화가 관객유치에 무료로 동원되는 것을 구경만 하며 유료관객마저 빼앗기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극장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배급사들에 내라 강요
또 하나의 사례가 소위 가상프린트 비용이다. 외국에서는 돈 많은 배급사들이 중소극장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인데 한국에서는 돈 주겠다는 배급사는 아무도 없는데 CGV와 롯데가 담합하여 돈 낼 것을 강요하고 있다. CGV와 롯데가 강제로 비계열사 배급사들에 디지털전환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아날로그 시절 원래 받지도 않던 돈을 스크린당 80만 원 정도를 배급사들로부터 받는데 이 역시 비계열사 배급사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CJ와 롯데에 밉보여 70% 스크린에 대한 상영기회를 잃는 것도 두렵지만, 매출 기준으로 배급부문 40~50%가 이미 ‘동의’해준 ‘업계표준’이라고 나머지 비계열배급사들에 밀어붙이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외화에 비해 한국영화에 차별적인 상영권료
마지막으로 뭐니뭐니해도 약탈적인 업계표준은 ‘부율’이다. 현재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박스오피스의 60%를 부금(상영권료)으로 주면서 관객점유율이 더 높은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더 낮은 50%의 부금을 주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역시 상생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서울지역만 55%로 높아지기도 했지만, 차별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부율은 오랜 관행이지만, CJ그룹과 롯데시네마가 담합하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고 있다.
2. 자기들이 투자·배급한 영화에 유리한 상영관 배정
둘째, CJ와 롯데는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들이 투자·배급한 영화들에 더욱 유리한 상영관 배정을 해줄 동기를 갖게 되어 [명량] 등이 엄청난 스크린을 장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비계열배급사 및 제작사들은 정당한 상영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범죄소년]이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이와 같은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도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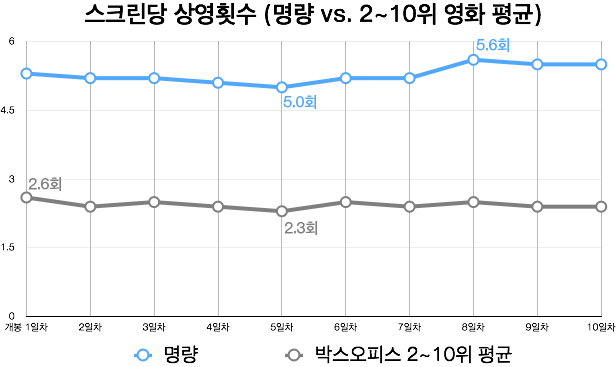
3. 점점 쉬워지는 암묵적 담합과 외압 행사
셋째, 또 다른 독립적인 문제는 CGV와 롯데시네마에 3위 업체인 메가박스까지 합치면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포화시키고 있으면 암묵적인 담합이나 외압 행사가 훨씬 쉬워진다. [또 하나의 가족], [천안함], [다이빙벨], [쿼바디스]에 대해 그런 외압 의혹이 있는 이유다.
4. 배급 독점력 바탕으로 제작사에 무리한 지분 요구
넷째, CJ엔터와 롯데시네마는 배급시장에서의 독점력만으로도 약탈적인 ‘업계표준’을 제작사에 강요하기도 한다. 즉 한국영화의 경우 주로 배급사들이 메인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투자배급사”라고 부른다)
CJ엔터와 롯데는 실제 제작에는 공동제작자 수준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스타캐스팅에 영향을 주거나 시나리오의 변경을 요청하는 정도임에도 배급료 외에 제작자지분의 20~50%대를 요구하여 배급사의 전체 지분을 높이고 있다. 이 역시 가장 강력한 투자배급사인 CJ와 롯데 모두 하고 있어서 제작사들이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다음 글에서는 1948년 미국에서 있었던 파라마운트 판결과 판결 이후 미국 내 영화 시장의 판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영화계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계속)
주석 목록
- 매출기준 CJ엔터와 롯데시네마 약 50% (2012년), 40% (2013년), 60% (2014년). CJ와 롯데의 수평담합, 수직결합, 독과점에 의해 영업을 제한받는 주체들은 한국영화 비계열사 배급사들이므로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이 유의미한 기준이다. (원문으로)



![우리는 왜 세월호 7시간에 분노하는가: 영화 [판도라] 리뷰](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6/12/008.jpg)
![퀴어 만화 [환절기], 한국 가족을 이야기하다](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5/09/in-between-seanson1-432x6001.jpg)

3 댓글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