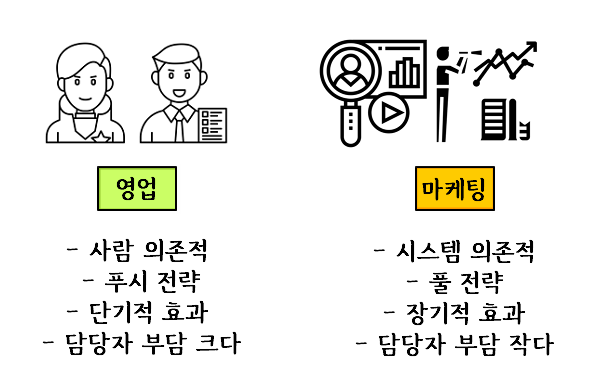[box type=”note”]박경신 교수가 대기업 극장 체인(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이른바 대형 ‘멀티플렉스’)의 무료입장권 발행 행태와 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씨네21에 발표한 칼럼을 퇴고하고, 편집한 글입니다. (편집자) [/box]
영화 [개를 훔치는 방법]은 관객이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든 영화였다.
대형 극장의 전통 갑질 = 내 영화만 밀어주기
[개를 훔치는 방법]은 대기업 극장 체인인 CGV와 롯데시네마로부터 제대로 된 상영 기회를 얻지 못했다. 처음에는 예매율이 낮아서 상영관을 줄였다고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 개봉 영화보다 예매 개시일을 늦게 잡았다.
이렇게 예매율을 떨어뜨리고 이를 핑계로 2주차부터 조조/심야상영시간만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예매율이 더 떨어지자 이를 이유로 상영관 숫자마저 줄여버렸다. 이런 대기업의 행태에 관객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국내 스크린의 70%를 점유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영화나 돈이 확실히 되는 외화들만을 밀어주다보니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렇게 중소 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의 상영 기회를 줄이기도 하지만, 중소 제작사의 영화를 돈도 내지 않고,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바로 무료입장권 발행을 통해서다.
대형 극장의 창조 경제 = 무료입장권 + 팝콘 음료수
대형 극장 체인들이 발행하는 무료입장권은 돈 내고 보려던 관객을 무료 관객으로 유도한다. 즉, 유료 관객의 숫자를 감소시킴으로써 배급사/제작사에 분배될 입장수입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극장들은 무료입장권 관객들에게 팝콘, 음료수를 팔고 이 관객들이 상영 전 광고를 보게 하여 광고 수익을 올린다.
매점 매출이 극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참고로 2013년 CJ CGV를 기준으로 보면, 티켓 매출 5,110억 원, 매점 매출 1,368억 원, 광고 매출 781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매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인데, 2010년(784억 원)과 비교하면 74.5%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영화 상영 전 광고도 극장의 수익원이다. 광고 길이가 최근 평균 10분으로 길어지고, 영화와 전혀 관련 없는 은행이나 이통사 광고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비를 받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극장들이 제작사가 공들여 만든 영화로 손님을 끌되 제작사에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을 창출하려는 꼼수의 결과들이다.
배급사/제작사들이 자신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무료입장권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극장이 발행하는 무료입장권은 아무 영화나 볼 수 있는 입장권이라서 개별영화에 대한 홍보 효과가 없다.
극장이 제작사/배급사 수익을 삥뜯는 방법
배급사/제작사 측은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료입장권 발행을 왜 방치할까? 답은 간단하다. CJ와 롯데에 전국 스크린의 70%, 메가박스까지 합치면 90%가 넘는 독과점 상황에서 배급사와 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 발행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CJ와 롯데는 제작 및 배급(합계 점유율 40~50%)도 하지만 이들이 영화 제작과 배급 부문에서 보는 손해는 모두 극장 부문에서 메꿔진다. 결국, 무료입장권이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화로 손님을 끌어서 자기들끼리만 돈을 벌겠다는 기획일 뿐이다.
도리어 이들 대형 멀티플렉스가 제작/배급한 영화들은 자신의 형제 극장들이 제시한 조건에 고분고분하게 따르면서 이 조건이 중소 배급사/제작사들에 ‘업계표준’으로 보이도록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데 일조한다.
DCK(CJ+롯데)의 ‘가상 프린트비’ 횡포
이것은 CJ와 롯데가 원래는 받지도 않았던 프린트 비용을 영화 1편 1관당 80만 원씩 ‘가상프린트비’라는 명목으로 받겠다는 것을 배급사/제작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합계 점유율이 70%인 업계 1, 2위 CJ와 롯데가 DCK라는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생산자들이 어떻게 이들의 구매조건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니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들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말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성립한 계약인지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등법원, 대형 극장 손을 들어주다
그런데 2014년 1월 9일 서울고등법원(김인겸, 한소영, 신종오)은 CGV, 롯데, 메가박스가 무료입장권(무료초대권)의 발행에 대한 제작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극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의 논리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탈각시킴은 물론 상상하지도 못한 궤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의의 자체를 몰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고등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제작사의 원고 자격 이야기는 생략한다. 법원도 ‘원고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며 한 물러섰기 때문에 패소의 핵심 이유가 아니다.)

1. 무료입장권의 홍보 효과?
첫째, 무료입장권으로 영화당 관객 수를 늘일 수 있으니 ‘관객 수 몇백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통해 발생하는 영화 홍보 효과를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란다. 여기서부터 모순이다.
아무 영화나 다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이 어떻게 개별영화에 대한 홍보 효과를 내는지 알 수가 없다. 평균적으로 영화당 관객 수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경쟁적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관객 수 인플레이션만 가져올 뿐이다.
게다가 이런 홍보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유료 관객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비교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2심에서 극장 측이 제시한 증거(2014년 10월 닐슨컴퍼니 조사)를 보자.
무료입장권을 이용해본 225명의 설문에서 72.4%는 ‘무료입장권이 없었더라도 돈을 내고 영화를 보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닐슨컴퍼니는 그래서 무료입장권 총액의 75%가 배급사 측이 입은 손해라고까지 언급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이 보고서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극장이 스스로 제시한 증거가 불리한 상황에서 법원이 극장 손을 들어주려면 그 증거의 의미를 적당히 무마라도 해야 하지 않나.
2. 우량 고객을 독려하는 효과?
둘째, 고등법원은 무료입장권 대부분이 포인트나 보너스 프로그램으로서 우량 고객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
이것도 말이 안된다. 위의 ‘72.4%’ 모두 우량 고객이라서 무료입장권을 받았을 것이다. 이들은 무료입장권이 없었어도 돈을 내고 다음 영화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생하게 말하고 있다.
즉, 이들은 무료입장권을 받으려고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성사된 거래는 무조건 불공정하지 않다?
셋째, 고등법원의 또 다른 논거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의 궤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2월 무료입장권발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었다. 법원은 이 시정명령은 무료입장권이 배급사와 ‘협의 없이’ 발행된 것에 대해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극장 측이 시정명령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협의 하에 발행했으므로 (무료입장권을 발행하겠다고 명시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논리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가 실제로 공정한지를 따져보자는 법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거래라니? 이는 ‘성사된 거래는 불공정하지 않다’는 신화처럼 들린다.
이 사건에서 무릇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현실’을 고려했어야 한다.
- 피고 3개사가 국내 스크린의 90%를 점하고 있다는 점.
- 이들이 담합하여 무료입장권 발행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제작/배급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이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게다가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유가 무엇이든 법원은 이와 별도로 극장들의 발행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이행되었는지 만을 보고 현재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공정위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4. 공정위 결정 실질적으로 취소한 고등법원 해석
넷째, 고등법원은 자기파괴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도 파괴하였다.
이번 소송은 2008년 2월 이전에 계약서에 무료입장권 발행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행에 의한 피해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8년 2월 이후 극장이 이렇게 배급사와 ‘협의’ 하에 발행하게 된 상황에서도 무료입장권 숫자가 줄지 않았다.
여기서 상식적인 법관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정위 철퇴를 맞았는데 개전의 정이 안 보인다’며 꾸짖어야 정상 아니겠는가. 1심은 바로 그런 논리로 모든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놀랍게도 ‘협의해서 발행하는 것도 이 정도인 것을 보니 협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발생한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왜 1심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취소시켜버린 것이다.
불공정거래 장려하고 보호하는 ‘완벽한 방법’
사실 여기서 분노가 치민다. 이런 판결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로 인식될지 생각해보라.
이제 기업들이 과거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생긴 것이다. 원래 하던 업무내용을 계약서에 넣고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 아니 똑같이 악질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법원이 ‘계약서에 명시해도 같은 상태인 것을 보니 원래 그게 최선이었던 모양’이라고 하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보호해준다. 고등법원 판결이 이 상황에서 확정된다면 2015년 최악의 판결은 떼놓은 당상인 것 같다.

업계1, 2위가 스크린의 70%, 배급의 40~50%를 점유하면서 서로 담합까지 할 정도의 독과점상황이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 싶다.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모든 거래가 독과점의 중력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협의체가 표준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써놓든 그것이 공정한 조건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대법원이 이런 어려움을 체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