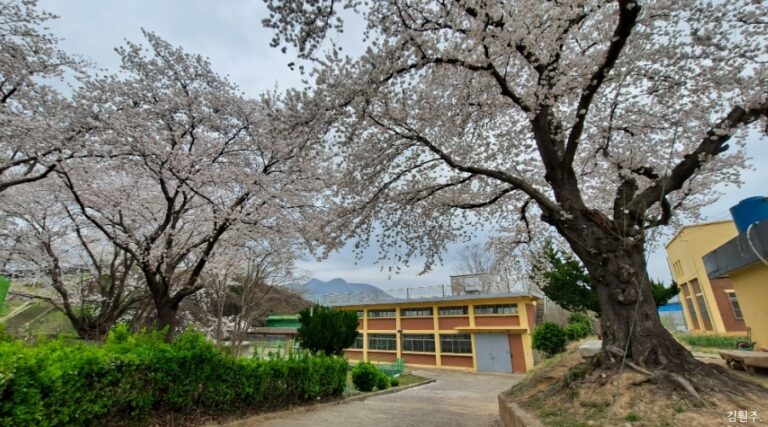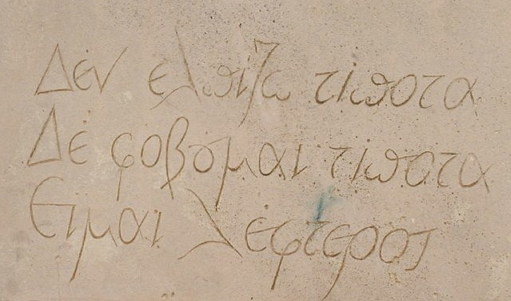[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경탄을 자아내는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의 암수바위. 베테랑 기자 김훤주가 따뜻하고 담백한 시선으로 세상 소식을 전합니다. (1분)


잘생겼다
가서 보면 그야말로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이 천연(天然)스레 만들어냈는데 어쩌면 저토록 그럴듯하게 자아냈을까 싶은 경탄이 앞선다. 천연 그대로일 따름이라 그런지 어디도 걸리적거리는 구석이 없다. 하늘 아래 하나도 가리거나 숨기지 않은 채로 주변 경관과 썩도 잘 어울린다.
그런 덕분인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이 죄를 모르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고 천둥벌거숭이로 몸을 가리지 않고 원죄 없이 그냥 지냈던 세월도 막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물론 실제로는 없었을 것이다.

인공도 나쁘지 않다
이번에 느낀 두 번째는, 나는 인공이 좋지 않다는 편견이 심한 편인데도 때로는 그것이 적당하면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꽤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하늘을 향해 높고 길게 쭉 뻗은 바위 뒤쪽 그늘에 보면 타원형 바위가 있다. 한가운데가 쪼개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실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성싶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 일부러 깨뜨린 자국이 흐릿하게 나타났다. 지금은 아예 사라졌지만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석수장이가 있었는데 그 솜씨이지 싶었다.
석수장이들은 어디를 때리면 잘 갈라지는지 알았다. 돌결을 따라 정으로 쳐서 틈을 낸 다음 마른 나뭇조각을 끼워 넣고 물을 부어 그 부풀어 오르는 힘으로 커다란 바위를 쪼갰다.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서사
직각을 넘어섰는지 미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는 기다란 바위. 한가운데가 아래위로 제대로 갈라진 타원형 바위. 이 둘이 꼼지락거린 결과물이 오른편의 배부른 바위일 것이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었다. 저 편안한 언덕에서 원인과 결과가 모두 제시되었고 그 아귀가 어김없이 맞아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지금 여기서 되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 셋의 어우러짐이 없었다면 역사도 없었고 개체도 없었다. 단순하고 명확한 인간의 일생과 역사가 여기에 펼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