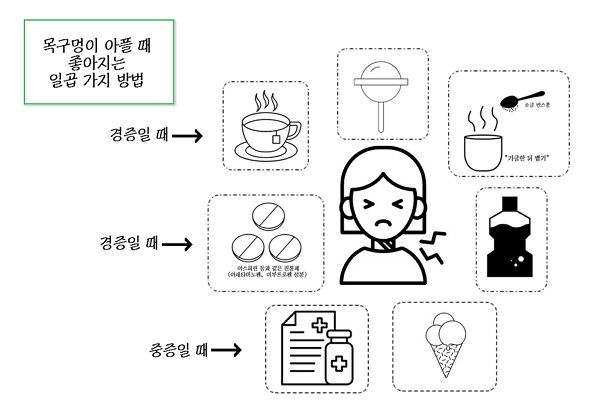[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베테랑 기자 김훤주가 잘 드러나지 않은 세상 이야기를 따뜻하고 담백한 시선으로 전합니다.

나는 그동안 생태·습지 현장을 찾아 취재·보도하는 일을 주로 했다.
쓰레기 백화점
그동안 주변에 널려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지냈다. 어쩌면 일부러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혼자서는 아무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습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아니면 쓰레기가 많다. 풀섶만 헤치면 나타난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까지 한데 모여 물살이 약한 여울 같은 데에 무더기로 쌓여 있기도 하다.
도로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깨끗한 것은 고속도로가 유일하다. 국도든 지방도든 도심을 벗어나 시골로 접어들수록 쓰레기가 많아진다. 실수로 흘린 것, 봉투에 담아 던진 것, 생활용품을 작정하고 버린 것들로 범벅이다.
그래도 길섶은 나은 편이다. 가드레일 아래 비탈이나 계곡은 말할 수도 없다. 없는 쓰레기가 없는 쓰레기 백화점이다. 텔레비전은 물론 업소용 냉장고와 싱크대, 탁자와 의자까지 팽개쳐져 있어서 잘만 모으면 가게도 하나 차릴 수 있을 정도다.






국토대청결운동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토대청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실행하도록 강제해도 모자랄 판이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제발 정치권에서 이런 일 좀 했으면 정말 좋겠다.
무모한 도전
5년쯤 전에 쓰레기에 도전해 본 적이 있다. 무모한 시도였다. 하루 만에 나는 항복하고 말았다. 힘들기도 했지만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쓰레기는 쓰레기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를 줍고 보면 옆에 저만치 쓰레기가 또 있는 식이었다. 낙엽 쌓인 위에서 쓰레기를 줍고 아래를 헤집어 보면 묵은 쓰레기가 놓여 있었다.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겠다 싶었다.
그래도 미련은 있었다. 직장에 매여 밥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못했다.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하겠으면 간간이 봉투와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주워 올리곤 했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
이태 전 늦가을 어느 날 어떤 바닷가 방파제에 있었다. 친구는 낚싯대를 드리웠고 나는 옆에 앉았다. 친구는 잡아 올린 고기로 회를 떠 주겠다고 했다. 나는 소주를 한 병 사 올까 하다가 가게가 멀어서 그만두었다.
바닷물이 방파제와 만나는 언저리에서 스티로폼 덩어리와 페트병이 보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내려가 건져 올렸다. 위쪽 모래밭도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제법 흩어져 있었다. 나는 주우러 올라갔다.
곧이어 바위 틈새에 끼여 보이지 않는 쓰레기도 치워볼 마음을 먹었다. 밖에서 보면 멀쩡했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옷가지, 과자 봉지, 페트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 밧줄, 스티로폼 부표, 쇳조각, 신발, 장난감 등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두 시간 남짓 만에 포대 두 개에 가득 차고 남았다. 큰 것은 포대에 담지 않고 눈에 잘 띄도록 갈무리했다. 방파제 전체도 아니고 세로 6미터 가로 20미터 정도밖에 훑지 못했고 손이 안 닿거나 단단히 박힌 것은 그대로 두었는데 이런 정도였다.
우리나라 해안선이 얼마나 될까. 오늘 쓰레기를 걷어낸 길이는 전체에서 얼마나 될까. 그것은 0으로 수렴되는 무한소였다. 나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몸과 마음을 축낼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보이는 쓰레기
며칠 전에 남지 개비리길을 찾았다. 제대로 관리되는 명승이라 쓰레기가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쓰레기 강산이 눈에 들어왔다. 이태 전에는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은 정년퇴직을 했다. 예전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이는구나 싶었다. 이태 전 집어던졌던 집게를 다시 장만했다. 장화는 버리지 않았으니 수풀이나 하천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 쉬엄쉬엄 힘들지 않게 하자. 그래야 오래 가니까. 산천을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도 말자. 마음이 애달파지면 견디기도 어려워지니까.

그냥 때때로 나가서
어릴 적 넝마주이는 늘 마주하는 이웃이었다. 실제로는 더없이 고달픈 삶이었겠지만 어린 나에게 넝마주이는 제법 멋진 존재였다. 그들의 대나무 바구니는 지름이 한 발을 넘을 정도로 컸다. 그 큰 바구니를 짊어지고도 보무가 당당했던 그들은 어린 나에게 거인이었다.
그들은 솜씨도 좋았다. 옷가지든 종이든 고물이든 집게로 집어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뒤따라가며 넝마를 주워 던지는 흉내를 내었다. 그들은 주로 험상궂게 인상을 썼지만 때로는 웃어 보인 적도 있다.
나는 지금 넝마주이를 꿈꾸고 있다. 일주일에 여덟 시간은 넝마를 주워야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지. 세상이 깨끗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때때로 나가서 줍기만 하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