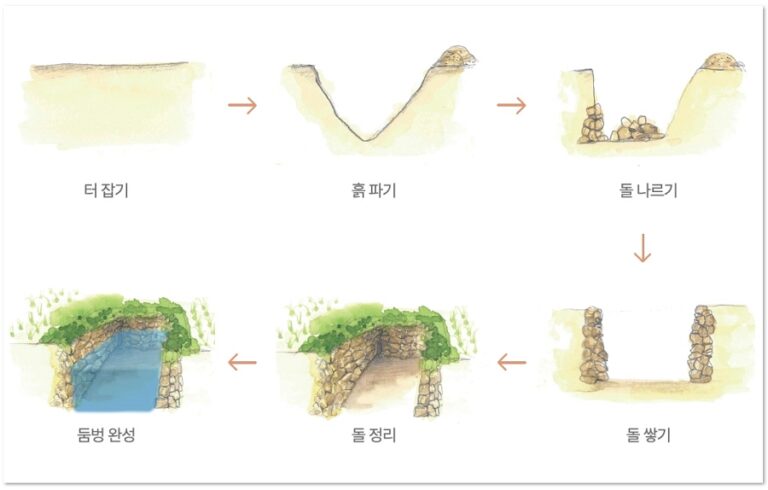[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나는 ‘넝마주이’에 관하여 알고 있다. 시간은 기억을 따뜻하게 채색하곤 한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했던 절망마저 희망으로 각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3분)
내가 아는 넝마주이
나는 넝마주이를 알고 있다. ‘넝마’는 입지 못할 정도로 낡고 해진 옷을 가리킨다. ‘주이’는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넝마주이는 넝마를 줍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요즘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지만 내가 태어난 1960년대와 10대였던 1970년대에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등에는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바구니가 지워져 있었다. 손에는 기다란 집게가 들려 있었다. 내 기억 속에 넝마주이는 깡마른 체격이었는데 그들의 옷은 대체로 넝마였다.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주운 것들이었다.
그들의 대바구니는 넝마만 담지는 않았다. 신문지나 골판지를 비롯한 종이와 못이나 철근 같은 쇳조각이 담기는 것은 예사였고 일반 가정집에서 먹다 남긴 음식 쓰레기나 가구 또는 짐짝도 종종 담겼다. 그들은 입에 풀칠하고 몸을 가리는 데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집고 다 담았다.

어릴 적 보았던 넝마주이
그들의 넝마 줍는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바닥에서 물건을 집어 대바구니에 넣기까지 아주 재빠르게 행동했다. 몸을 구부려서 줍고 몸을 쫙 펴서 어깨 너머로 집게를 넘기는 모습은 리드미컬했다. 어린 눈에는 장터 서커스의 한 장면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무리 지어 그들을 졸졸 따라다니곤 했다. 넝마주이들도 혼자서 다니지는 않았다. 대개는 우리한테 무신경했지만 때로는 돌아서서 막 무어라 하며 화내는 시늉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좁쌀처럼 흩어졌다 다시 모여들었다. 무섭지는 않았고 오히려 놀이처럼 여겨졌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넝마주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도둑질을 한다고도 했고 어린아이들을 꾀어가 팔아먹는다고도 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넝마주이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넝마주이의 움막집
어릴 적 까마득한 기억 속에 있는 넝마주이는 이러저러해서 어린 눈에는 신기하고 아름답게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넝마를 주우며 하루하루 살아내야 했던 실상은 어떠했을까? 그 눈물겨움을 생각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가슴이 아려온다.
그들은 집이 없었다. 어릴 적 내가 살았던 창녕 읍내를 두고 말하자면 그들은 남창교 다리 밑 천변 언저리에 움막을 치고 살았다. 막대를 세우고 천조각으로 얼기설기 가려서 안쪽이 보지 않으려 해도 절로 들여다 보였다.
우리는 국민학교를 오가면서 날마다 두 번씩 그 남창교를 건넜다. 우리 옷차림은 겨울과 여름이 달랐지만 움막은 추운 겨울에도 한여름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 움막에는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넝마조차 걸치지 못한 그들의 얼굴은 다리 밑을 흐르는 구정물 같은 냇물보다 시커멓고 더러웠다.
희망을 줍는 넝마주이?
며칠 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02)에 들렀다가 넝마주이 사진을 보았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이 전당의 지역 특화 전시실에서였는데 마산에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 ‘귀환 동포’를 언급하는 대목에 붙어 있었다.

나는 여기에 달린 ‘희망을 줍는 넝마주이’라는 설명을 보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감수성과 상상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들의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금 관점에서 그때의 그들을 그냥 별 뜻도 없이 또 근거도 없이 미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어릴 적 본 바 1970년대 창녕 넝마주이들이 주운 것은 오로지 생존이었다. 그들의 그 생존에는 희망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50년대 마산 넝마주이들은 무엇이 얼마나 달랐기에 희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내 생각에는 ‘생존을 위한 절망의 몸부림’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무어라 대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