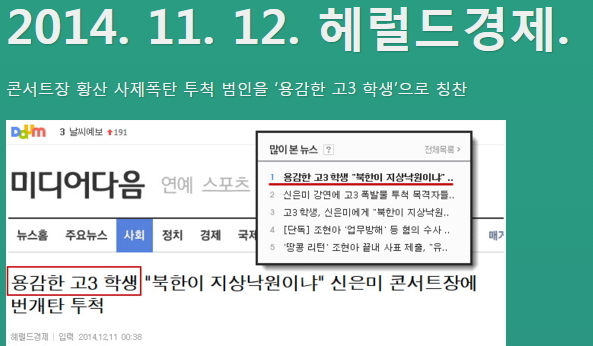한국 언론에 놓인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공영언론 강화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언론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공영언론의 공영화’가 아닌 공영언론의 탈(脫)공영화 흐름을 보인다. 앞으로 나가가는 진일보가 아닌 명백한 과거로의 퇴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9월 26일, ‘TBS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며 서울시의회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폭거”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뚫고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폐지 혹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내년도 출연금 대폭 삭감 위협 앞에서, 또 그런 외부의 공격에 어떤 ‘타협책’으로 귀결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영언론에 잇따라 밀어닥치는 파고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공영언론인 YTN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민영화설에 휩싸이고 있다. 미디어 매체들에 따르면 한전KDN 이사회에 YTN 주식 매각 추진이 혁신 지침안으로 보고가 됐다고 한다. YTN 노조(언론노조 YTN지부)의 말을 빌자면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라는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앞서 이미 공영언론에서 사영언론으로 탈바꿈한 신문사의 최근 모습은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 역사의 신문사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서울신문이 2021년 말 건설사를 새로운 대주주로 맞은 뒤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그 직전까지 내세운 공영언론, 독립언론의 각오를 생각하면 허탈함을 자아낸다.
3개 매체의 성격이나 지배구조, 이들 매체가 그간 거쳐 왔거나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은 그 양상이 각각 다르지만, 공영언론에 닥치고 있는 외부의 높은 파고를 보여준다. TBS를 ‘지역’ 공영방송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나, 공기업이 언론사의 주요 주주로 있는 비정상적인 측면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얼핏 정당한 명분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든 비정상의 정상화든 간에 그 이면의 현실, 그 같은 시도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영언론의 공영화나 민영화가 아닌 정치권력에 의하든 자본권력에 의하든 관영화(官營化)이며 권영화(權營化)가 될 뿐이다. YTN 노조는 이렇게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자 기자 6명을 해직시키던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의 입노릇을 한 사람이 ‘이러면 민영화밖에 없다’며 협박을 가했다.”
관영화, 권영화로 가는 길
사영화된 서울신문은 오는 10월 초, 자신이 건물의 절반의 주인으로 있는 한국프레스센터를 떠나 새 대주주인 호반그룹의 사옥으로 들어간다. 한국언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센터를 스스로 나와서 건설회사의 한 계열사처럼 안기는 것이다. 지난 6월 수십 명의 서울신문 기자들이 지면 사유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주주 호반그룹과 서울신문 경영진 주도로 추진하는 사옥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낸 것에는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6월의 성명은 호반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뒤 편집권 침해 또는 일방 경영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내놓은 세 번째 성명이었다. 이 신문에서는 과거 자신들을 인수하려던 호반그룹의 시도를 저지하려던 시기 작성된 ‘호반건설 대해부 시리즈’ 기사가 전격적으로 삭제된 것을 시발로 “경영진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이던 2019년 7월 18일 사설에서 “서울신문 115주년, 독립언론의 길 꿋꿋이 걷겠다”며 “자본력을 내세운 인수합병은 해당 언론이 공공재로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지 의문스럽게 하는 현실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언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던 서울신문이 이같이 ‘변신 아닌 변신’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3년 만의 변모는 그 발단에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가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포스코의 보유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스코 지분의 호반건설로의 매각은 ‘기습적’으로, 서울신문 구성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현 사태는 그 같은 몰이해를 넘어서 언론에 대한 어떤 의도나 작정에 의해 공영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기 자신이 그 뜻을 제대로 아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지만 줄곧 외치는 그의 입버릇과 같은 말, ‘자유’가 공영 언론사를 인수할 ‘자유’와 만난다면 공영언론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화라는 이름의, 자유 아닌 또 다른 ‘구속’이 될 것이다. 공영언론의 지역화, 민영화가 아닌 공영언론의 진정한 공영화를 얘기할 때다.
[divide style=”2″]
[box type=”note”]
이 글은 언론 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언론포커스’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이명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입니다.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