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격 고로케] 사이트가 화제를 끌면서 새삼 다시 대중적 관심사로 (잠깐) 주목받은 것이 바로 언론의 자극적 접근(업계 용어로 ‘센세이셔널리즘’)이다. 제목에 충격! 경악! 헉! 알고 보니… 등의 자극적 표현을 가득 채워서 호객을 하는 방식부터, 내용 자체에서도 사회적으로 사소하다 할지라도 자극적인 소식을 주로 캐내거나 또는 아예 어떤 사안의 자극적 측면만을 최대한 과장하는 것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센세이셔널리즘은 나쁘니까 그만둬라!라고 속 편하게 훈계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것은 소식을 발굴하고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저널리즘에 거의 근본적 차원으로 붙어 있는 편향이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떨쳐낼 수 없다. 세상에 넘치는 다양한 소식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알려주는 이 소식에 집중해야 할 매력을 한눈에 보여줘야 하며, 나아가 내 보도를 접하고 나면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만족감까지 줘야 하기 때문이다.
짧고, 굵고 감각적으로… ‘앗!’ 하는 사이
게다가 매체 속성 자체에 따라서 원하지 않았던 자극성이 절로 생겨나기도 한다. 같은 사안을 다루더라도 짧고 굵게, 감각을 더욱 동원하는 정보를 넣어 제시하면 자동으로 더 자극적 느낌을 주고, 그것을 고려하여 절제하지 않으면 ‘앗’ 하는 사이에 선정적 모양새가 된다.
길이의 문제는, “개의 짖음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개에게 빗자루를 흔들었고 그것에 자극받은 개가 얼굴까지 달려들자 물어뜯을 듯한 동작을 취하여 개를 쫓아냈다”와 “사람이 개를 물었다”의 차이다. 선정성을 피하려면 세부적 뉘앙스와 각종 제한 사항들을 넣어야 하고, 그러려면 길어진다. 그런데 길면 사람들에게 좀처럼 읽히지 않는다.
감각의 문제는, 어떤 사고현장을 건조한 글로 서술하는 것, 감각적 어휘를 동원하여 묘사하는 것, 큰 사진을 함께 넣는 것, 시간 제약이 엄격한 방송뉴스 영상으로 현장 자료화면 위주로 훑는 것의 결과물 차이를 상상해보면 된다. 선정적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선정적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편향이 발휘된다.
‘최’… 최고, 최대, 최초
충격-경악-헉 같은 노골적 호객행위가 아니라도 널리 사용되어온 자극성 편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최’다. 대상을 다루면서 최고, 최대, 최초 같은 수식어들을 간단하게 남발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오보다. 최초의 **이라고 기사화를 하는 순간, 그 이전에 나왔던 **의 역사는 리셋되며, 최대의 **이라고 쓰는 순간 나머지는 모두 열등한 것이 된다.
하지만 과학적 발견이든 역사 탐구든 ‘최초’라는 것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규정되지 않고, 최고 최대를 따지기에는 은근히 비교범주들이 너무 많다. 기자가 온갖 관련 맥락들을 주의 깊게 비교분석 후 소신껏 쓰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도자료를 보고) 대충 막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독자들은 “이승엽,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이승엽, 만약 아시아 리그들의 경기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다면 신기록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홈런을 쳐냈으니 나름 자랑스러워할 만하지만 역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싶어 할까. 독자에게 있어서 관심은 한정된 자원이고, 가급적이면 덜 쓰고도 선명한 쾌감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매체 간 ‘맨주먹 경쟁’
물론 이런 매체 자체의 속성에 의한 자극성 편향 말고도, 매체 간 경쟁에 의한 적극적인 센세이셔널리즘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 언론계에서는 정치적 진영을 브랜드 가치로 사용하는 것은 흔한 반면에, 고급 저널리즘을 브랜드 가치로 각인시키는 전통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더욱 체면 챙기지 않는 맨주먹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 선정적 제목 낚시질을 하는 것에는 정론지를 자처하는 언론사의 온라인팀이라 할지라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조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팁: 선정적인 불량 뉴스 걸러내기
하지만 요점은 자극성 편향이란 일정 정도 줄이도록 공공적 규제의 룰을 적용해볼 수는 있어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거나 정말 완전히 사라지게 할 만한 손쉬운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정성이란, 경쟁 상태에 있는 언론사의 몸부림이자 독자의 요구다.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 턱없이 짜고 매운 음식이 나오면 양념을 조금 털어내고 먹듯이 일정 정도는 독자들이 자극성 편향을 알아서 걸러내며 뉴스를 소화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맛이 너무 막나가는 가게는 발길을 끊는 것도 지혜다.
첫째, 일반화는 금물이다. 자극성 편향으로 묘사된 어떤 모습을, 보통 풍경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보도된 것은 개별 사례, 그 중에서도 무려 뉴스로 선정될 만큼 특수하게 자극적인 사례다. 다만, 이런 것이 일반적임을 제대로 증명해주는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붙어있다면 좀 더 따져 봐도 좋다.
둘째, ‘최’ 시리즈(최대, 최고, 최초 등)로 수식된 내용은, “돋보이는 사례 중 하나” 정도로 바꿔 읽어라. “사상 최대의 김밥 제작”이라면, “크기가 돋보이는 김밥 중 하나 제작” 정도로 읽으라는 말이다.
셋째, 펑펑 터트리는 것 말고, 조곤조곤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글들도 읽다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안 믿기면 캡콜닷넷이라는 사이트를 구독해보시길(…그럴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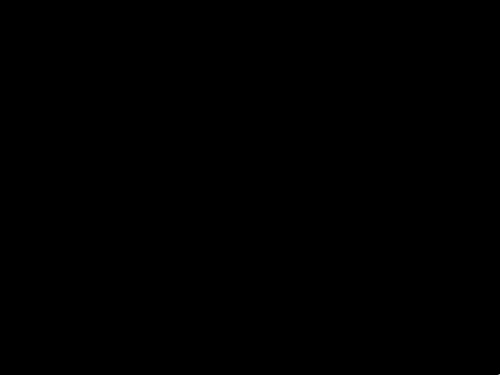

놀고있네. 가지가지한다. 아주… 너나 잘하세요 좆만한 독자놈들이. 박남일 시인 인용. 멱살잡히고 싶지 않으면 숨어살아. 남자라고 안 봐준다.너가 한 짓 니가 더 잘 알잖아. 위선자
위에 댓글에서 흠칫 놀라며…-_-;
결국은 블로그 홍보인가요 ㅎㅎㅎ
스트레스 높은 사회다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건강이 상할 수 있죠. 다들 건강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