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서비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네이버가 새로 준비한 서비스 [네이버 원더]다. 관심은 서비스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 걸까.
스타일쉐어 vs. 네이버 원더
스타일쉐어는 패션 SNS이며 보통 사람들의 스타일링과 패션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2011년 6월 대학생들이 모여 만들면서 시작했다.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사진을 찍은 다음 다양한 정보를 붙여서 서비스에 업로드 하고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가입자수는 20만 명 정도라 하고, 그 중 해외 사용자가 20% 정도 된다고 한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사진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패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포즈라는 서비스와도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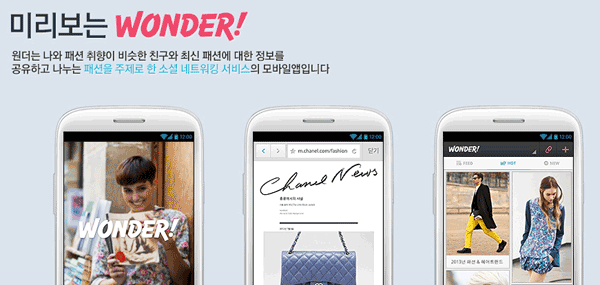
네이버 원더는 2013년 3월 15일 서비스 예정이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역시 패션 SNS를 표방하고 있다. 티저 페이지를 보면 패션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패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다.
이 두 서비스, 개요를 들으니 어딘지 모르게 비슷해 보인다. 네이버 원더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글은 실제로 똑같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먼저 시작한 벤처 서비스이고, 하나는 뒤늦게 시작하는 국내 1등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라는 구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이디어 베끼기 or 돈이 되면 한다
2013년 1월 6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대토론”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재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 중 몇 가지만 풀어보자.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만든 것을 정말, 이게 좀 잘나갈 것 같다 싶으면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같은, 저희가 지금 모바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 달라요. 정부에서는 1인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 활성화 해가지고 많은 교육 기관을 만들고 대학과 협력해가지고 개발 교육을 시키고, 훌륭한 좋은 개인 개발자들을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인 개발자들이 시장에 막상 제품을 던지면 대기업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괜찮다,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그대로 만들어서 더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력으로 그냥 뿌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도 자연스럽게 묻힙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산업에서는 대기업 골목상권 규제, 공정거래법 이런 적용이 나름대로 되고 있지만, 지금 또 할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인터넷, 모바일, 컨텐츠 산업에서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 78%입니다. 전국민이 검색 네이버로 하고 있지만, 지금 공정거래법상 30% 이상 넘어가면 독과점으로 규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터넷 산업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거, 네이버가 똑같이 만들어서 버티컬하게 쏩니다. 네이버가 메모장, 가계부, 시계, 알람시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알람시계까지 만들면 개인은 뭘 만들라는 겁니까. 중소기업할 사람들은 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중략)
표철민
제가 베꼈다는게 아니구요 괜찮아 보이는 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이나.사회자
법에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현행법상?표철민
그렇죠. 네. 물론 아까 VCR에 나온 대로 중소기업이 만들 걸 사진 찍어서 베껴갔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테스트 베드처럼, 테스트처럼 미리 시장에서 미리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그걸 대기업들이 캐치해서 만드는 거죠.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런 걸 저는 양심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의 양심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표철민
그게 양심의 문제일까요? 대기업들이…김정호
저는 구글이든 애플이든 간에 계속해서 업종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벤처기업들을 흡수를 합니다. 근데 사주죠.표철민
그렇죠. 한국은 아니죠.
인정하기 vs. 베끼기
구글의 경우 서비스 자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구글의 대표 서비스인 유튜브는 구글이 2006년에 약 16억 5천만 달러에 주고 인수한 서비스다. 안드로이드 역시 5천만 달러를 주고 2005년에 인수해서 시작한 플랫폼이다. 구글의 대표적 블로그 서비스인 블로거닷컴, 구글 애널리틱스도 마찬 가지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사의 핵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하여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참조: Lis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by Google)
애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핵심 서비스/제품이라 할 수 있는 아이튠즈, 아이웍스, 로직, 가라지밴드, 아이클라우드, 아이튠즈 매치, 아이애드 등등 다양한 서비스가 기업 인수를 통해 시작되거나 다듬어졌다. (참조: Lis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by Apple)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가 시작해서 엠파스에 인수된 후 지식거래소가 된 서비스를 네이버는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따라 만들었다. 다음이 만든 카페 서비스를 네이버는 이름까지 똑같이 따라 했다. 다음의 플레이스, KTH의 아임IN은 포스퀘어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서비스이며 CJ의 인터레스트미는 심지어 핀터레스트와 이름까지 비슷하다. 왓츠앱이라는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카카오톡이 인기를 얻자 국내에서 좀 한다는 업체들은 일제히 비슷한 기능의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무언가 뜨는 서비스가 나오거나 인기가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면 국내 유수의 포털 및 대기업들은 일단 따라하고 본다. 그것이 기업 인수 등의 방법으로 그 아이디어를 먼저 구현해 냈던 사람들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보고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쯤되면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국내 유수의 포털 및 대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혹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자신들의 힘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거창한 사명이 있는 걸까? 대세에 뒤처지지 말자는 걸까? Winner takes it all?
핵심 가치 vs. 생존 욕구
애플이 아이패드를 처음 내놓았을 때 고작 아이폰을 네 개 붙여놓은 것 아니냐는 말로 시작해서 이러다 애플이 아이카, 아이홈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유머도 있었다. 즉, 브랜드 충성도가 크기 때문에 애플은 아무 제품이나 내놓고 아이(i)만 붙이면 되지 않냐는 것이 유머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애플의 각종 아이프로덕트(iProduct)가 유머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애플은 전자제품이 아닌 것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IT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면 인터넷에서 오래 일하는 친구들끼리 하던 농담들이 있다. ‘야, 이러다 구글이 커피도 팔겠네.’, ‘이러다 애플이 옷도 만들어 팔겠네’ 같은 식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으로 오면 농담이 아니게 된다. “문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CJ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라는 CJ는 여전히 설탕을 만들고 햇반을 만들고 케이블TV에 디지털 음원 서비스도 한다. 애플 아이폰의 오랜 대항마인 삼성은 보험도 하고 놀이동산도 하고 호텔도 운영하고 옷도 판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최근 카페베네에 투자를 했다. 왜 이렇게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일까.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고사하고 사회적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이 가장 큰 존재 이유인 기업들이 다수인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기업들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연봉과 직책이 개인의 가치를 압도하는 것 역시 당연한 사회가 되기 마련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직장은 정글과도 같다는 말들이 있는데, 나는 가끔 그냥 동물로서 정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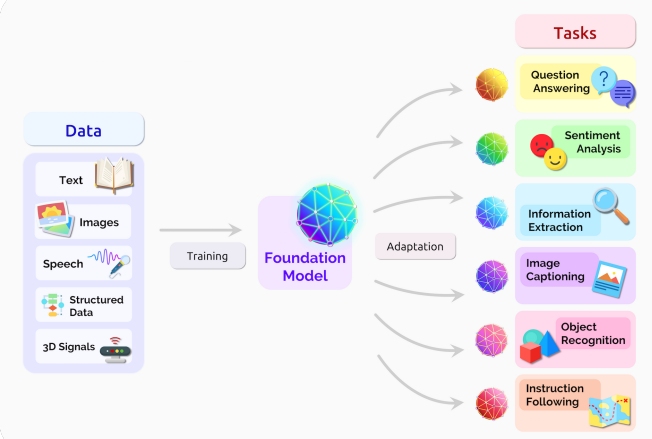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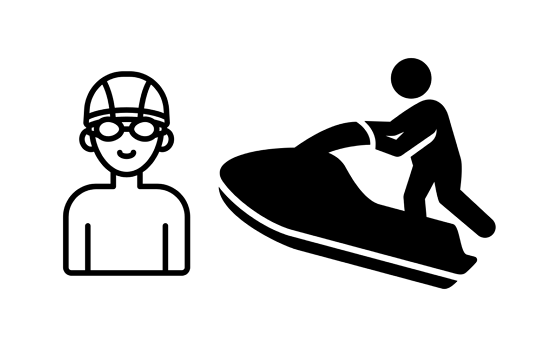

헐.. 글 너무 멋지게 잘쓰시네요. 구글리더 대체 검색하다 훌륭한 글 몇 개 읽고 갑니다.
백이십프로 공감합니다.
이건 대기업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신규사업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에는 단서가 붙죠.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고, 투자가 적어야 하고, 리스크는 없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직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괜찮다 싶은 녀석을 따라 하게 되고 그게 유통되는 식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누구나 얘기를 하지 않죠. 자신들의 밥줄이 달린 문제다보니.. ㅠ.ㅠ
암튼 잘 읽고 갑니다!!!!
얼마전 영국의 17세 소년이 만든 서비스가 야후로부터 30만불에 인수되었죠.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대단히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한마디로 30만불이면 그런 서비스를 수십개 이상은 찍어 낼수 있을 돈이죠. 그러나 야후는 이걸 엄청난 자금에 인수했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안봐도 뻔하죠. 그냥 큰 기업이 스스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소년이 한국인 이었다면 잘해봐야 그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할때 가산점을 좀 받는 정도였을 겁니다.
30만불이 아니라 3000만불입니다. :-)
사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우리 나라는 쉽지 않은 구조인거 같아요 젤 큰문제가 시장의 규모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단 영어권이라는 큰 시장속에서 몇백억을 주고 회사를 인수해도 그이상의 돈을 벌수가 있지만 사실 우린 오천만 시장밖에 되질 않으니 큰돈을 주고 인수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