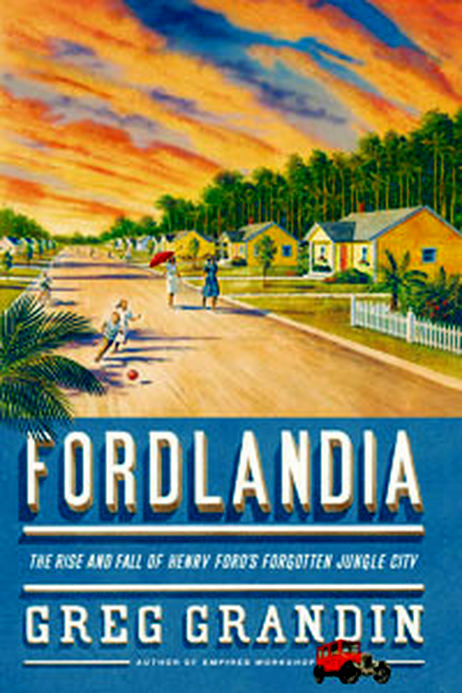[box type=”note”] 일상,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의 시공간 속을 흘러갑니다. 그 순간들을 붙잡아 짧게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언어’로 함께 쓰는 특별한 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편집자) [/box]
깜빡깜빡
“예전에는 ‘시냇물만 건너도 다 까먹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문지방만 넘어도 다 까먹는 거 같네.”
“왜요, 어머니?”
“아, 너 아까 나한테 뭐 웃긴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웃겼다는 것만 생각나고.”
“ㅎㅎㅎ 글쎄 뭐였을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세월이 갈수록 많은 걸 잊고 산다. 시냇물 건너지 않아도, 문지방 넘지 않아도. 냉장고 문 닫는 소리에도 기억이 우수수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은가.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웃게 한 기억을 자주 잊는 것 같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은 잘 기억하면서 말이다. (그러고 보면 흔히들 말하는 ‘머피의 법칙’은 선별적 기억의 산물인 듯.)
날 웃게 만드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뭐로 어머니를 웃게 했는지도 곧 생각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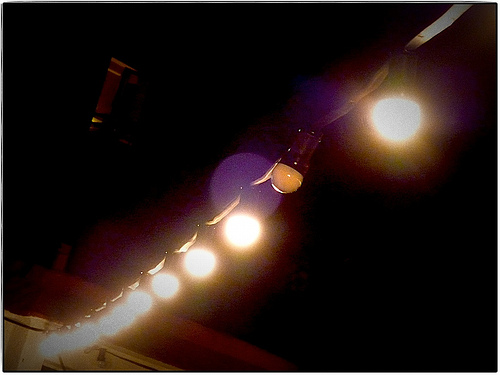
[divide style=”2″]
이어폰
아차, 급히 나오다가 이어폰을 두고 왔다. ㅠㅠ
월요일. 이어폰은 평소와 다른 역할을 한다.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는 역할 외에 지하철에서의 ’15분 수면’의 끝을 알리는 알람을 듣기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그 순간 폰 화면에’어머니’가 뜬다.
“너 이어폰 두고 갔다.”
“아 그거 때문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바로 갈게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한다.
‘바지 갈아입은 걸 깜빡했네.’
1분 후 집 앞. 어머니가 이어폰을 손에 들고 있다. 어디에서 찾으셨는지 물으려 입을 떼려는 순간, 어머니가 입을 여신다.
“바지 갈아입었지? 주머니에 있더라.”
하아.
“이건 필시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어머니 몸을 빌려서 말하는 게 틀림 없다구!”

[divide style=”2″]
연변 커플
일 년 하고도 두 달 만에 돌아온 서울집. 옆집(사실 옆집이라곤 하지만 입구가 완전히 붙어 있는 구조여서 ‘옆방’이라고 하는 게 보다 적절한 묘사일 듯)에 살던 연변에서 온 부부가 방을 빼고 나갔고, 나이가 꽤나 지긋한 또 다른 연변 커플이 새로 들어와 살고 있다. 예전에 살던 부부가 아주 조용한 편이었음에 반해 지금 커플은 나름 시끄러운 편이어서 태가 확 난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 뒤엔 사연 하나가 숨어 있었으니……
어느 늦은 밤, 어떤 연변 여자분(이라고 추측되는 분)이 우리 집 문을 마구 두들기며 ‘도와주세요’를 반복해서 외치더란다. 혼자 지내고 계셨던 어머니는 무서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알고 보니 이전 세입자 두 명은 공식적인 부부가 아니라 불륜 관계였고, 문을 두들긴 사람은 연변에서 낌새를 채고 머나먼 한국까지 찾아온 본처였던 것.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불륜 커플’은 야반도주를 했고, 그 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다. 어머니의 추측으로는 본처 되는 아주머니가 밤에 오갈 데도 없고 자기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기도 하여 우리 집 문을 두들긴 거 같다고.
예전에 어머니가 “몇 년 옆집에 살면서도 그 집 아줌마가 집안 일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다. 즉, 이전 ‘불륜 커플’ 중 청소, 음식, 설거지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은 아저씨였다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오로지 아저씨만 일했던 이유가 이런 그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게 어머니의 추측이다.

깜빡깜빡, 2013년 11월 4월
이어폰, 2013년 5월 27일
연변 커플, 2012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