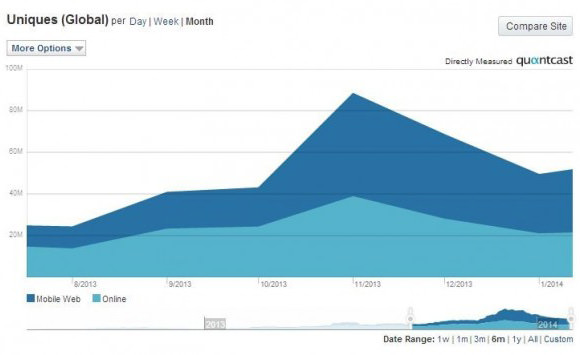오래전 일이다. 신문을 펴기만 하면 ‘꿈의 통신’이라는 말이 나왔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꿈의 통신’을 입력하면 이런 용어들이 쏟아진다: PCS, IMT-2000, 플림스(FPLMTS), ISDN…. 지금 시각으로 보면 기가 차는 일이다. 저런 게 ‘꿈의 통신’이라니. 그래도 이건 90년대나 2000년대의 기사다. 그 당시로써는 이런 게 ‘꿈의 통신’이었구나 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꿈의 상품’… 그 꿈은 누구의 꿈일까
하지만 1987년 1월 1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는지도 모른다. 제목부터 [꿈의 통신혁명…1가구 1전화 시대 활짝]이다. 요컨대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8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화시설 수는 8백81만회선에 보급대 수는 7백60만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천2백만 명, 가구 수는 9백20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어 가구당 전화공급률은 95.6%, 전화수용률은 8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것이 통신혁명이라는 것이다. 기사 바로 아래에는 기사가 차지하는 지면의 갑절 크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을 실현”한다는 ‘첨단기술의 상징 삼성반도체통신’의 광고가 실려 있다.

어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회사건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이게 ‘꿈의 상품’이라는 걸 강조한다. 그것만 있으면 ‘한방에’ ‘단번에’ ‘신속히’ 문제가 해결된다. 말을 좀 점잖게 써서 그렇지 바꿔 말하면 ‘이 약 한번 잡솨 봐’, 딱 그 짝이다. ‘꿈의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 꿈은 도대체 누구의 꿈일까. 독자의 꿈일까, 기자의 꿈일까, 아니면 보도자료 작성자의 꿈일까. 혹은 그 회사의 경영자나 주주들의 꿈일까. 하지만 ‘꿈의 상품’, ‘꿈의 통신’이라는 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사이 어느새 그 꿈은 결국 독자들의 꿈이 되고 만다.
후배 기자에게 가장 먼저 해준 말
ICT를 담당하면서 어줍잖게도 후배를 처음 가르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준 말은 “기업의 보도자료에서 팩트와 광고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보도자료는 본래 홍보의 일환이고 제품이나 상품의 홍보라는 것은 결국 마케팅 또는 광고다. 그럼에도 언론사가 그 기사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다는 것을 지금의 독자들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가정하는 거다.
그러므로 기사는, 보도자료 작성자가 아니라 독자를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에서 팩트를 뽑아내서 그것만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기사가 아니라 광고가 된다. ‘꿈의 통신’이라는 말도, 그 말을 홍보 담당자가 먼저 기자에게 귀띔해줬는지 기자가 만들었는지와 관계없이, 광고가 될 여지가 많다.
기업만 그런 것도 아니다. 휴대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박’ 따위 용어를 쓰며 언론이 소개했던 와이브로는 결과적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KT는 와이브로를 시분할 LTE로 바꾸고 싶어하고, 와이브로 실패를 제 때 인정하지 않은 정부는 뒤늦게 기존 가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던 와이브로 서비스의 희생양은 물론 가입자들이다.
10년 뒤에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기사
지금 ICT 기사에서 매번 언급되는 LTE와 LTE-A, 옥타코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와 같은 낱말을 10년 뒤에 본다면 느낌이 어떨까. 물론 2013년 쓰는 기사에서 10년 뒤의 독자를 굳이 상정할 필요는 없다. 기자들이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는 데 약간의 자조가 섞여 있긴 하지만 기사라는 것이 당일의 쓸모를 위해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기사는 분명히 남는다. 기사는 도서관에 남고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남고 포털에도 남는다. 종종 학술논문에 인용되기도 하며 심지어 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10년 뒤에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게 옳지 않겠나.
문학평론가 유종호 선생은 언젠가 생경한 외래어를 통해 시적 효과를 노렸던 김기림의 작품보다 토박이말을 썼던 백석의 시가 지금까지 사랑받으며 훨씬 더 긴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나는 ‘꿈의 통신’ 운운하는 기사가 틀린 기사라거나 광고나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기사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김기림도 훌륭한 시인이지만 백석의 시가 더 아름답지 않은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
생경한 외래어 같은 LTE와 LTE-A, 옥타코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같은 말의 생명력이 얼마나 갈까. 그리고 기사는 얼마나 시와 닮아갈 수 있을까. “알고 보니”, “충격”, “경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또다시 혁신”이건 “혁신은 없었다”건 호들갑을 떠는 기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
요컨대 나는 좀 더 차분하고 담백한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divide style=”2”]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쉼표, 숨표]에도 실렸습니다. 본문 일부는 슬로우뉴스 편집원칙에 따라 수정, 보충했습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