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4.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box]

시작: 마구잡이 사찰을 막기 위한 네 가지 개정안
2014년 12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오픈넷과 함께 작업한 네 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 개인정보보호법
- 형사소송법
이 네 건의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공통점을 지닌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시받는 국민에게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에 대한 통지를 앞당기는 것.
- 통신자 신원 확인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
- 시험점수처럼 자신의 개인정보를 몰라야 하는 경우라도 시험점수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축소.
- 사업자들은 감시투명성 보고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지금부터 이 네 건의 법률 개정안 중 중요도가 높은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자.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현행 – 경찰이 통신자료를 확인 후 통지를 잘 하지 않는다.
우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처분하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통지를 받지 못한다. 또한, 검사장 승인을 얻어 통지를 무기한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 아예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개정안 – 길어도 1년 이내에는 모두 통지할 수 있게 하자.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을 집행할 경우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만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넷은 대국민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가를 체감할 수 있어 영장을 발부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전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넷은 원래는 통신압수수색에 대한 당사자 통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전통지 또는 즉시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통지 조항을 개선하는 선에서 발의하게 되었다.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행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기록을 업체로부터 받아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제공되어 왔다.
이는 영장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많아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한 바 있으며 2014년 6월 캐나다 대법원에서도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다.
통신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가입자 정보만이 아니다.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은 그 전화번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그 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가 알려진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서 당연히 영장을 받아서 해야 한다.
개정안 –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으며, 감시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자.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 규정인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집행에 대한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현행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받아도 시민 당사자는 몰랐다.
대부분 사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공문 한 장만으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받아 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그 제공 및 이용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통지해주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그런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 –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통지를 받도록 하자. 정부도 이걸 지키자.
법 개정을 통해 똑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에도 개인정보이용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공공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divide style=”2″]


감청 설비를 의무화한다고?
2014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지금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사실 이 감청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아니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들어섰다. 검찰은 새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괘씸한’ 카카오톡을 혼내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잠잠해졌던 카톡 감청 논란에 검찰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공언한 대로 감청 영장을 거부하니, 법을 고쳐서 이런 사업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SBS뉴스 – “법 고쳐서라도 처벌”…다시 불붙은 ‘카톡 감청’ 논란 (2014년 11월 13일)
다음카카오는 도로나 전봇대 등 국가 인프라를 이용하는 통신망 사업자가 아니다. 보통 정보통신업체로 뭉뚱그려 말하는데, 정보기업과 통신업체는 엄연히 다르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정보업체는 말하자면 부가사업자다. 이들에게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위헌으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카카오와 같은 정보서비스업체에게까지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마치 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에 수사기관이 모두의 육성 대화를 엿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든 대화를 수사기관이 들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도 상식 밖의 명령이라고 혀를 찰 일인데, 이걸 일반 사기업에 강제하려고 하다니, 어불성설이다.
‘모든 대화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대화는 항상 엿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전 세계의 수사기관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항상 무산됐다. 예를 들어 고도로 암호화된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말할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같아서 역시 무산됐다.
설비 안 하거나 협조 안 하면 처벌한다고?
통신망사업자는 감청에 협조하면 전기신호(패킷)를 줄 뿐이지만 암호키를 가지고 있는 정보서비스업체가 감청에 협조할 때는 패킷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수사에서건 말하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처벌할 수는 없다. 영장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상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이며 묵비권이다.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데이터 의무기간 설정과 관련한 논란은 있었지만, 인터넷사업자에게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강정수 박사)
영장은 검찰이 영장에 적힌 일을 할 무소불위의 권한을 법원이 주는 것이다. 그럼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 기술과 자원이 부족해서 직접 문따고 들어가서 하기 어렵다고?
어떤 이유에서든 엿들을 수 없는 대화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수사기관은 받아들여야 한다. 귓속말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라도 정부와 수사기관이 “모든 대화는 수사기관이 엿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그 꿈에서 깨야 한다.
[divide style=”2”]
[box type=”note”]
오픈넷은 이 글을 함께 기획하고, 슬로우뉴스의 재정을 지원한 시민단체로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정신을 지향합니다.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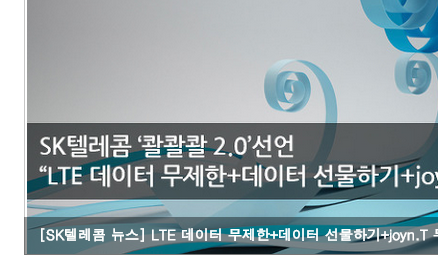


좋은 기사네요
ㅇ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