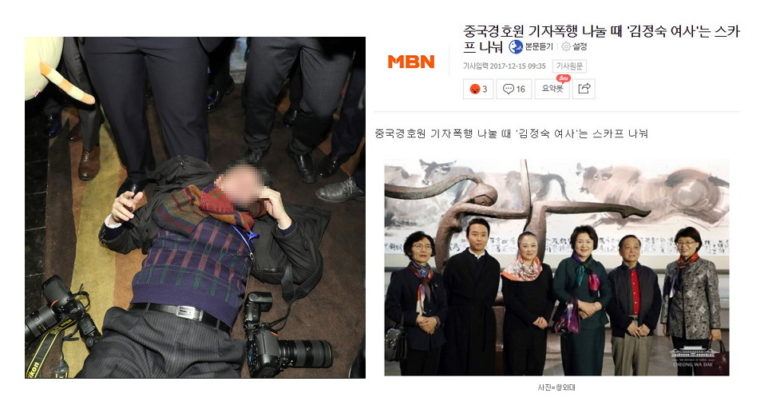어린 시절 ‘식당’과 관련해 두 가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기사 식당 vs. 터미널 식당
하나는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식당이요, 또 하나는 기사 식당이다. 둘의 공통점은 ‘단골’보다는 ‘뜨내기손님’이 많다는 점이요, 차이점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내 어릴 적 기억으론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식당들은 참 불친절했다. 게다가 맛은 별로이면서 값도 싸지 않았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한번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 취급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기사 식당 역시 단골보다는 일회성 손님 비중이 컸다. (입소문이 난 뒤 단골을 대거 끌어모은 곳은 논외로 하자.) 그런데 기사 식당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좋고 음식 맛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다.

왜 기사 식당은 터미널 식당보다 맛이 좋을까?
둘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당연한 얘기지만, ‘뜨내기손님’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 식당은 ‘뜨내기손님’의 일회성 방문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보니 그들은 평판보다는 “지금 당장의 수익”과 “지금 당장의 편익”에 유난히 집착했다.
반면 기사 식당은 그들의 기동력과 입소문에 더 신경을 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기사라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소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부분에도 신경을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번 보고 말 사람이란 생각보다는, 반복 방문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을 것 같다.
물론 내 얘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다. 그것도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귀동냥했던 ‘비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 앞의 얘긴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라.
(참고로, 요즘 버스 터미널 앞 식당들은 예전 같지 않다. 이제 그들은 ‘나만의 영업’이 아니라 ‘터미널 식당 상가’란 공동체의 평판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게다가 요즘은 큰 도시의 터미널은 대개 복합상가나 백화점이 들어와 있어서 예전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특정 사이트 한 달에 10번 이상 방문? 7%뿐
자,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이제 개별 매체의 단골 독자가 사라졌다는 건 더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진단이다. 몇 년 된, 그것도 외국 자료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번 살펴보자. (내가 몇 년 째 강의할 때 써먹는 자료다.)

시청료 조사 전문 기관인 닐슨과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012년 조사한 자료다. 골자는 간단하다. 미국 25대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는지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특정 사이트를 한 달에 10번 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범위를 아주 확대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는 비율까지 확대해도 35%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65%는 특정 사이트를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한다고 응답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할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다른 경로로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는 여러 차례 봤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게 그 사이트에 실린 기사인지 인식을 하지 못할 따름이다.
공유지의 비극: 터미널 식당 닮은 한국 온라인 매체들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얘기를 풀어나가 보자. 이쯤 되면 현재 온라인 매체들이 처한 상황이 1970년대 이 땅의 황량한 버스 터미널 앞 식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두 번 방문하면 그만인 독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셈이다.

포털 문제가 한창 논란거리가 될 당시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이 유행했다. 플랫폼 업체인 포털 쪽 관계자가 처음 입에 올린 이 말은 한동안 척박한 국내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을 진단하는 말로 (언론사 관계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렇다고 내가 저 진단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현상을 설명하는 한 실마리 정도는 되겠다는 정도 의미다.)
물론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데 어느 정도는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난 더 큰 문제는 ‘단골손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시외버스 정류장 앞 식당’ 주인 식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공유지에 있는 목초를 마구 베어내자는 얄팍한 생각의 이면을 따지고 들어가면 ‘한번 보고 말 독자들인데’란 또 다른 무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내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동안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은 ‘시골 터미널 식당 주인’ 같은 마인드가 지배해 왔던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해보자. 택시 기사들보다 더 기동력 뛰어나고, 더 빅 마우스인 독자들의 입소문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닌지도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사 식당 주인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당장 많이 팔면 그만이란 생각, 눈앞에 보이는 고객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반복해서 찾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겠다는 강박 관념을 좀 더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