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과 [뉴스위크]를 구독하던 시절이 있었다. 대학생 때다. 작은 그룹을 만들어 타임 (혹은 뉴스위크)를 교재 삼아 영어 공부를 하던 시절이다. 하지만 실상은 애먼 돈만 탕진하며 ‘구’ (購)에 머물렀을 뿐, ‘독'(讀) 수준은 언감생심이었다. 영어 실력이 달렸고, 그런 부족한 실력을 보충하려는 노력은 더 달렸다. 게을렀다. 들춰보지도 않은 채 쌓이는 잡지가 늘었다.
그러면 문득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끊거나, ‘혹시 [뉴스위크]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로 잡지를 바꿔보기도 했다. 물론 결과는 마찬가지. [뉴스위크]가 전반적으로 [타임]보다 조금 더 가볍고 쉬운 문체를 구사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판단이었지만, 그렇다고 매주 읽어낼 만한 수준은 역시 아니었다. 지금도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타임]이나 [뉴스위크]를 만나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뉴스위크]와 함께 특히 '80, '90년대 영어공부 교재로 널리 활용된 [타임] 매거진.](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7/11/i_10-1.jpg)
디지털 시대, 뉴스워크의 쇠락
당시,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타임]과 [뉴스위크]는 정통 시사주간지의 상징과도 같았다([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도 있었지만 그 세력에서는 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다 디지털과 온라인의 도도한 물결이 밀려들었다. 두 매체 모두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타임]은 ‘패스파인더’ 같은 포털을 시도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발행부수와 자본력에서 열세였던 [뉴스위크]는 그렇지 못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디지털의 물결은 [뉴스위크]에 물결이 아니라 쓰나미였다. [뉴스위크]는 주인이 바뀌는 곡절에 잘못된 편집장을 만나는 불운까지 겹치면서 결국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타임]은 그런대로 선전했다. 종이 잡지의 발행 부수도 2017년 현재 3백만 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 잡지 가릴 것 없이 디지털의 광풍에 추풍낙엽 신세인 종이 매체의 전반적 몰락을 감안하면, [타임]이 아직도 3백만 부나 팔린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 보인다. 이 [타임]이 최근 ‘메레디스’(Meredith)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잡지 출판사에 팔렸다(매각 절차는 2018년 3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 참조: 노컷뉴스, 뉴욕타임스).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베터 홈 & 가든즈]를 펴내는 곳이다.
[타임] 인수에 개입한 ‘코흐 형제’
이번 [타임] 매각 소식에 [타임]의 종말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가령 [타임]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다 블룸버그로 옮긴 조 노세라 같은 언론인은 [타임]의 죽음은 불가피하다며 조사에 가까운 글을 썼다. 그런 판단의 근거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극우보수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돈줄인 코흐 형제가 메레디스의 타임 인수에 6억5천만 달러나 쏟아부으며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투자 의도가 특히 [타임] 언론인들의 시각에서는 지극히 암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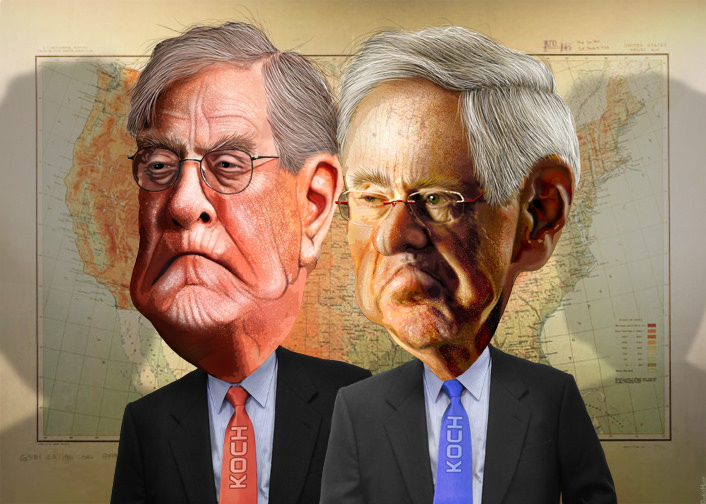
종이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널리즘이라는 비즈니스 영역 자체가 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비즈니스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더 날카로운 직관과 판단력을 가졌을 코흐 형제가 메레디스-타임 합병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가 결코 비즈니스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시사한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코흐 형제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후원 세력이고, 따라서 그의 정치적 어젠다를 좌지우지하는 사실상의 ‘막후 황제’로까지 평가된다. 석유 시추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막대한 재벌이면서도 정작 기업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들 형제가 소유한 ‘코흐 인더스트리즈’는 연간 매출액이 한화로 100조 원이 넘는 미국 내 제2위의 사기업(private entity)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현지의 진보 언론이 분석하는 코흐 형제의 타임 인수 배경, 그리고 전망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의 죽음”
코흐 형지가 [타임]의 편집 방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허언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쳐 온 타임의 취재 방향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 자체가 환경 파괴와 직결된 코흐 형제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타임의 환경 분야 취재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1. 기업 문화의 충돌과 갈등
기업 문화의 심각한 충돌과 갈등, 그로 인한 대규모 인력 변화가 불가피하다. [베터 홈 & 가든], [미드웨스트리빙], [셰이프] 같은 잡지를 내는 메레디스 그룹의 본사는 일리노이주 디모인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기업 문화가 ‘through and through Mid-West’(직역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중서부 (중심주의)’)라고 표현된다. 전통적으로 보수 기독교의 전통이 강한 중서부 문화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에 비해 [타임]은 동부, 그 중에서도 뉴욕 문화를 대변한다. 전라도-경상도에 견주면 너무 심한 비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두 문화가 쉽게 잘 섞이고 조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2. 우리는 코흐 형제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타임]의 매각은 궁극적으로 ‘한 시대의 종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이라는 매체의 죽음’ (“the end of TIME as we know it”)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물론 상징적인 표현이다. [타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 브랜드의 힘만으로도 오래도록 번성할 만한 매체다). 그 맥락이나 과정은 다르지만, 타임과 더불어 시사주간지 시장을 주도했던 [뉴스위크]처럼, 타임도 과거의 반듯하고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통 주간지의 정체성을 더는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흐 형제는, 저널리즘에 관한 한, 결코 우군일 수 없는 운명이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으로 꼽을 정도로, 보수적인 의제를 들이미는 이들 형제의 정치적 입김은 매우 강력하다. [타임]의 언론인이나 다른 진보 매체들이 코흐 형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즈니스 분야에 몸 담고 있다는 점 말고도, 언론에 대한 과거 행태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언론인 제인 메이어가 코흐 형제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취재할 때, 코흐 형제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메이어의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뒷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온갖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하고, 출간을 저지하기도 했다. [타임]의 기자들로서는 잡지의 메레디스 매각 소식에 ‘멘붕’ 사태를 겪을 만하다. 꽤 많은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매체들
언론 격변의 시대다. 캐나다는 11월28일 토스타(Torstar)와 포스트미디어(Postmedia)가 캐나다의 지역 신문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딜을 맺으면서, 꽤 오랫동안 해당 지역의 지킴이 구실을 해왔던 여러 신문들이 문을 닫게 생겼다. 토스타는 캐나다의 최대 신문인 [토론토스타]와 ‘할리퀸 로맨스’ 판권을 가진 기업이고, 포스트미디어는 캐나다의 2대 전국지 중 하나인 [내셔널포스트]를 비롯해 [오타와시티즌] [밴쿠버선] 같은 신문을 거느린 캐나다 최대 언론 기업이다.
미국을 보아도, 캐나다를 보아도, 기존 종이 매체의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모모 신문사가 몇 명을 감원한다, 혹은 모모 신문사가 문을 닫는다, 같은 소식이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이코노미스트] 같은 성공 사례도 있지만, 열에 아홉은 그 반대다. 엄격히 따져 보면 위 신문들도, 과연 그게 ‘성공’일까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저 생존의 길을 찾은 수준이 아닐까?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마케팅을 상시 전개해 왔고, [워싱턴포스트]는 저가 전략으로 유명한 아마존에 팔리면서 역시 비슷한 대규모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월 구독료를 1달러 수준으로 낮춰 팔기도 할 정도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학교에 마케팅 초점을 맞추는 한편, 고급 컨퍼런스 개최와 시장 연구 조사 보고서 같은 일종의 ‘파생 상품’으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모색되는 저널리즘 생존의 한 시도는 언론사를 ‘비영리 법인화’하는 것이다. 독자, 시민, 인권단체 들로부터 모금을 받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나 기업의 관련 지원금도 일정 부분 받지만,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런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체로 문화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정부의 영향권 아래 놓인다고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비영리 법인 체제는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보면 나름 타당한 흐름으로 보인다.
어쨌든 저널리즘 비즈니스로 막대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 흐름과 기술 발전 양태로 볼 때, 사실상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함, 즉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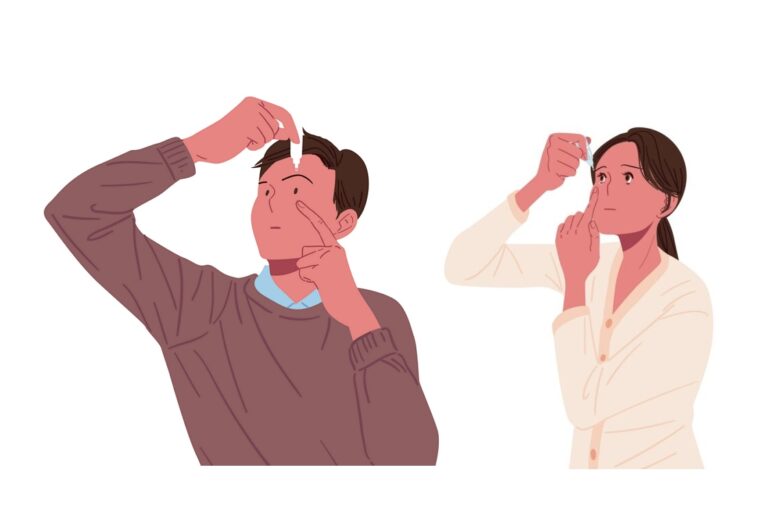




2 댓글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