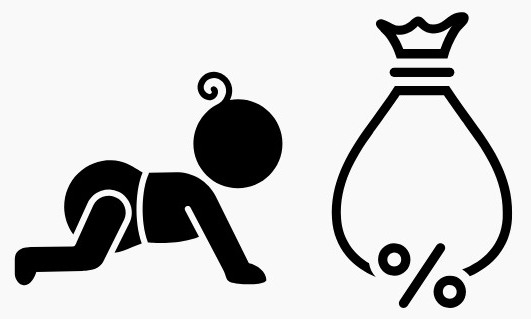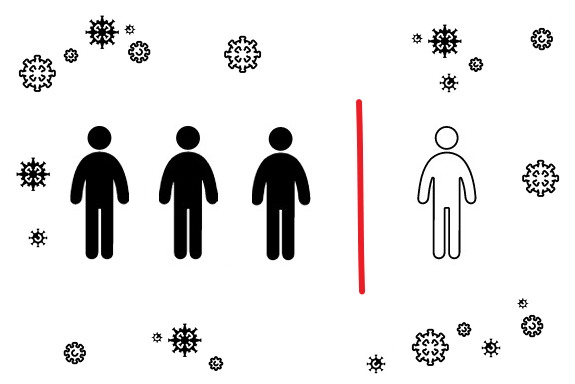어제 저녁 집안을 정리하다 안방 벽 한 귀퉁이에 있는 빨간색 낙서를 발견했다. 그렸다기보다는 직직 그었다는 표현이 더 알맞을 듯한 지렁이 기어가는 줄 몇 개. 아마도 방문을 열면 문에 바로 가려지는 부분이라 그 동안 눈에 잘 띄지 않았나보다. 키가 딱 둘째 높이인 것을 보고 범인이 대충 짐작이 갔다. 둘째를 불러다가 물었다.
“예린아, 이거 누가 그랬어?”
“응? 그거, 그거, 오빠가 그래쪄.”
눈 하나 깜짝 않고 시치미를 떼길래 다시 한 번 물어봤다.
“오빠는 아니라는데? 그리고 오빠는 낙서할 때 이렇게 선으로 찍찍 안 그어. 또 여기 낙서한 부분이 예린이 키랑 똑같잖아. 오빠가 한 거면 더 위에 있어야지.”
“……..”
“엄마 지금 화 안 났어. 엄마가 혼내려고 물어보는 거 아냐. 잘못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게 더 나쁜 거야. 알지?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아.”
그러자 딸이 쭈뼛쭈뼛하며 말했다.
“…….내가 그래쩌…..미아내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돼. 알겠지?”
그렇게 범인도 찾고 훈육도 하고 다짐도 받고, 비록 벽에 빨간줄은 생겼지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고 만족스럽게 돌아서려는 순간, 딸이 울기 직전에 짓는 특유의 표정—양쪽 입꼬리가 무슨 만화 캐릭터나 이모티콘처럼 아래로 쑥 내려간다—으로 어깨를 들썩들썩 하더니만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거야! 엄마 바보야! 엄마 나빠!!! 엄마한테 아스크림도 안 주고 사탕도 안 줄거야! 엄마는 먹지 마!”

아마 크게 혼은 나지 않았더라도 잘못을 들킨 민망함, 후회, 부끄러움, 왠지 모를 억울함 등이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이해가 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웬 적반하장인가 싶어 가만히 지켜보는데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울면서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를 연발한다.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놀지마. 엄마도 너랑 안 놀래!’하고 말해줄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 먹고 말했다.
“싫은데? 엄마는 예린이가 엄마랑 안 놀아도 예린이하고 계속 놀건데? 엄마는 예린이가 엄마 미워해도 계속 예린이 좋아해. 엄마는 예린이 사랑하니까.”
그러자 엉엉 울던 딸이 돌연 조용해졌다. 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가만 가만 살피는게 느껴졌다. 아마도 엄마가 진짜로 화가 안 났는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의아함과 불안함으로 흔들리던 눈빛이 조금씩 고요해지면서 아이의 얼굴에 안도감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러고보니 아주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것도 같다.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엄마 아빠가 밉다고, 싫다고, 안 놀거라고 울면서 화를 내는 순간들이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 순간에도 부모가 떠나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랑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확신을 안정적으로 얻을수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엄마 싫다는 아이에게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의 행동에 상관없이, 너의 마음이 어떻든간에 나는 늘 똑같다는, 그 자리에 있겠다는, 너를 늘 사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돌이켜보니 살아온 동안 나는 늘 한결같은 사랑, 변치않는 마음, 영원한 감정 같은 것을 갈망하면서도 나 자신이 타인을 향해 그랬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너무나도 변덕스러웠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 내 감정도 수시로 바꾸었다. 마음도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이나 감정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는 나 역시 똑같이 대했다. 관계의 호구가 될까봐 두려웠고, 감정에 있어서 손해를 볼까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러나 우습게도, 그렇게 변해가는 타인의 마음에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억울해 하면서도, 서운해 하면서도, 분노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변하는 것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무심했던 것이다.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고, 상대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슬프고, 억울한 일이었다. 엄마가 밉다고, 엄마랑 놀지 않을 거라고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사실을 깨우쳤다. 내가 오랜 시간 불안했다는 것, 두려웠다는 것, 영원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영원을 약속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든 아니든.
울음을 그친 아이는 다시 기분이 풀려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나의 추측일 뿐, 엄마의 말에 안심이 된 것인지, 용기를 얻은 것인지, 그냥 마음이 풀린 것인지, 단순히 까먹은 것인지 그 진짜 속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너가 날 미워해도 나는 널 사랑해” 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의외로 아주 괜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