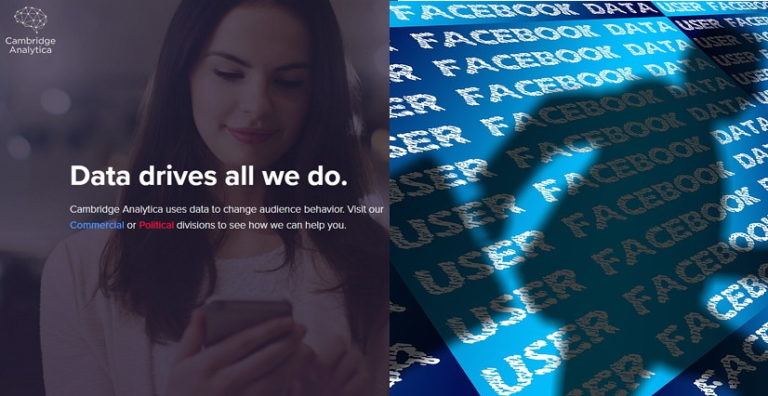지난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을 흐르는 생각의 키워드는 ‘언어’였다. 주변에 일어났던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언어’로 귀결되었다. 최근 들었던 한 선생님의 강의안 주제는 ‘인권의 언어’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강의를 개설해서라도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중대본, ‘깜깜이’ 대신 ‘경로불명’
지난주 언론인권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8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인 ‘깜깜이 (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경로불명 (환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사무처 내부에서 질병관리본부 발표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이를 다룬 매체가 손꼽을 정도로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적잖이 놀랐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여전히 많은 언론 매체에서 ‘깜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적잖이 놀랐다. 언어의 습관과 영향력에 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의식의 흐름 속에서 ‘언어의 줄다리기’(신지영 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의 문제의식이 담긴 프롤로그를 몇 번이고 무릎을 칠 정도로 반복해 읽었다. 글의 요지는 언어 표현의 줄다리기는 사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며 벌이는 심각한 이념의 줄다리기라는 것이다.
언어는 언어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관습의 총화’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한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렵고, 문제의식을 표현했을 때 거부감은 더 커진다.
기존의 이데올로기 입장에서는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 것도 아닌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관용어를 왜 혐오차별 용어로 보느냐.’는 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듯이, 기존 가치와 질서에 문제의식을 가지면 기존에 사용했던 표현들에 동의할 수 없다. 언어가 사회의 변화를 담지 못할 때 언어의 줄다리기가 시작하는 것이다.
언어 감수성, 더 깊게 고민하는 방법
지난 7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절름발이’ 표현을 쓴 이광재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을 때 보이던 대중의 반응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누굴 지칭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장애인 비하 발언이냐.’ ‘흔히 쓰는 비유도 못 하느냐, 괜한 트집 잡는다.’ 와 같은 반응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차별용어로 인식하는 문제의식과 충돌한다.
사실 ‘절름발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나 상황을 말하는 비유 표현이어도 자제해야 한다’고 장애인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수년 전부터 밝혀왔다. 또 사전에 나오는 관용구나 속담도 장애인 인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논란은 이광재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되었지만, 왠지 씁쓸함이 남는다.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성과 쇠퇴의 길을 걷는다. 언어가 그 사회의 가치와 관념들을 담고 있는 만큼,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관습처럼 사용했던 언어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고정화하게 된다.

스스로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하고, 표현에 민감해지고,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언어 감수성이 인권 감수성과 별개일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언어감수성은 세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인에게 더욱더 요구될 수밖에 없다.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단어를 선택하고, 글을 쓴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자의 관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
감수성의 근육,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쉽게도 기자의 언어 감수성이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는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비혼’ 대신 ‘미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차량’이라고 표기한다. 심지어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잘못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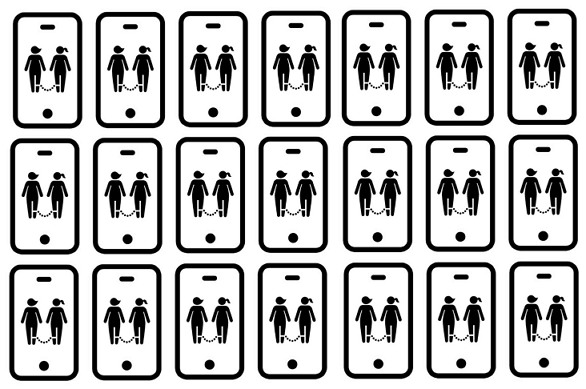
누구보다 민감한 언어 감수성을 가져야 할 전문가이지만, 사회의 높은 인권의식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 또는 양성하기 위해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에 집중한 반면, 인권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다. 평소에 얼마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교육이나 정보는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줄다리기’ 저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해왔던 표현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것이 곧 ‘언어 감수성’이라는 근육이 생긴 것이라 말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누구의 관점으로 쓸 것인지, 단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인이 언어 감수성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언어 사용을 지적 받기보다 언어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언론을 기대해본다.

[divide style=”2″]
[box type=”note”]
이 글의 필자는 김하정 언론인권센터 사무차장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 정보공개청구, 미디어 이용자 권익 옹호, 언론관계법 개정 활동과 언론인 인권교육, 청소년 및 일반인 미디어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