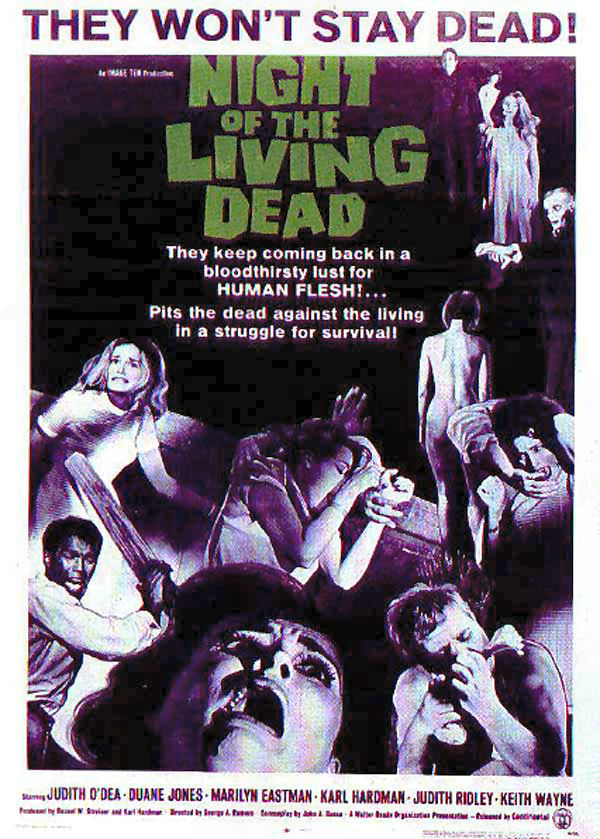(‘상편’에서 이어집니다) 모든 천재가 그러하듯 가우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이입’ 능력은 최고였다. 입주자를 상상하고 실험하면서 만든 능력이다. 건축주와 입주자, 건물을 볼 행인까지 고려한 유저빌리티(usability) 구축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가우디는 공무원들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구엘 공원, 자연 위에 얹다
가우디의 유저빌리티 구축 능력은 구엘 공원과 ‘카사 밀라(Casa Mila)’에서 절정으로 치닫게 된다. 구엘 공원은 구엘 궁전과는 달리 신흥재벌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지은 공원과 주택이다. 프랑스의 퐁텐느 공원과 영국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 등과 같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나도 잘 모르는) ‘공원 속 주택단지’를 짓고자 했다. 예를 들어 뉴욕의 센트럴 파크 앞 아파트는 시대를 막론하기 인기 있는 건물이었을 것이다. 가격도 항상 높을 것이다. 그런데 구엘 공원은 센트럴 파크와 주변 아파트를 같이 지은 것에 해당한다.

가우디는 어느 유명한 건축가의 말처럼 집을 위해 자연을 깎아지르기보다 자연에 ‘얹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구엘 공원의 택지는 경사가 심한 그냥 산이었다. 따라서 부지를 60개 구역으로 나눠 최대한 지형을 살리는 형태로 공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다. 60개의 구역은 각기 다른 형태의 스토리와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공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현장을 자주 지키는 건축가였던 가우디는 자신이 현장에 없어도 큰 문제가 없도록 오브제를 조각 내 제작해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공법’을 지금보다 1세기나 전에 시행했다. 건축 노동자의 유저빌리티를 고려한 것이다.
구엘 공원에는 그 외관의 예술성 내에 숨겨진 유저빌리티가 있다. 벤치 하나를 조각할 때도 가우디는 조수 중 관객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람을 앉혀 보고 가장 아름다우며 편한 모양을 고안해냈다. 산등성이에 있는 구엘 공원에서 물을 마시기 어렵다는 것에 착안해, 중력을 이용한 친환경 정수 시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뾰족하고 둥근 계단 손잡이가 방문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착시를 이용해 끝을 안쪽으로 말아놓을 정도로 계단, 옥상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의 시선 또한 철저하게 관람객에게 맞췄다. 감으로 혹은 실험으로.

물 흐르는 듯한 곡선으로 완성한 카사 밀라
가우디의 노년 시절 작품인 카사 밀라 역시 극상의 유저빌리티를 갖고 있다. 카사 밀라는 밀라의 단독 주택이 아닌 주상복합 건물이다. 아파트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가우디는 카사 밀라에 이르러서는 거의 꿈을 세우는 수준의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카사 밀라의 특징은 직선이 적다는 것이다. 직사각형의 건축 형태는 합리성을 상징는,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건축물의 형태지만 가우디는 카사 밀라를 물이 흐르는 듯한 곡선으로 지었다. 이 건물은 그저 아름다운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건물 중앙에 수직으로 큰 구멍을 두 개나 뚫었다. 이유는 환기와 채광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환기와 채광만을 위해서라면 건물을 두 동으로 지으면 그만이다. 가우디는 ‘채광’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닿는 빛의 흐름을 계산했다. 따라서 그림자가 지기 쉬운 아래층에도 해가 넉넉하게 들도록 빛을 뿌렸다.
이 빛의 흐름은 카사 밀라 이전의 건물이었던 ‘카사 바트요(Casa Batlo)’에도 적용했는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구멍을 뚫었던 카사 바트요에서는 아래쪽까지 빛이 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는 코발트블루, 그 아래는 하늘색으로 시작해 회색을 거쳐 백색으로 마무리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명도를 높여 빛이 잘 반사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던 가우디는 옥상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처럼 조각했다. 카사 밀라의 옥상 환기탑은 트렌카디스(trencadis), 다이아몬드 형태의 조각으로 마무리했는데, 이 두 방식의 공통점은 보는 면에 따라 빛이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은 보고 있다’는 말처럼 가우디는 집 내부의 가구 대부분 역시 직접 디자인하곤 했는데, 양 척추를 다르게 받쳐주는 듀오백 형태의 의자를 150년 전에 만들었다. 특히,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가우디는 노동자들의 행태를 유심히 관찰하곤 했는데, 저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짐바구니 등을 들고 다니는 것에 착안해 짐을 안고도 한 손으로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문을 열도록 손잡이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언뜻 쉬운 일같이 보이지만 가우디의 손잡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뾰족하고 복잡하게 생긴 것들이다. 이 와중에 유저빌리티를 추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가우디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미완의 신전, 성 가족(Sagrada Familia) 대성당 역시 대부분을 조립식으로 설계해 건축노동자를 편리하게 했는데, 가우디는 이 성당을 설계할 시기에 이미 바르셀로나 도심 전체의 시선까지 고려해 파사드들을 디자인했다. 각 파사드는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 ‘돌로 만든 성서’로 불린다.

가우디가 사랑한 사람들
성당 건축의 의미는 가정과는 다르다. 성당은 유럽인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며, 소개하고 싶은 마을 입구이자, 길거리의 사랑방이다. 만남의 중심이며 관계의 허브다. 독실함을 쏟아낼 수 있는 도구이며, 죄지은 자에겐 감옥인 동시에 탈출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건물을 귀신들린 듯한 건물을 깎아 만드는 가우디에게 맡기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주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가우디는 생전 빈곤층에게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건축가인 동시에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했다. 스페인 내란에도 가우디의 건축물들만큼은 안전했다. 가우디와 함께 작업했던, 가우디의 장인정신을 존경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보호해주었기 때문이다.

가우디가 유저빌리티를 발휘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급자였다. 카사 밀라가 도로를 침범해 시가 공사 중단을 명령하자 가우디는 무시했고 4년이나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 완성도에 감탄한 시에서는 결국 카사 밀라를 허가해주고 말았다. 가우디는 또한 구엘의 자녀들에게도 유저빌리티를 발휘하지 않았다. 구엘의 유산을 다 써버릴 정도로 돈을 퍼부으며 작업했기 때문이다.
트렌카디스의 경우 갓 구운 고가의 도자기를 깨뜨려 작업하고, 깨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고가의 도자를 굽는 식이었다. 결국, 구엘이 죽자마자 구엘의 자녀들은 구엘 공원 공사를 중단해버리기도 했다. 구엘은 이름을 남겼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잃고 오명만을 얻은 셈이다.
가우디는 화려한 업적과 달리 노년에는 성당의 지하실에서 작업만을 하며 지냈다. 그리곤, 성당 근처에서 전차에 치여 쓰러졌고, 그 남루함에 택시 승차를 세 번이나 거부당한 뒤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채 생을 마감한다. 뛰어난 신앙심과 예술적 감각으로 신화를 현실에 등장시킨 가우디는 이렇도록 평범하면서 비범하게 사라졌다.
자, 이제 가우디가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싶다. 귀신들린 예술가가 아니라 고객 중심의 디자이너로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