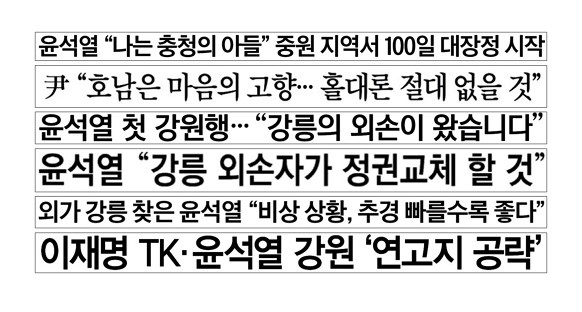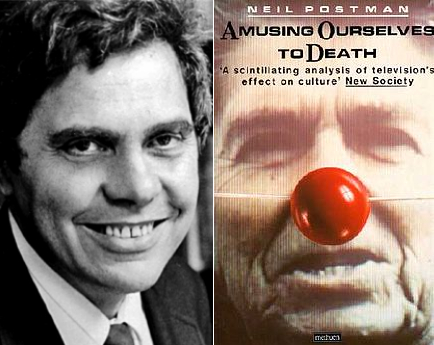[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6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사망자의 눈으로 본 메르스, 그리고 정부의 책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언론들은 메르스가 한 달 동안 잡히지 못한 한국사회의 주범들에 대해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 그중에서도 한겨레21 기사는 단연 돋보인다. 한겨레21은 세 번째 사망자의 의무기록 615장을 분석했다.
615장의 의무기록에는 그가 메르스에 걸려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더불어 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했고,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잘 드러나 있다. 보건당국은 기저 질환이 없으면 죽지 않는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언론은 ‘시민의식’ 운운하며 환자 탓을 했다. 한겨레21이 보도한 이 기록에는 보건당국과 언론의 주장에는 없는 억울한 사망자와 그 가족의 눈물이 담겨 있다.
메르스 대응 요령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타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7개국 언어로 번역한 기사도 눈에 띈다. 정부의 방역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메르스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통역을 지원해줄 연락처도 있다.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역학조사를 받고 자가격리까지 한 이문영 기자의 생생한 체험기도 메르스와 메르스 환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겨레21, “마른하늘에 날벼락, 정부가 원망스럽다”

[divide style=”2″]
2. 정부 무능에도 입 다물고 있는 그들, ‘보피아’
정부가 무능할 때 나서야 할 이들이 전문가다. 시사저널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전문가 집단, ‘보피아’(보건복지부+마피아)를 메르스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꼽았다. 정부가 병원, 의료 전문가, 4대 보건의료 공공기관장 등 의료계를 관료 출신들을 앉혀 장악했고 씨줄과 날줄로 엮인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보험공단·국립중앙의료원 등 4대 보건의료기관에는 친정부 인사가 내려와 있다. 복지부 관료들은 퇴직 후 대거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재취업하고, 이는 뒤봐주기, 관계기관과 업무 밀착, 자기 사람 챙기기로 이어진다. 이런 유착구조 속에서 전문가는 정부에 휘둘리고,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된다.
● 시사저널 – ‘보피아’ 위세 눌려 의료계 꼼짝 못 하다

[divide style=”2″]
3. 취약한 한국 의료시스템, 안전에는 돈이 든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응급실 과밀화에 비전문가 간병, 빅5로 몰리는 환자들 등등. 시사IN은 취약한 한국 의료시스템을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며 메르스가 의료 시스템의 약한 고리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말한다.
약한 고리란 ‘안전에는 돈이 든다’는 것이다. 평온할 때 푸대접받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위기 때 너무나 부족했다. 건강보험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감염 리스크가 큰 다인실을 장려했다. 건강보험이 간병을 수가로 보상하지 못하면서 병원은 인력 운영을 줄이고, 간병은 가족의 역할이 된다. 모두가 나름의 합리적 판단으로 움직였으나 결과는 지독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를 비롯한 수많은 안전사고로부터 간단한 교훈 하나를 배우지 못했다. 안전에는 돈이 든다는 것이다. 메르스를 통해 배워야 할, 되풀이된 교훈이다.
- 시사IN – 취약한 ‘한국 의료시스템’… 메르스 타격에 ‘비틀’

[divide style=”2″]
4. 컨트롤타워? 지휘권도 인사권도 없는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사태에 컨트롤타워는 누구였을까? 가장 많이 등장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도 총리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닌 ‘질병관리본부’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동아일보는 메르스 이후 과제로 질병관리본부 개혁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혜안을 제공하기보다 행정 관료의 뒷수습을 하기에 바빴다. 첫 환자 발생 후 수일간은 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장 주도로 방역작전을 시행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돌아온 이후에는 행정관료를 이해시키고 지원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했다는 것.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의 위치에서는 각 부처 역할을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자원을 투입하면서 병원 봉쇄, 강제 격리 등 선제 격리 조치에 나서야겠다는 판단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질병관리본부에 우수한 보건행정 인력이 모이지 않는 이유다. 연구인력의 역량도 부족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병원 내 감염을 관리하는 조직도 없다.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에서는 그나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동아일보 – 질병관리본부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