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화면 3분할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화면의 어디에 피사체를 옮겨둘까?
사진은 “빼기”라고들 하죠.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중요한 것, 그림의 주제를 염두해 두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렇지 않지요. 그녀가 매우 예뻐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내가 보기에 온통 세상은 그녀뿐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뭘 찍은 건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는 건 그냥 지나치고, 강조하고 싶은 것에는 눈길을 주도록 좀 노력하면서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아무래도 막 찍은 사진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요.
근데 피사체가 내 맘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건데, 내 맘대로 사진을 만져주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렸을 적, 성냥개비를 눈앞에 두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왼쪽 눈을 감았다가 하면 성냥개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장난에는 사실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어요.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사람은 눈 우세(ocular dominance)라고 해서, 사실 두 눈 중 더 즐겨 사용하는 눈이 있습니다. 맨날 오른손으로 똥 닦던 여러분은 오늘 왼손으로 닦아보도록 합니다. 상당히 어색하죠? 사진의 구도란 이렇게 식상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쪽만 보던 사람에게 왼쪽을 보여주는 사진이 더욱 흥미롭고 눈길을 끌게 된다는 진리이지요.
그럼 사진의 네모난 프레임에서 주제가 어디에 있을 때, 더욱 몰입이 잘 될까요? 첫째는 물론 가운데입니다. 주제가 나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올 것만 같을 때, 화면에 주제를 꽉 채울 수 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주제는 블랙홀처럼 우리를 끌어당기지요.

중앙구도는 어떤 면에서 국기와도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물은, 하얀 도화지에 걔 혼자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재미없고 반복될 경우 정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주제를 좀 가장자리로 몰고 빈 여백을 넉넉하게 확보한 뒤에 거기에 장식으로 파슬리 가루를 조금씩 뿌려주는 걸 더 좋다고 했죠. 어머나, 저기 별 사탕이 몇 개 있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이야깃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번에 가운데 떡하니 “내가 이 사진의 대장이다!”하고 주제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별사탕으로 천천히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분위기를 잡아준 다음에 시선을 끌고 가서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커다란 별을 따악- 하고 던져주는 걸 재밌어하죠.

왜 주제를 이동하는가?
따라서 이미 사진을 찍은 경우에도 편집단계에서 사진이 재미없어 보인다면 화면을 가로세로 3분할하여 화면에서 자리 하나 꿰차고 있는 녀석들을 중앙에서 약간 비켜나게 옮겨보면 훨씬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모서리에 몰아세우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화면을 3분할하여 그 선이 겹치는 지점으로 옮겨보라고 많은 전문가가 권하고 있지요.
![출처: Bert Krages, [Photography – The art of composition]](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4/02/photo-note-7.jpg)
같은 그림에 똑같은 밝기의 빛을 따로따로 두 개 그려서는 안 된다. 한 개의 빛은 주제로 부각하고, 나머지는 주제에 부속되어야 하며, 크기고 밝기도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부분이나 밝기가 똑같지 않아야 관찰자의 시선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천천히 이동할 수 있으며, 똑같은 사물이 있는 경우 어색하게 정지된 느낌을 주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다른 하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에 최고의 힘과 탄탄한 구성을 주고 싶다면, 전체 화면에서 한쪽은 밝게 한쪽은 어둡게 해야 한다. 그 후에 서로 다른 양 극단을 조화시키고 서로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다.
출처: 위키백과 – Rule of Thirds (출처의 내용을 번역함)
남은 허허벌판은 무엇으로 채우나?
두 번째로 주제를 밀어 놓았으면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의 창의성에 따라 다르겠죠. 자주 구경하게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해보자면, 먼저 심도가 낮게 촬영해서 주변을 뽀얗게 날려버리는 법. 정리하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경이 단순한 곳으로 이동해서 찍는 방법. 예를 들어 거리에 사람투성인데 아이를 세워두고 사람들을 배경으로 삼기보다는 건물 벽에라도 붙여 세워두고 찍는 게 좋겠지요.

위 사진은 규칙적인 벽돌벽 덕분에 그 앞을 지나가는 남자가 잘 보이게 되었죠.
세 번째는 단순한 배경을 찾기 힘들 때, 배경을 정리하기 힘들 때, 바닥이 단색이라면 하이앵글로 찍으면 좋고, 하늘이 푸르고 깨끗하다면 로우 앵글로 찍어서 배경을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하늘이나 바닥에 사람들이 날아다니거나 기어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위 사진의 경우 약간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여 화면 전체적으로 배경에 모래밭만 나오도록 단순화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하이앵글로 찍으면 회색 건물과 회색 옷이 섞여서 더 복잡한 사진이 되었을 텐데, 로우앵글로 촬영하면서 복잡한 도시에서도 단순한 흐린 하늘 배경지에 사람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여보세요. 찍고자 하는 주제가 언제 잘 부각되어 보이나요?
배경에 주제를 부각하는 조연을 두기
인물 사진 스냅의 경우 쉽지 않은데, 풍경 사진이나 어떤 반복적인 장면을 찍을 때 주연을 중앙에서 살짝 바깥으로 밀어두고, 나머지를 단순한 배경으로 채웠을 때, 그 배경에 주연보다 강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조연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OOO를 찍을 때 구도상 1) 가능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가수의 눈높이와 시선에서 찍을 것. 2) 재미없게 중앙에만 배치해 찍지 말고 여백을 살릴 것.
그런데 좀 더 할 수 있다면, 그 여백을 그냥 빈 공간으로 두기보다는 조연을 배치하면 좋다는 거죠. 영화 찍을 때 어떤 조연이 좋은 조연인가요? 1) 주연과 비슷한 성격이면서 주연을 잘 보조해주지만, 주연보다 튀지는 않는 역할 2) 주연과 아예 반대 성격이면서 제대로 악역이어서 주연을 부각하는 조연.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덜한 녀석이거나, 완전 반대를 상징하는 녀석을 찾아보는 거죠. 이것은 관습적으로 ‘아, 비슷한 점이 있다.’, ‘아, 반대인 구석이 있다.’처럼 느끼게 되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형태도 상관없고, 문화적인 아이콘도 상관없어요. 사실 사진이라는 게 이런 조연을 항상 염두해 두면서 찍을 수는 없기에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의외의 조연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그럴 때 조연과 주연 둘을 중심으로 크로핑(cropping; 자르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임스 낙트웨이가 찍은 위 사진의 경우, 에이즈에 걸린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가 주제인데, 주제를 화면 하단으로 밀고 여유가 생긴 배경에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는 마리아를 배치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작가의 이해를 돕는 훌륭한 조연이지요.

역시 낙트웨이의 사진입니다. 아이티 지진 현장에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여자의 기도에 마치 응답하는 것처럼 구호 헬리콥터가 하늘에 떴습니다. 배경의 사물이 주제와 연결되어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식상한 어구 덕분에 이 사진은 ‘요람에서 주크박스까지’를 연상시키며, 과연 ‘미국인들’을 상징하는 주크박스의 견고함은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 관보다 더욱 슬픈 것은 아닌지 상기하게 합니다. 주제를 한쪽으로 밀고, 그와 의미상 대칭되는 것을 배치하여 프레이밍(framing; 틀 짜기)하고 관찰자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천재적 구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전과제: 가장 까만 것과 가장 하얀 것을 함께 찍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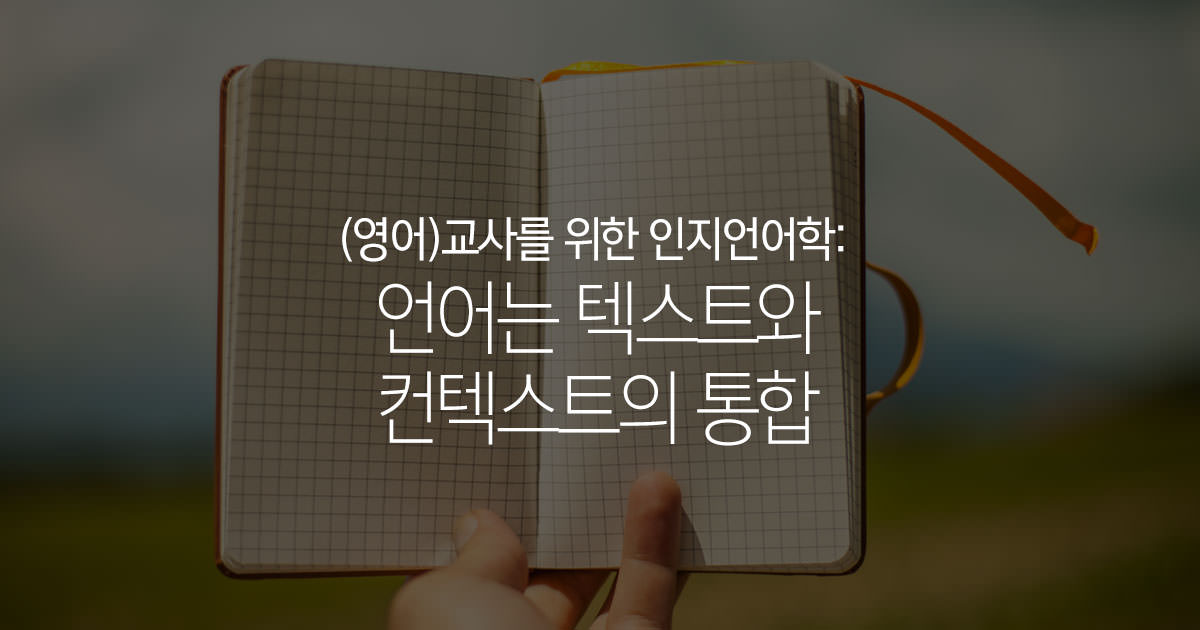

땡큐 슬로우뉴스^^ 서울비 님도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