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info”]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별별 현상들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전후 맥락을 따진 뒤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살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좁은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고 사고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제가 보고 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성급하게 일반화시킨 것들에 대해 써 보려고 합니다. 본격 ‘바닥이 드러나는’ 글쓰기입니다. (설렌)[/box]

지난 2004년 패션 전문 케이블 채널인 온스타일이 개국한다고 할 때 들었던 생각.
‘과연 패션이라는 항목 하나만으로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기나 할까?’
패션의 시대가 도래했다
물론 이는 미래 전망력이란 눈꼽만큼도 없는 나의 한계만을 드러내는 에피소드로 사실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기도 뭣 한 기억이다. 그럼에도 꺼낸 이유는 8년이 지난 오늘날, 8년 만에 온스타일을 비롯한 다양한 패션채널이 생겼다. 그뿐만 아니다.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스타들의 공항 스타일, 사복 스타일, 레드카펫 스타일 등을 일일이 리포팅해준다. 인기 드라마 여주인공이 맨 가방은 다음 날 품절된다.
완연한 패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서울의 여성들은 어느 나라 대도시 여성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패셔너블한 코스모폴리탄으로 도약했다.
패션붐 뒤에 있는 사회의 풍경
이런 대대적인 패션 붐 뒤에는 어떤 사회학적 배경이 있을까. 여성들이 쇼핑과 패션을 좋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의 분위기는 좀 특이한 구석이 있다. 이런 소비문화의 부흥은 보통 국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인데 지난 몇 년간 유독 경기가 좋았다고 할 만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들의 취업률과 연봉 수준은 감소하거나 답보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프로젝트(일)과 미래로의 연결성을 통해 세상 속에서 자아를 확립하고 인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자아는 강해질 수 없다.
현실과 미래의 불안을 견디기 위한 옷입기?

그렇다면 한국의 여성들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약해진 자아를 유행하는 옷입기라는 형태로 해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패션을 단순한 놀이 내지는 개인의 개성표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루이뷔통 백이나 프라다 백에 목을 메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또래 내에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 노스페이스의 윈드브레이커를 입는 것처럼 여성들도 유행하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가방을 듦으로써 사회적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겠다는 전의(戰意)를 공표하는 것이다.
스트리트 패션 블로그 사토리얼리스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패션 사진가 스콧 슈만은 자신의 책 발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서울 여성들의 옷차림은 매우 패셔너블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한편,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에도 여성들이 치장에 쏟는 노력을 결코 줄이지 않는 건 삶을 증명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표출된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도 배급된 물을 다 마시지 않고 세수하는 데 쓴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한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아우슈비츠는 아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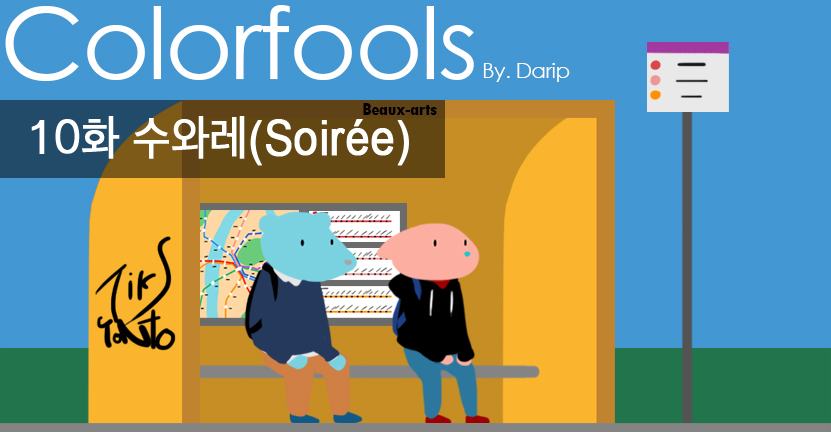




이번 기사는 짧아서 아쉽군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해요. 더 열심히 쓸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안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봉다방 인터뷰 기사는 정말 좋았습니다. 기사 자체에 감동했어요. 인터뷰 기사는 이래야 하는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근데 유행을 선도하기는 커녕 그냥 따라가려고만 해도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사람에게 멋지게 보인다는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