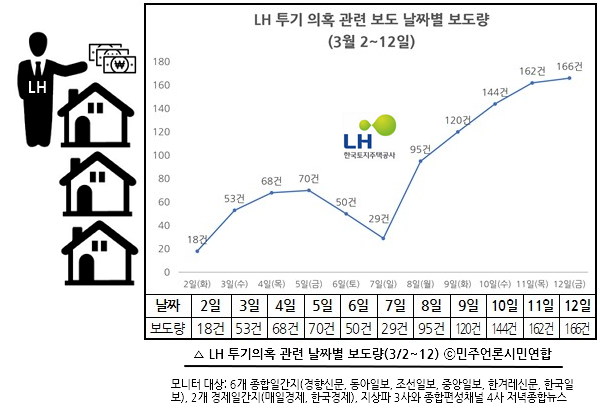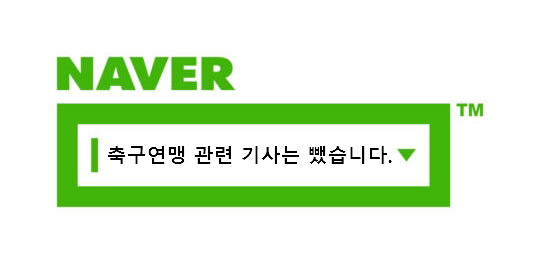- 40대 가장 무차별 폭행한 만취女, 뒤늦게 사과 문자…“자괴감 느껴” (조선일보, 2021.9.25.)
- “지하철서 침뱉고 아버지뻘 남성 폭행한 20대 여성… 피해자 측 “꼭 처벌해달라”(머니S, 2022.3.19)
사회적 의미에 대해 언론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일탈적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의 주목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다수 언론이 주목한 폭행 사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이 가해자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나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뉴스로서 주목 가치가 높아서 보도한다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
“지하철서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송치… 질문엔 ‘묵묵부답’”(한국일보, 2022. 3. 30.) 처럼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의 제목을 보면, 앞서 말한 보도가 언론이 피해야 할 불필요한 성별 부각 보도 정도로 느껴진다. 그런데 위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술에 취한 채 손자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남성 가해자를 다룬 사건이(사건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은 차치하고), “가족들 앞에서 할아버지 폭행·행패 부린 40대 징역형”(노컷뉴스, 2022.5.27)의 제목으로 출고된 것을 보고나면 다수 언론의 ‘관심’이 여성이 가해자라는 것 이상에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당연하다. 다만 여성들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 역할(단적으로 남성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여성의 폭력은 그렇지 않다)에 순응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여성 범법자는 범죄 행위 이외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위 규범과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더 싸늘한 시선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성 범죄자들은 악마화하거나 남성화하거나 가정의 책임을 방기한 인물, 성적인 것을 포함한 일탈적 대상으로 그려진다. 한마디로 “못됐거나” “미친” 여성으로 묘사된다(Brennan & Vandenberg, 2009).
여성 범죄자에 대한 이런 이중 잣대는 언론이 주목한 폭행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피해자 남성의 사회적 지위 손상을 부각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방기에 대한 지적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뉴스 제목은 단순히 성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남성의 전형적인 성별 역할을 부각시킨다.
피해자는 그냥 40대 남성이 아니라 한 가족을 이끄는 ‘40대 가장’이고, 60대 남성은 가해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뻘 남성’이 된다. 40대 가장에 대한 폭력은 가족에 대한 폭력이 되어버리고, 아버지뻘에 대한 폭력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자 딸의 도리를 저버린 부도덕한 폭력이 된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이 지닐 수 있는 권위의 정점인 가장과 아버지를 언급해 남성의 권위를 소환함으로써, 폭력의 비도덕성과 남성 중심의 위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성차별을 ‘갈등’ 소재로 활용하거나 성별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분노에 불을 지펴왔다. 성별의 부각, 남성 지위의 손상을 강조하는 방식의 보도는 (남성) 개인에게 단순 범죄 보도에 대해 느끼는 것 이상의 사회적으로 유해한 분노만을 자아내게 할 뿐이다. 분노의 인지적 구성 요소의 핵심에 위해와 지위의 손상이 있다는 정치 철학자 누스바움의 말을 떠올릴 때 더 그렇다.
[divide style=”2″]
[box type=”note”]
이 글은 언론인권센터가 기획한 ‘언론인권칼럼’으로 필자는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