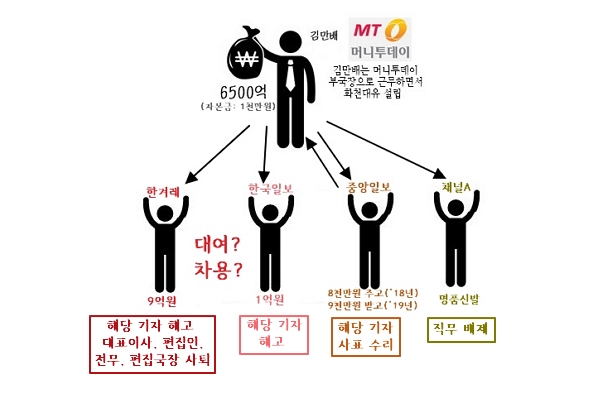2017년 9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자살 위기자, 주거형태 보면 알 수 있다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막을 수 있을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죽음이 자살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경향신문과 비영리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인구와 지리정보, 과거 자살자 통계 등을 이용해 자살 위기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파악했다.
변수는 주거 환경이었다. 지역과 관계없이 20평 이하, 월세로 사는 이들 중에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자살 위기자가 가장 많았다. 자살의 원인을 파악할 때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밀집해있고 1인 가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할 때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조금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통한 정책 집행이 만나면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경향신문

[divide style=”2″]
2. 대학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
자살의 변수가 될 정도로 주거환경은 한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다. 머니투데이가 집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 나오는, 집이 짐이 되는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에 대해 짚었다. 대학생들은 닭장 같은 방에서 숨만 쉬는데 3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학생 10명 중 2명만 기숙사 거주가 가능할 정도로 주거가 온전히 민간의 시장 영역에 떠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졸업 후, 취업 후, 심지어 결혼 후에도 대학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대학생들이 오히려 대학 가에서 밀려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러한 주거 대란은 사회의 재생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국토연구원이 1인 청년 가구(총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거비 부담이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출산·양육(86.7점) △결혼(83.1점) △연애(65.4점) 등이 제시됐다.
청년들이 살 집이 없다는 것은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둔 자식의 집 마련을 위해 중장년층이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주거를 해결해야 사회 전체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이유다.
● 머니투데이

[divide style=”2″]
3. 예견된 눈물, 사학법이 낳은 괴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이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사학 적폐’다. 사립학교 총장과 총장 일가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잘 알려졌지만, 사실 이런 비리는 ‘사학법이 낳은 괴물’에 가깝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사학 적폐 청산이 사학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한다.
전국에 있는 404개의 대학교 중 사립학교는 354개. 이들 사립 대학 가운데 분규사태를 겪은 학교만 약 86개에 달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키웠다. 논란이 된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둘째 아들을 이사로 복귀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이런 사학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치인들이 촛불집회까지 해가며 막았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사학 적폐는 국가 권력과 결탁해 키워졌다. 1986년 상지대는 총장 비리를 고발하려는 학생들을 상대로 ‘용공 조작’ 사건을 일으켰고, 이는 당시 안기부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사학의 엽기적인 비리 행각보다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비리를 조장하고 방조한 국가 권력과 제도다. 국가가 사학에 교육의 책임을 외주화한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짊어졌다.
● JTBC 스포트라이트

[divide style=”2″]
4. 국가가 함께 만든 ‘교육사업 하면 돈 번다’ 는 말
사립유치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에 밀려 휴업을 사실상 포기하긴 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만 추구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학에 이어 사립유치원들도 또 다른 괴물이 돼버린 걸까? 시사IN은 사립유치원들이 성장하게 된 과정에서 이들의 반발을 읽어냈다. 역시, 문제는 정책과 제도였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사립 유치원 수가 급증했다.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마구잡이로 허가해준 결과다. 시설 규정은 대폭 완화되고 유치원비 제한도 없어졌다. 사학과 달리, 법인 전환도 없이 개인들이 사립 유치원을 설립했고 초중고 감사에도 허덕이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무상보육을 한답시고 2012년부터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늘렸다. 돈만 주고 감시는 하지 않은 셈이다. 사립유치원들에는 호시절이었다. 유치원 원장들은 일가족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고,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아들의 오피스텔 구입 계약금을 내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교육 사업을 하면 돈 번다’는 사고는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닌 국가가 조장한 데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호시절은 끝났고, 국공립 유치원 늘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잘 나가던 대선 주자 안철수도 ‘병설’ 유치원이니 ‘단설’ 유치원이니 말 잘 못했다가 한 번에 훅 가지 않았나.
●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