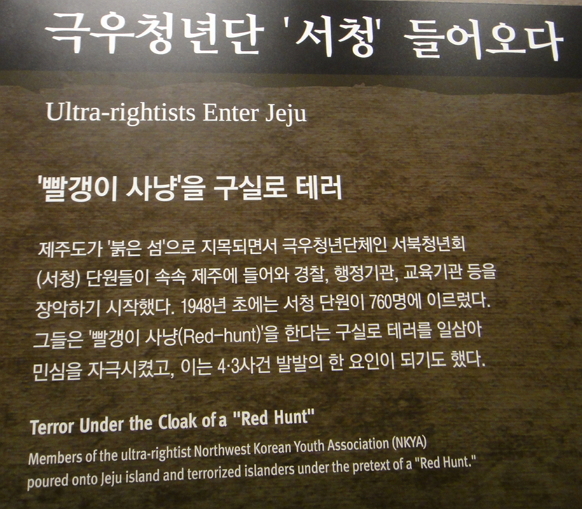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는 아이가 있다. 새해 분위기에 들떠 장난치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 벌로 1월 용돈이 8만 원으로 깎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까지 왕창 깨 먹었다. 2월 용돈은 1만 원이 더 줄었다. 자숙하는 거 같아서 3월 용돈은 조금 올려서 9만 원이 됐다.
이 아이는 3개월 동안 용돈이 얼마나 줄었을까.
장난만 안 쳤으면 이 아이는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30만 원을 용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만 원을 받았다. 1월에 2만 원, 2월에 3만 원, 3월에 1만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줄어든 용돈은 6만 원이다. 그런데 정답은 1만 원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다.
- 1월에 깎인 용돈은 2만 원이다.
- 2월에는 1월보다 1만 원이 줄었다.
- 3월에는 2월보다 2만 원이 늘었다.
- 결국, [-2-1+2=-1]이므로 용돈은 1만 원 줄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의 조세정책을 총괄한다는 기획재정부가 바로 이런 말도 안되는 계산법을 국민에게 천연덕스럽게 외치는 장본인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효과는 5년간 5.5조 원”이라고 했다.[footnote]참고로 기획재정부는 8월 4일 순액법과 누적법에 따라 세수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참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편집자) [/footnote]
기획재정부의 ‘이상한’ 계산법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계산법을 따라가 보자.
- 2018년에는 올해보다 9,223억 원이 늘어나고,
-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5조 1,662억 원이 늘어난다.
- 2020년에는 2019년보다 4,556억 원이 줄어든다.
- 그러니까 세수는 [+9,223+51,662-4,556]이므로 약 5.5조 원이 늘어난다(???)
6만 원과 1만 원은 용돈 액수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용돈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 차이에서 나온다. 1만 원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계산법을 ‘전년 대비 방식’이라고 부른다. ‘줄어든 용돈 6만 원’은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기재부가 사용한 계산방식이 바로 ‘전년 대비 방식’이다.
올해 증세 규모가 2조 원, 내년 3조 원, 내후년 1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 연도 방식으로는 3년간 세수 효과가 6조 원이지만, 전년 대비 방식으로는 1조 원에 불과하다. 기준 연도 방식은 제도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의 변화’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올해 2조 원, 내년 3조 원, 내후년 1조 원을 모두 더한다. 반면 전년 대비 방식은 전년도 대비 세수 변화만을 보기 때문에 올해는 2조 원, 내년은 올해보다 1조 원 늘었고, 내후년에는 내년보다 2조 원이 줄었다고 계산한다.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세수 효과를 기준 연도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5년간 세수 효과는 23조 4,525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고려하면 5년간 23조 6,00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선 “관행상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해왔다”고 해명했지만, 기재부 역시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기준 연도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한다. 2009년에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사이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방식 논쟁에서 기재부가 ‘판정패’한 뒤 벌어진 풍경이다.
2009년, 기재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 규모가 5년간 35조 원이라며 ‘감세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하는 학자 두 명이 기준 연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실제 세입감소 규모는 최소 9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가 60조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 당연히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무총리는 경제학자 출신인 정운찬이었다. 그는 국회 답변에서 기준 연도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논쟁은 끝났다. 그 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예산안, 세법개정안에 첨부하는 비용 추계를 모두 기준 연도 방식으로 바꿨다. 사실 전년 대비 방식 자체가 ‘듣보잡’이었다. 미국 합동조세위원회(JCT)와 의회예산처(CBO)만 해도 오래 전부터 기준 연도 방식을 사용해 왔다.
2009년 당시 이영환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와 함께 기준 연도 방식 논쟁을 제기했던 신영임 박사는 지금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예산안 편성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감 규모를 제시하는 게 편리하고 유용할 수도 있지만,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전년 대비 방식으로만 제시하면 세수 변화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보여주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올해 2조 원, 내년에 3조 원, 내후년에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재부 역시 총 소요 예산을 당연히 6조 원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가지 거짓말
논점을 정리해보자.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건 ‘증세 규모가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크다’가 아니다. ‘정부가 세수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한 것 아니냐’는 것도 부차적인 문제다. 제기하고 싶은 논점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정부가 먼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마당에 기재부가 여태 코 묻은 용돈 계산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하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사실, 통계는 거짓말을 곧잘 한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이란 분이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00만 해고 대란이 온다”고 했던 말이었다. 4대강 사업 같은 엉터리 사업 뒤에는 언제나 ‘맞춤형 통계’ 혹은 ‘데이터 성형수술’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산술 평균으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가려버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 효과는 20조 4,973억 원, 고용 증대 효과 23만 명”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질문을 막아버렸다.

통계는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00만 해고 대란이 온다”며 관련 법 개정을 압박하던 모습을 떠올려보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서민들의 팍팍한 일상에 덜 주목하게 한다.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되는 생산 유발 효과니 고용 증대 효과는 또 어떤가.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총 조세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담뱃세 인상을 지지했고, 연말 정산을 세액 공제로 바꾸는 개혁을 지지했다. 이제는 정부가 선별 증세라는 익숙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보편증세라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철학과 용기를 가지고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제대로 된 토론을 위한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하다못해 기재부가 전년 대비 방식과 기준 연도 방식을 같이 보여주며 ‘이런 기준으론 이렇고 저런 기준으론 이렇다’고 설명만 해주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