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이어 부산의 일본공사관 앞에도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 ‘소녀상’이 일제 식민지시대 말기 이른바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한 조형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어딘가에도 세워져 있고, 일본 우익정부가 워낙 이 상징조형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또 그럴수록 ‘보호’되어야 하는 명분을 더 강하게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조형물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기억투쟁이 벌어지는 뜨거운 ‘현재적 장소’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기억파’의 일원임이 틀림없지만, 이 ‘소녀상’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일부 일본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 역시도 그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불편함은 올바른 것일까? 민감한 문제이지만 피해 갈 문제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미성년 여성을 이 추악한 성폭력 제도의 희생양으로 동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로 ‘소녀 위안부’들이다. 성인 여성이라 해도, 설사 자발적이었다 해도, 또 극단적으로 말해 일종의 매춘이었다 할지라도, 여성이 남성군인의 성욕 해소를 위해 제도적으로 동원되는 일은 끔찍하고 야만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 인격적으로는 물론 성적으로도 자기 결정권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노예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보편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소녀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수행된 이 성적 착취제도의 야만성과 추악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소녀상’은 굳이 일제에만 한정되지 않는, 모든 추악한 전쟁 범죄의 비인간성을 상기시키는 조형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녀상’이 어쩔 수 없이 환기하는 ‘능욕당한 순결한 소녀’라는 이미지는 전쟁 범죄자의 죄상을 묻는 일에 적합한 상징성만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이미지는 흔히 식민지 침탈을 당하거나 패전을 당하거나 하는 특정 민족(국가)의 불행한 상태를 환유하여 ‘민족주의’라는 비이성적 환상을 조작해 내는 데에도 적합한 상징성을 갖는다. 패배하거나 침략당하는 민족을 유린당하는 여성으로 치환하여 반격의 내적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차원적 민족주의의 흔한 감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민족주의는 오로지 적개심과 공격성만을 유발하여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류의 원시적 민족주의적 각축에 사람들을 눈멀게 하기 십상이다. 더 나아가면 여성에 대한 고착된 관념 –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순결해야 하고, 다른 ‘놈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비자율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는 남근주의적 관념을 재생산하는 또 다른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나도 공감하는바, 이 ‘소녀상’이 주는 불편한 느낌의 근거일 것이다.
꼭 ‘소녀상’이어야 했을까? 같은 여성 이미지라도 이를테면 2차 세계대전의 불행과 참상을 피에타적 모성의 이미지로 형상화해 낸 케테 콜비츠의 작품들과 같은 조형성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
![케테 콜비츠, [애바타]](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7/01/i_006-1.jpg)
![케테 콜비츠, [전쟁은 이제 그만]](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7/01/i_005-1.jpg)
이 ‘소녀상’ 역시 뜻있는 예술가의 ‘재능기부’에 의한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소녀상’ 이미지에 내재한 위와 같은 불편함을 끄집어내 지적하는 것은 물정 모르는 소리에 가까울 것이다. 그 소녀상을 철거와 훼손의 위험에서부터 지키겠노라고 비닐 천막을 치고 번갈아 밤을 새워 지키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불편하지 않다고, 혹은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는 어쩌면 이 ‘소녀상’의 이처럼 불편한 즉물성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총체성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것은 그 자체로서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어온 바로 그 불안함과 불완전함과 불편함을 대신 웅변하는 형상으로서, 또한 모든 기억투쟁이 가지는 명확한 적대성과 그 못지않은 모호성과 다의성들이 소용돌이치는 ‘현장’으로서 격렬한 존재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세상에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로 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의외로 많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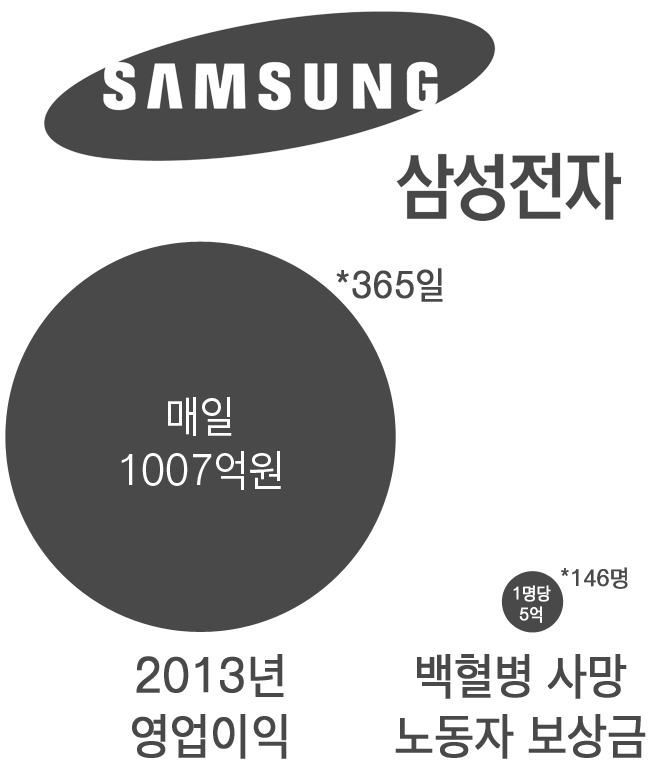




첫 댓글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