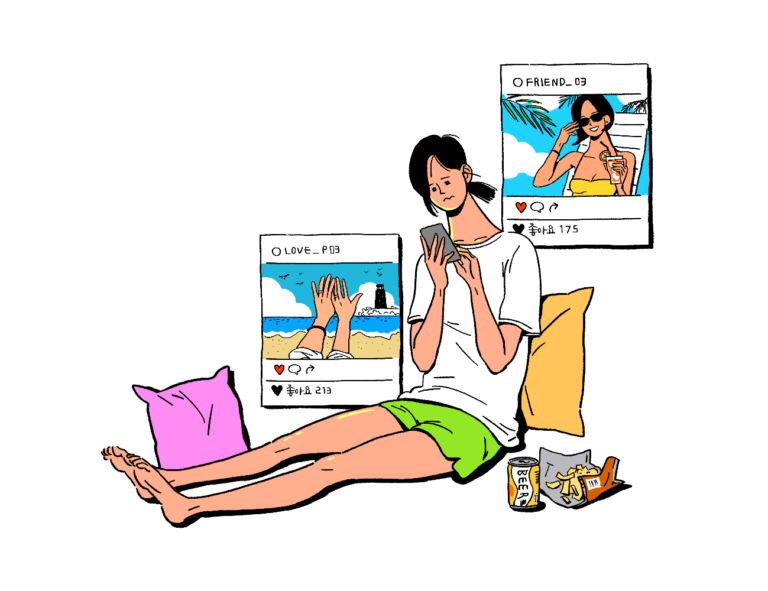자취 7년 차. 그동안 1년에 두 번, 2년에 한 번씩 총 여섯 번 이사했다. 작은 춘천, 대학가 주변에서만 자취했기 때문에 동네를 걸을 때면 내가 살았던 방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간혹 그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면 걱정이 든다.
“아, 저 집은 정말 벌레가 많을 텐데.”
“저 집은 너무 추울 텐데.”
“저기는 여름에 힘들 텐데.”
한때는 내가 씻고, 먹고, 자면서 생활했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누군가와 시차를 두고 공유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몇 년마다 이사하며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보는 역할극처럼 느껴진다. 또, 지금 내 몸은 잠시 편한 곳에 있지만 언제든 떠나야 하는 세입자이기에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생긴다.
처음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왔을 때는 보증금 분납이 가능한 천장 달린 공간이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혼자 사는 것, 나만의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편함쯤은 극복 가능하다고 여겼다. 해가 갈수록 이사하고 살림을 꾸리는 일이 낭만이 아닌 구체적 노동과 생활이라는 걸 느끼면서, 방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달라졌다.

첫 자취방
첫 자취방은 학교 후문 산비탈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세 사람이 둘러앉으면 팔만 겨우 뻗을 수 있을 정도로 방이 비좁았다. 공과금이 포함돼서 겨울에 뜨겁게 바닥을 데울 수 있고, 창문으로 춘천 시내가 다 들어와서 밤마다 야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내 낭만적 일상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벌레였다.
날아다니며 날개를 퍼덕이는 중지 크기의 바퀴벌레와 돈벌레, 온갖 해충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침대 밑, 배게 아래, 화장실, 천장 어디서든 등장해서 나는 집에서 밥 한 끼 마음 편하게 먹지 못했다. 가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분위기라도 잡을라치면, 이내 천장에서 파닥파닥 소리와 함께 바퀴벌레가 날아들고 손바닥만 한 거미가 창문 틈으로 뚜벅뚜벅 기어 들어왔다.

두 번째 방
참고 견디다가 2년을 채우고 이사한 두 번째 방. 그 방을 선택한 기준은 ‘무조건 벌레가 없는 곳’이었다. 다행히 벌레는 나오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하늘을 볼 수 없었다. 창문 쪽에 옆 건물이 바로 붙어있어서 붉은 벽돌만 다닥다닥 보였는데, 온종일 방이 어두컴컴하고 음습해서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놓아야 했다.
통풍과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 같은 한여름에는 밖보다 훨씬 덥고 습해서 반나절 만에 서른 번 샤워를 한 적도 있다. 뜨겁고 눅눅한 공기에 숨 쉬는 것도 힘겹게 느껴져서 동생하고 ‘살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모아서 근처 모텔로 피신을 떠난 적도 있다. 일주일 동안 에어컨이 빵빵한 모텔에서 쉬면서, 다음에는 꼭 햇살이 들어오고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 방
세 번째 자취방은 에어컨이 있었고, 창문이 커서 통풍도 잘 되고, 빛도 잘 들어왔고, 꽤 넓었고, 벌레도 안 나왔지만, 곰팡이가 있었다.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금세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와 모락모락 곰팡이가 피었다. 여름엔 에어컨이 있어서 견딜 만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피는 곰팡이 때문에 쾌쾌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
다음 자취방도 곰팡이가 말썽이었고, 그 전 방보다 더 추워서 방 안에서도 패딩과 털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안 됐다.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만 뜨겁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게다가 원래 주택이었던 공간을 얇은 벽으로 다닥다닥 분리해놓은 형태여서,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옆집 사람의 핸드폰 진동 소리,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렸다. 기묘한 동거. 그들에게도 내 소리가 들릴까 봐 항상 음악을 일정 정도 틀어놓고 숨죽이며 생활을 해야 했다.

일곱 번째 방
작년에 이사한 일곱 번째 방. 지금 사는 방은 여태까지 자취를 하면서 살았던 방 중에서 가장 좋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고, 곰팡이 걱정 없이 겨울에도 창문을 닫아놓을 수 있고, 보일러가 낙후되지 않아서 도시가스비가 덜 나오고, 방과 방 사이가 잘 분리되어서 서로의 사생활이 보장된다. 게다가 벌레도 없다.
글을 쓰다 보니 해가 뜬다. 여섯 번의 이사를 통해 배운 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창문을 통해서 날씨와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때 그 옆 낮은 건물의 창문이 걱정되고, ‘역시 더위 철 피서는 집이 최고’라는 말이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누리는 편안함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불편한 자리를 양보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내 생활로 배운 감각들, 차별들, 어떤 가난들을 계속 기억하고 싶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면 서른 번 내 몸을 씻게 만들었던 그 방이 떠오른다. 그 방은 여전히 빨래가 눅눅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