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 일상,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의 시공간 속을 흘러갑니다. 그 순간들을 붙잡아 짧게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언어’로 함께 쓰는 특별한 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편집자) [/box]
파업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소식을 접했다. 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에 선정된 인천공항을 만들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참 아팠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고된 일들을 하셔야만 했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 인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네요.”
“왜? 뭔 일 있니?”
“대우가 형편없어서 그렇죠. 정규직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경영을 하다 보면, 아니 ‘경영에 들어가면’ 그런 식이 되곤 하는 거 같더라.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지.”
“그렇겠죠. 그런데 단순히 봉급 적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높은 사람들 오면 화장실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인터뷰 보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주는 게 큰 거 같아요.”
“그래? 그건 정말 아니네. 왜 그런 식으로 한대?”
“그쵸?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경영이라는 게, 힘들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 가둬두고… 그건 아니지.”
어머니는 때로 ‘사업가의 편’을 드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곤 하시는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거짓의 도구가 되곤 한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어머니와 나의 티격태격은 이른바 ’노사대립’과 닮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한다. 사업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언젠가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 먹고사는 것만도 감사하지. 물론 성우가 열심히 해서 정규직 되면 좋겠지만, 지금 좀 고생하는 거 잊지 말아라. 잊으면 고생한 게 의미가 없잖아.”

[divide style=”2″]
어느 군인의 선고 공판
식사하면서 아래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열린 TED 강의를 통해 한 이라크전 참전 군인의 가슴 아픈 증언을 들었어요. 격전지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자기감정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된 병사. 가장 가까웠던 전우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귀국한 그는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려 상대방을 폭행하고 살인미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복역 중이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지만 가장 아픈 부분은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복무는 양날의 검이었어요. 당신이 이라크에서 보낸 시간이 이 사회에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 그러니까 긍휼함을 얻어야 해.”
“긍휼……”
“살인자와 평범한 사람은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은 그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인데.”
“그 길이라는 게 자기가 다 택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해야 하는 거라고.”
“아아… 정말 그래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내가 사람을 죽도록 팬 그 미군 병사와 다른 점이 뭘까. 그를 판단하고 싶지 않다. 아니, 당당히 TED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그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신에게 더 많은 긍휼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우리에게 모두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것.

[divide style=”2″]
작은 상처
“어머니 저 입술에 뭐가 났네요. 자꾸 신경 쓰이네요.”
“어, 그러네?”
“커 보여요?”
“아니, 하나도 안 커 보여, 자세히 봐야 겨우 보인다.”
“아, 다행이다. 근데 이런 거 나면 정말 신경 쓰여요.”
“자기는 엄청 크게 느끼는데 남들은 신경도 안 쓰지.”
“그렇죠. 살짝 아프기까지 한데.”
“사람이 자기 아픈 게 젤 크지. 자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간 거랑 남이 암 걸려서 아픈 거랑 똑같다 느낄 때가 있다니까.”
나는 내 신경을 타고 오는 아픔을 직접 느낀다. 타인의 아픔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타인의 고통에 관한 참여는 여전히 멀고, 내 일은 크든 작든 언제나 긴박하다. 이 밤 깊은 고통 속에서도 아프다고 아우성치지 않으며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 파업, 2013년 11월 16일
* 어느 군인의 선거 공판, 2013년 11월 13일
* 작은 상처, 2013년 11월 24일


![[슬로우포럼] 알고리즘 사회와 노동의 미래 (패널 토론)](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5/07/slowforum-robot-algorith-panel-discussion.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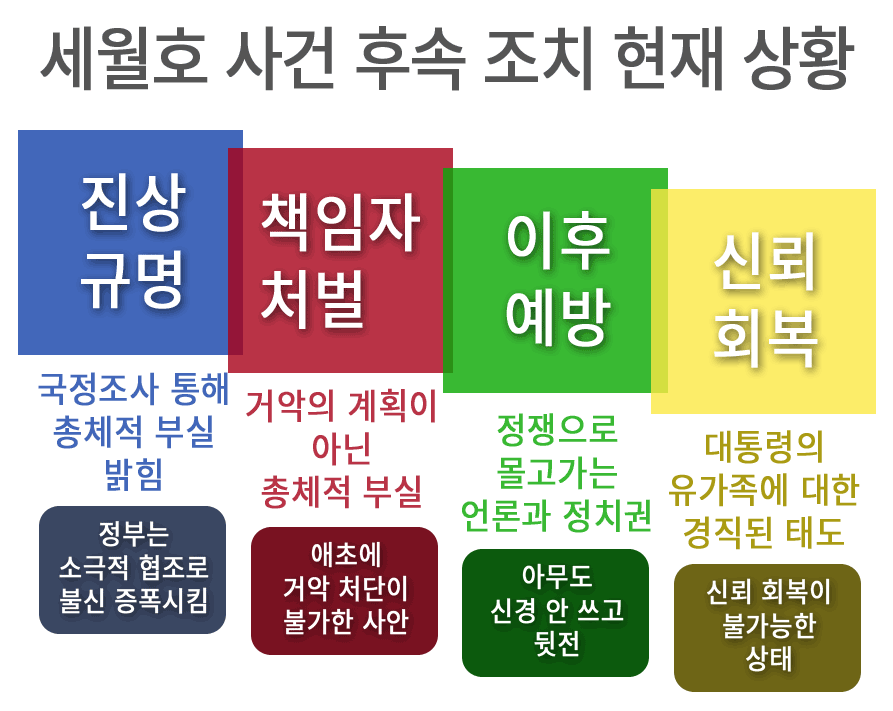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필자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니 정말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 없네요. 이런 깊이 있는 분께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꺼라는 생각에 우리의 미래가 그닥 어둡지 않을꺼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또 따스한 마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