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보면 내다 버리고 싶은 것은?’
좀 지난 영화 광고 문구다. 이 문제의 답이 영화 제목이었다. 기타노 다케시가 한 말이라던가. 어쩜 이런 생각을 다했을까, 감탄스러웠다. 영화를 보진 않았다. 스토리 라인이나 배우, 그 어느 쪽도 끌리지 않았다. 포스터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칙칙한 분위기라니.
그 영화, [가족]이다.
실제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해 불경스러운 발언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무도 안 보면 내다 버리고 싶은 속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의 사랑만을 애써 말한다.
거짓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무의식적 강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세뇌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가족은 제 삶의 버팀목이죠. 언젠가 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전적으로 틀린다고도 맞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뭔가 도덕적 의무를 한 것 같은 느낌은 있었다.
[divide style=”2″]
![[바람난 가족] (임상수, 2003)](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9/05/movie_image.jpg)
이런저런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가족들은 너무도 유쾌하게 가족을 해체한다. 눈물을 흘려가며 가족에서 일탈한 주인공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바람직한 영화가 아니라 나는 좀 통쾌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가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어떤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감싸야 한다는, 가족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조롱한 영화였다. 그래서 좋았다.
[divide style=”2″]
[가족의 탄생]. 바람이 나서 떠난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이렇게 될까? 이 영화를 보면, 혈연이 반드시 가족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만이 가족의 전형적 형태도 아니다. 당길 핏줄이 없어도 그들은 스스럼없이 한 데 어울려 가족이 되고, 아빠가 없고, 대신 엄마가 둘이어도(그것도 생모가 아닌), 부모가 없이 누나만 있어도 그들은 불행하지 않다.
가족은 일차집단이기도 하지만 이차적으로 탄생하기도 한다는 시사는 가족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드에게 조금 충격적일지도 모른다.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함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굳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과 애정과 관심, 이런 게 가족을 만드는 기본요소들이라면 그들은 가족이다.
![[가족의 탄생] (김태용, 2006)](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9/05/ties.jpg)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건 불편하다. 어떤 면에서 자신한테조차 솔직하기 어렵다. 버리고 싶을 만큼 짐이지만, 정작 버리고 났을 때 흔들리고 마는 마음의 혼란과 원초적 죄의식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하여, 나는 가족의 존재가 서로에게 조금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무들이 서로 가지가 다치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자라듯이 가족들도 그만큼의 거리에서 각자,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다.

![[송곳]으로 미생 현상 복습하기](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4/11/i-01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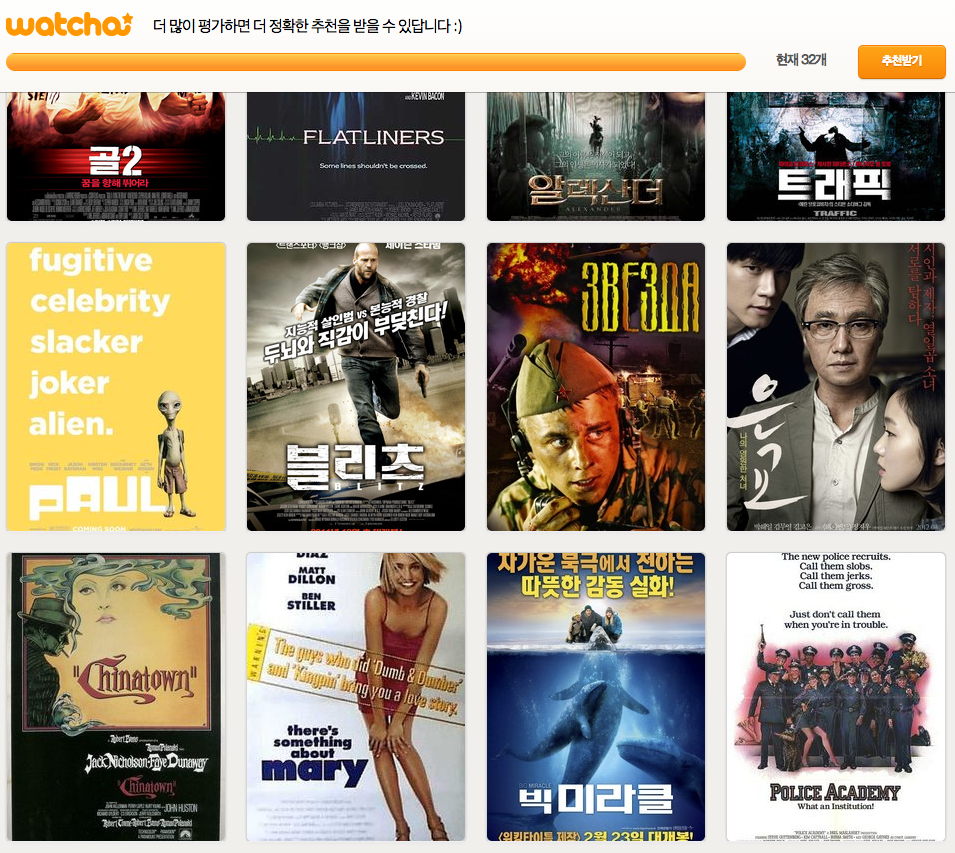
![국가라는 아버지를 가져보지 못한 세대: [국제시장] 리뷰](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5/01/still_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