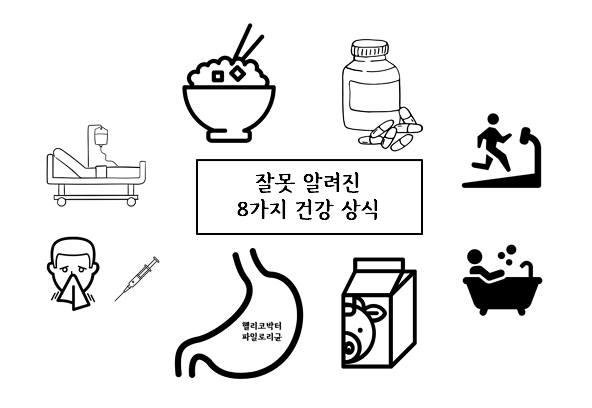#1.
“아아, 감정이 왜 이러니, 나한테는 사십도 너무 젊다.”
전화기로 흘러나오는 K의 목소리에서 엷은 탄식이 묻어났다. 그녀가 지금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녀와 다르지 않으니까. 불혹을 넘어서면 저절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해질 줄 알았다. 패기를 잃는 대신 안정을 찾겠지. 그리하여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겠지. 크게 기뻐할 일이 없으면 어떠랴. 크게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다. 사십을 넘기면 나도 얼치기 도사 흉내는 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각각 따로 나이를 먹는지, 아직 불혹의 이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평상심을 갖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많은 시간 마음은 방황과 좌절을 일삼고 들뜨고 가라앉으며 제멋대로 놀아난다.
“미치겠다. 왜 또 봄은 오고 꽃은 피냐.”
계절의 변화에 무심할 만도 하건만 친구의 해묵은 계절 타령은 때마다 계속된다. 마치 어수선한 마음의 조화가 모두 계절 탓이기라도 한 것처럼.

#2.
부고를 받고 달려갔더니 엄마를 잃은 M은 슬프게 울었다.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
아는 얼굴들이 조문할 때마다 M은 울고 또 울었다. 슬픔과 회한으로 끼니를 걸렀을 M의 몸은 자주 휘청거려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더 안쓰러웠던 것은 그녀가 여전히 ‘엄마’가 필요한 ‘아이’라는 사실이었다.
“너 이제 고아야, 네 몸 네가 챙겨야지. 얼른 먹어. 그러다 쓰러져.”
밥을 먹이기 위한 친구들의 농담에 그녀가 잠깐 웃었던가. 사십에 엄마를 잃은 그녀는 영락 없는 고아였다.
M을 남겨두고 돌아 나오는 발길이 무거웠다. 누구라고 그녀와 다르겠는가 싶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을 뿐 누구에게든 자라지 못한, 자라지 않는 아이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체면과 예의와 교양 같은 사회적 태도가 힘을 쓸 수 없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는 낯설고 불편하며 많은 경우 안쓰럽다. 시간 밖에서 사는 ‘어린 나’를 직면하는 일은 그래서 상처와 연민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시간과 함게 자연스럽게 흐르기란 참, 그렇다.

#3.
여전히 돌보고 보살펴야 할 ‘나’들이 있는 한 나와 친구들은 조금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민하고 세미하여 사소하고 부질없어 보이는 것들에 자주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는 쉽게 어른이 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여 어떤 날은 괴로울 것이며, 또 어떤 날은 천진한 즐거움에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통과하며 더 많이 깊어질 것이고, 그래서 서로 동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라 말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은 결국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배려,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심성은 동정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드러운 감정은 사람과 사람을 묶는 튼튼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저 마음의 심란함을 토로하는 친구를 팔자 좋은 여편네의 넋두리 정도로 치부한다면, 엄마를 읽은 친구의 눈물을 상가의 과장한 슬픔 탓으로 돌린다면, 나는 그들과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밝고 맑은 흠이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편견을 더는 가지고 있지 않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것만을 강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와 다르지 않은 그들의 어둡고 그늘진 부분을 동정하는 것,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 다시 걷게 하는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