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26년의 질적 함량을 문제삼으며 허지웅이 맞았다는 의견들에 대해: 이런 이야기 꼭 영화뿐만 아니라 디워든 나꼼수든 깨시민 논쟁이든 많이 듣는데, 그럴거면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당시 그냥 “나는 왜 욕먹는지 모르겠네” 정도라도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지웅)
우연히 허지웅 씨 페이스북 단상을 접했다. 지웅 씨의 단상이 내 단상의 발아점인 셈이다.
1.
어떤 문화 텍스트에 관한 해석에 대해 ‘맞다’는 진술, 그리고 그 당연하게 전제된 짝말, 대립항으로서 ‘틀리다’는 표현은 손쉽게 관용적으로 쓰인다. 나는 이런 일상 표현이야말로 당대의 문화적 풍경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맞다’는 말, 이 일상적인 표현은, 좀 과장해보자, 21세기 남한의 달콤하지만 동시에 살벌무쌍한 천민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어떤 경향, 그 편협성, 그 천박함, 지긋지긋하게 촌스럽고 선정적인 진리 독점주의, 그런 문화적 강퍅함을 증거하는 흔적들 가운데 하나다. 물론 나는 스스로 ‘이건 좀 과장이잖아’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난 정말 과장하고 있는 건가’라며 또 저항한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 그렇다. 문화적 텍스트에 대해 ‘맞다/틀리다’는 표현은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하고, 쓰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문화적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또 다른 도그마가 될 염려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 해석’이라는 왕국에서 ‘맞다/틀리다’는 신민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왕국이 피폐해지거나 상처받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인용이든 재인용이든 아니면 직접 자신이 한 말이든 불문하고 그렇다.
언젠가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위대한 비평가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은, 첫째 자신과 반대되는 이론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자신이나 상대방을 어떤 특정 카테고리 속에 집어 넣어 분류하려고 하는 태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평이란 저자와 비평가의 대화, 텍스트 상호의 대화, 그리고 반대 이론끼리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T. 토도로프)
2.
다시 지웅 씨 페북 단상으로 돌아가 보자. 영화평론가도 사람이다. 지웅 씨의 억울함에 대해선 십분 공감할만하다. 누구든 안 그렇겠나. 자신은 솔직하게 자신의 관점으로 어떤 영화를 해석했을 뿐인데, 그 해석을 “틀리다”고 공격하는 태도에 대해 ‘그래요. 제가 틀렸네요.’라고 바보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쿨한 젊은 평론가다. 그 쿨함과 위악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브랜딩이고, 포지셔닝인 바에야 더욱 그럴 수 없겠다 싶다. (사족. 자신을 삼인칭으로 표현하는 일은 스스로도 어색하겠지만, 보는 사람도 어색하다.)
각설하고, 일상적인 관용어구로서 문화적 해석에 있어 ‘맞다/틀리다’라는 표현은 자칭 타칭 평론가라면, 페이스북과 같은 가벼운 일상적 메모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삼가야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물론 지웅 씨 페북에서 ‘맞았다’는 표현은 누군가의 트윗(들)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발화의 출처는 지웅 씨가 아니고, 지웅 씨의 ‘어떤 독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 트윗을 자기 위로의 증거로 삼아 붙잡고 싶었나 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치 초등학교 동급생이 된 것 같은 감상적인 연민이 생길 지경이다. 물론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이 세계에 거의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3.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 곧 평론과 해석의 태도에 다름 아니다. 글쟁이라는 표지로 일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쓰는 글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글에도 도덕적 책무가 뒤따른다. 굳이 ‘책임’이 아니라 책무라고 쓴 건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상 책임’으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평론가라는 타이틀에 쉽게 영향받는 순응적이고 관습적 독자는 평론가의 관점에 쉽게 물들기 쉽다. 그런 독자의 태도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나 역시 그런 순응적, 관습적 독자로서 함께 경계하고자 굳이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
4.
우리 시대에 영화 평론가라는 존재는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극소수 몇몇은 여전히 관습적인 매체, TV 방송과 종이신문, 그리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온라인매체에 글을 쓰고 ‘평론가입네’ 한다. 하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꺼운 독자들은 점점 더 사라져간다. 아주 오래전, 정영일이 마치 정답을 이야기하듯 짧게 나와 주말의 영화를 소개했던 그 권위, 혹은 수많은 영화광을 양산해냈던 정은임과 정성일 콤비의 ‘FM 영화 음악’이 만들어냈던 그 ‘시네마 천국’은 이제 없다.

아직 우리에게 ‘시네마 천국’은 남아 있는 걸까.
물론 영화 [시네마 천국]은 그 꿈이 왜곡된 기억이라고, 기만적인 현실일 뿐이라고 차갑게 말한다.
[box type=”info”]참고 문헌
김성곤, ‘츠베탕 토도로프; 탈구조주의와 문학비평의 새 지평’ , [미로속의 언어], pp.157, 158. 중에서, 민음사, 1986.[/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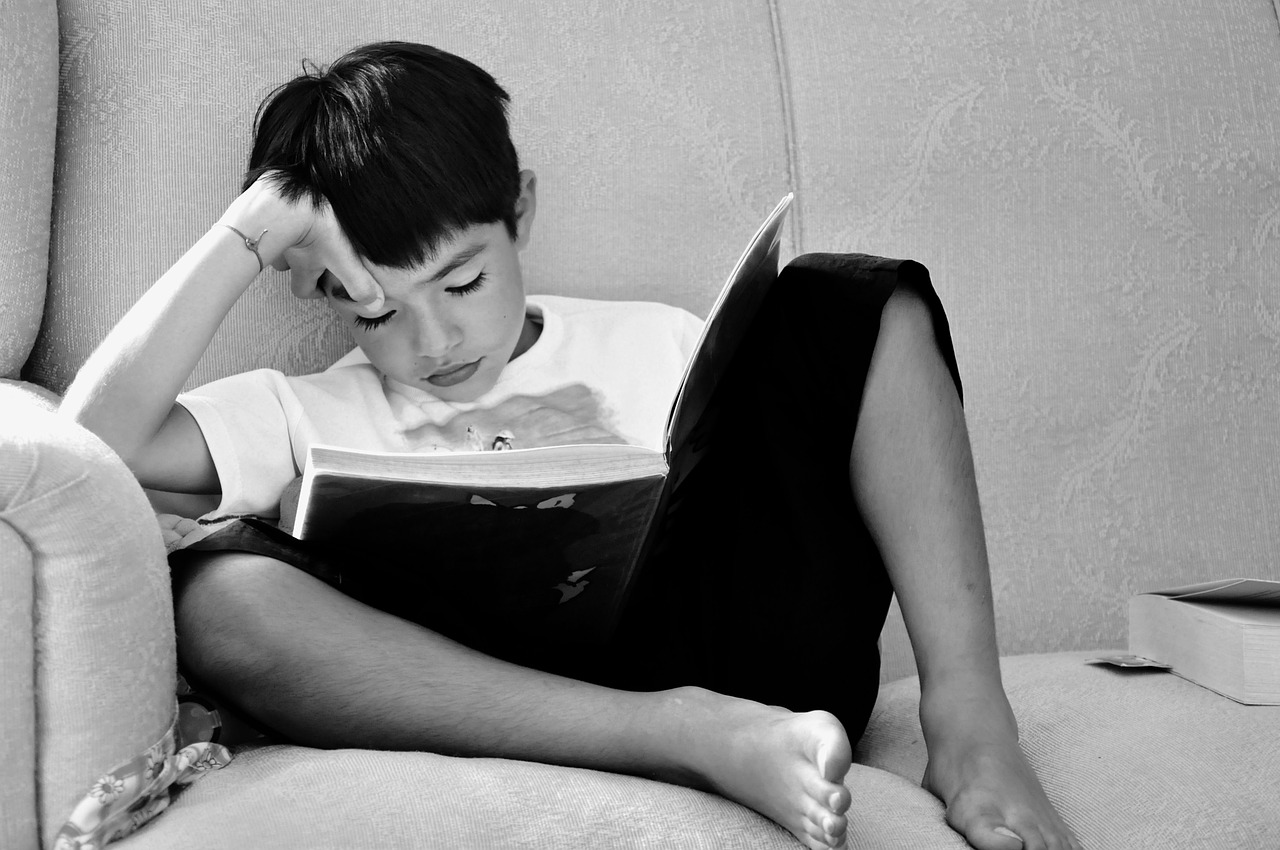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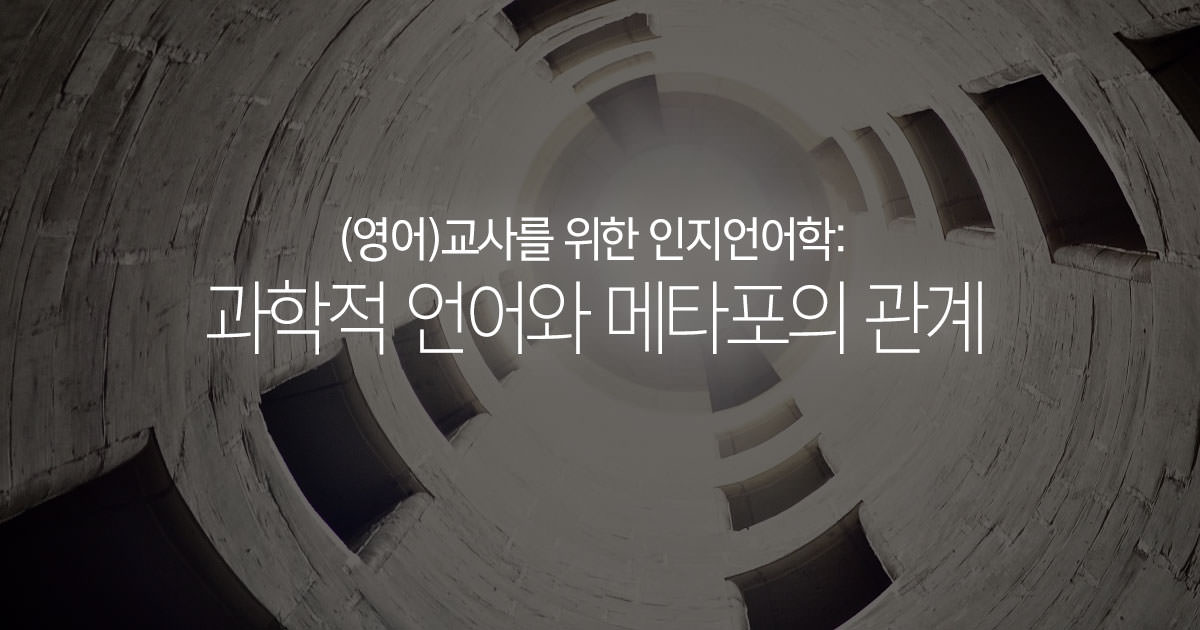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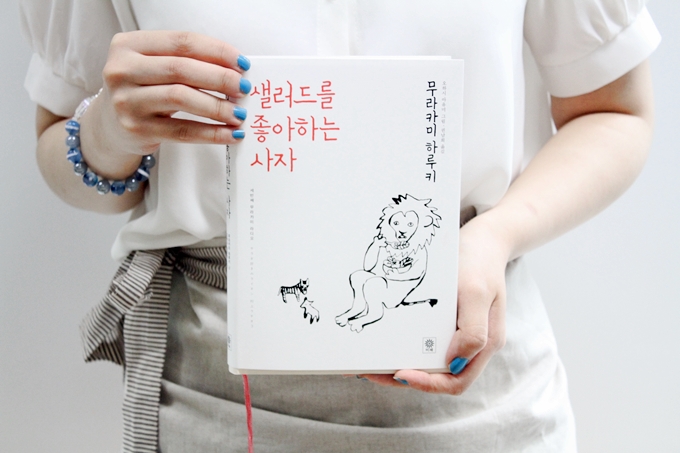
자신의 말에대한 파장만큼만 신경써서 말을 한다면 독백하듯 욕설도 괜찮고 강연장에서 돌려돌려 말하는것도 괜찮겠죠. 기록을 위한 평론과 읽히기 위한 평론도 달라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허지웅씨가 맞다고 표현하기도 힘든게, 손익분기점이 200만명인 내가 살인범이다나 늑대소년 등등의 화제작들 틈사이에서 260만명으로 나름 선전했습니다. 양적으로는 일단 본전을 뽑은셈인데, 그걸 떠나 영화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비판하느라 영화의 재미적인 요소마저도 모두 폄훼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모독을 느꼈다는 걸 허지웅씨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영화 자체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는 것은 평론가로서 당연한 태도이지만, 의 스토리텔링이나 편집방식, 조명이나 미술의 활용등 영화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조리 비난하는 건 아무리봐도 공정하지 못하죠, 차라리 아예 언급을 안 했다면 모를까요.
앗…괄호표시를 하면 아예 표시가 안 되는군요. 손익분기점이 200만명인 이 영화가 내가 살인범이다나 늑대소년 등등의 화제작…이렇게 쓴 겁니다.이거 답글 삭제도 수정도 안 되어서 난감하군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여 꺽쇠가 잘 표시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드렸습니다.
본문의 영화평론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좋은? 재밌는? 맛있는? 평론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영화평론을 볼 수 있는 곳을 알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평론가 이름이라도.
좋은 (영화) 평론을 찾았지만, 그런 평론을 만나지 못했다면, 스스로 글쓰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트뤼포의 격언을 따라가자면, 영화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자 단계겠네요. 과거 정성일 씨와 이연호 씨, 그리고 신혜은 씨를 좋아했습니다. 정성일 씨께서 편집장으로 계시던 [키노](월간)를 기다리는 게 아주 큰 즐거움 중 하나였으니까요. 벌써 오래 전 이야기고, 또 아주 어릴 적 이야기네요.
지금 그때 [키노]를 읽는다면 과연 여전히 호의적일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키노]는 다소 과하게 서구(프랑스) 편향적 경향이 없지 않다 보고, 지금/여기를 통해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지적 현학취미의 유치함도 지금에 와서는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연호 씨가 아바스 키에로스타미를 소개하던 글은 여전히 마음의 따뜻한 잔상으로 금방이라도 떠올릴 정도이고, 신혜은 씨의 지적이고, 동시에 감수성 넘치는 평론에 스며들어 있는 날카로운 속삭임 역시 희미하지만 아름다운 독서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FM영화음악]을 저는 몹시도 사랑하였죠.
좀 허무한 결론인데, 지금 따로 찾아 읽는 영화 평론은 없습니다. 다만 종종 재미삼아 IMDB의 아주 짧은 전문가 코멘트를 읽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저 이버트의 코멘트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영화 선택에 참조하는 편이죠. IMDB의 독자 영화 평점도 영화 선택에 더불어 참조합니다. IMDB 평점이 비교적 높고, 로저 이버트가 추천하는 영화라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이라도 나누고 싶은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은 현재 스코어 제 세계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신나거나 혹은 우울하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