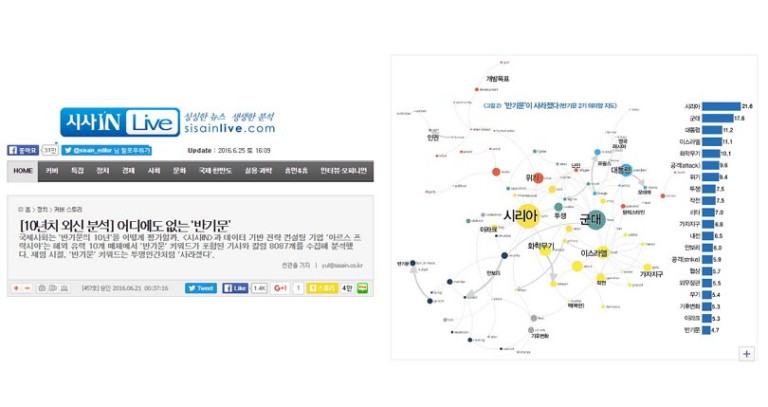요즘 페이스북을 자주 한다. 페이스북을 하면서 종종 이 SNS라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 ‘자아 표현’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든다.
페이스북은 타인에게 자신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매체다. 그리고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선택해서 보여주게끔 유도하는 매체다. 이게 인간 본성에서 어긋나 있다는 건 아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일어날 만 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고, 또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노출되는 건 언제나 통제한다. 우리는 타인이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시선을 끊임없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뛰어난 감식안, 아름다움과 올바름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 날카로운 지성 등을 내비친다. 설령 이런 걸 내비치지 않아도 남들이 ‘저 녀석은 쓰레기잖아?’, ‘당신 너무 멍청해!’ 라는 생각이 들게 할만한 정보를 기꺼이 풀지는 않는다.

이런 행동을 하게끔 부추기는 우리 내면의 욕구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면대면 접촉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모습을 온라인에서는 쉽게 감출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 조작이 온라인에서는 정말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의 알림 시스템은 이 과시를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를 최대로 끌어낸다. 그에 대해서 ‘좋아요’라는 형태로 서로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품앗이’하기도 굉장히 쉽다. 오프라인 인간관계는 진화생물학자 로빈 던바가 제시했듯이 인간의 인지적 한계의 제약을 받는다.
온라인에서 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문턱은 낮기에 인간관계의 깊이가 얕은 사람과도 얼마든지 관심을 호혜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실 별 호감도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좋아요’를 제공하면, 그 사람도 나의 자기과시에 ‘좋아요’를 찍게끔 압박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자아 과잉
문제는 특정 욕구를 극단적이기까지 할 만큼 조장하는 이 시스템하에서 자아 표현마저도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식습관과 같다. 우리는 단 것과 기름진 걸 좋아한다. 하지만 이건 자연상태에서 단 것과 기름진 것을 얻기가 힘들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는 다른 영양분들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와 같은 특정 자극에 대한 기호는 문명을 만나서 ‘그 기호’만 따로 뽑아먹는 게 가능해지자 인간을 되려 위협하게 된다. 바로 기름 뚝뚝 떨어지는 내장 파괴 버거를 먹고 밀크셰이크 라지 사이즈로 시원하게 당기는 비만을 불러오는 식습관으로 돌아온 것이다.

자신이 비치고 싶은 모습으로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과시욕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면대면 접촉에서 볼 수 없는 자기 표현을 우리는 SNS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자신도 지킬 수나 있을지 의심스러운 도덕적 순결성을 독선적인 태도로 남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차피 자신도 타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마찬가지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타인의 무지를 깔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무엇이든 자기만의 독특한 ‘컨셉’을 잡아 마치 연극의 캐릭터처럼 활동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가끔은 각자 자신만의 ‘나와바리’를 잡고 여기는 서로 건들지 말자, 그런 암묵적 합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컨셉은 나만의 것이라든가, 이 분야는 나만 얘기할 수 있다든가. 이런 모습을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하며 많이 봤다.
단순히 에티켓이나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욕을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온라인에서도 그건 마찬가지다. 다만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그것이 과연 본인의 진실한 모습인지,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남들을 대하느냐고 묻고 싶긴 하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아가 반드시 동일성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인간에게는 “천 개의 페르소나”가 있고, 실은 인간은, 그때그때 상황과 역할에 따라 어울리는 가면을 꺼내쓰는 존재니까(참조: 페이스북이 만드는 평균인). 하지만 타인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것까지 불사하는, 꾸며낸 ‘자아 과잉’은 이해하기 어렵다.

폭력적일 때도 잦다.
오래된 앨범처럼
이번에 이삿짐을 쌀 때 장롱에서 옛날 앨범을 펴보았다. 그때 본 사진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남는다. 외삼촌이 농사일하다가 친구들이랑 어깨동무하면서 찍은 사진, 마루에 앉아서 숫돌로 칼 갈고 있는 사진, 나뭇가지를 한 움큼 쥐고 아궁이 앞에서 웃고 있는 외할머니 사진, 대학교 친구들과 80년대 촌 티나는 옷 입고 공원에서 찍은 엄마 사진.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때 이 장소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사진을 찍기 전과 찍은 후에는 뭘 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해진다.

물론 나 또한 SNS에 자아표현과 자기과시를 한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나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먼 훗날 봤을 때 ‘아, 이 때 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지,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지’ 하는 걸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도 있다. 남들에게 내 내면의 더러움과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풀고 싶지도 않고 애초에 그런 걸 대뜸 면전에 들이미는 건 예의도 아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으려고 내 자아를 부자연스럽게 꾸미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가진 이들은 서로서로 구별되고 싶은지는 몰라도 온갖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들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뭔가를 흉내 내고, 부자연스러운 컨셉을 더하며 인위적 자아를 표출한다. 하지만 그런 오만가지 모습들이 오히려 결국은 다 한 범주로 묶여 천편일률적인 자아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재작년에 가족끼리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SNS에 올려서 관심 좀 받아보려고 별 컨셉으로 사진을 많이도 찍어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머리에 남는 사진은 솔직히 하나밖에 없다. 엄마랑 둘이서 아사쿠사 센소지를 구경하고 있는데 미국인 관광객이 보기 좋다고 사진 찍어주고 싶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찍은 사진. 내가 그때 누구와 함께 여기에 있었고 무슨 느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자연스러운 사진이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망은 사랑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받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항상 그대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면 된다.
정현종, ‘사랑 사설 하나 – 자기 자신에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