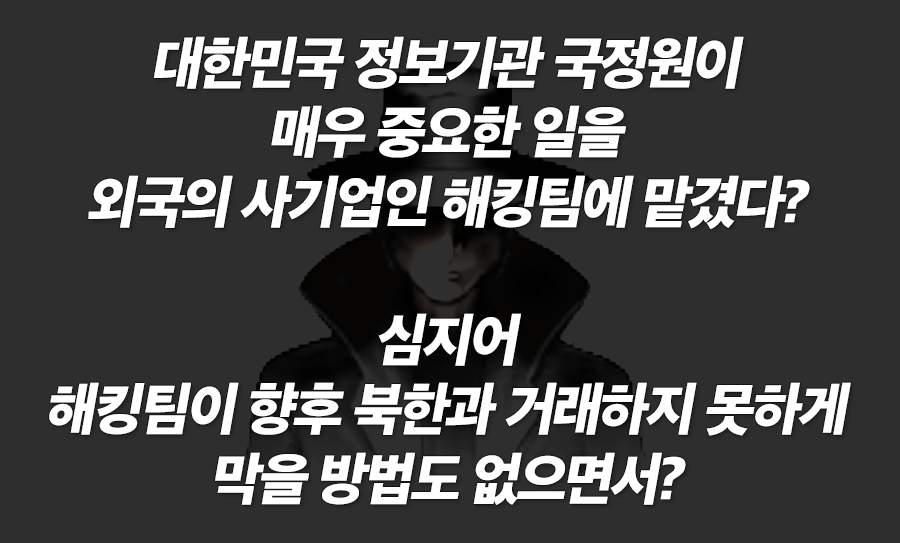5학년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우리는 생전 처음 부산에 갔다. 그 전날 선생님은 행여 도시아이들에게 놀림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여러 차례 신신당부했다. 반바지에 꼭 하얀 목이 긴 스타킹을 신으라고. 도시 애들은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그리고 부산 용두산 타워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 두 분은 우린 뒤로 커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계셨다.
‘(환) 합천 오지 어린이 선진지 견학 (영)’

가끔 지금 친구들에게도 우리 어릴 때 이야기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였다. 우리보다 10살 많은 분들과도 이야기하면 ” 젊은 친구가 우리 시절 이야기를 왜 그리 잘 아느냐”고 하신다. 두메산골에 살았던 우리는 도시의 또래 친구와 10년 이상 문화 격차를 느낀다.
어린 시절 나는 길이 없던 산골에 젊은 장정들이 나무 전봇대를 매고 가져와서 전기를 가설하던 것도 보았다. 우리 옛날이야기를 하면 놀리는 통에 도시에 나온 우리 친구들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내 나이 45살. 92학번.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사흘 전부터 내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꿈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들을 짧은 이야기로 적어 우리 동문 SNS에 올리고 있다.
슬리퍼 달인 선생님과 우리의 비밀
그때는 그렇게 쥐가 많았었나 보다. 수업시간에도 쥐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교실 벽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책상 위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2학년 담임선생님은 산간 오지에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었다. 그분은 항상 교사용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수업 중에도 가볍게 발을 올리면서 슬리퍼를 공중에 띄운 후 손으로 잡고 던지면 백발백중, 쥐들이 그 슬리퍼에 맞고 죽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가진 신 분이었다.
선생님의 기술은 우리 학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발에 있던 슬리퍼가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손에서 발사되는 경지에 이르렀고, 쥐를 죽일 수도 기절시킬 수도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가끔 그 슬리퍼가 수업 중에 조는 친구에게 발사되는 경우도 있어서, 쥐를 잡은 슬리퍼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업시간에 초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고사를 치른 며칠 후 선생님은 반장과 나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를 남게 했고, 학교 뒤 사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호출에 우리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당황스러웠지만, 반장과 같이 부름을 받은 거라서 야단을 맞을 거 같지는 않을 거 같았고, 오히려 선생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다.
우리가 사택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친 시험지들이었다. 친구들 번호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선생님은 우선 자기 시험지를 찾게 하고, 같이 온 친구와 바꾸게 하였다. 그랬다. 선생님이 원하시던 건 어이없게도 시험지 채점이었다.

당시 학생 수가 60명에 달했기 때문에 시험을 채점하는 것은 선생님에게도 나름 고된 일이었던 거 같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 시험지를 채점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대통령이 세금 100조 원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해라 하는 것처럼 권력의 달콤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시험지를 열 몇 장씩 나눠 가지고 빨간 색연필로 채점에 들어갔고, 선생님은 한쪽에서 커다란 칡을 손작두로 잘라서 꼼꼼하게 신문지에 널어서 말리고 계셨다. 우리는 어떤 친구의 성적에 웃기도 하면서 열심히 채점했고, 마지막 몇 장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적표에 내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45번 허민자.
같은 동네 키 작은 여자친구의 답안지였다.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틀린 답이 눈에 들어왔고, 심장은 두근대기 시작했다.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 눈치를 살피며, 짐짓 모른 척, 실수인 척, 틀린 답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주관식은 선생님이 채점하신다고 해서 빨리 끝나긴 했지만, 우리는 어둑해져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이번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날 우리는 우리가 채점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매긴 성적표가 그대로가 아니었다. 선생님이 또 일일이 다시 확인해서 수정해놓은 시험지였다. 아쉽게도 선생님의 눈치와 사명감은 내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그때 심장이 두근거린 사람은 나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정환경 평가
도시에서 갓 전근 오신 새로 온 두 선생님은 아주 젊고 박력이 있으신 분들이었다. 한 분은 군대를 막 제대하셨고, 한 분은 우리와 다르게 하얀 얼굴에 금색 안경을 낀, 뭔가 도시의 세련미가 묻어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최초로 하는 설문조사는 지금 말로는 ‘가정환경 평가’ 뭐 이런 것이었다. 설문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다.
[box type=”info”]
[문 1.]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고르시오.
1. 피아노 2. 냉장고 3. TV 4. 선풍기 5. 기타( )
[/box]
반장이 선생님께 질문했다.
“선생님, 피아노는 가전제품 아닌데요?”
뒤에 있던 친구도 물었다.
“전기가 들어오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아노 같은 게 시골에 있을 리 없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산다는 집은 최근 들어온 흑백 TV 정도로 설문에 체크가 가능했고, 5번의 기타가 피아노보다 비싼지 어떤지 고민하던 친구도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할 게 별로 없었던 이 설문의 마지막 질문은 이랬다.
[box type=”info”]
[문 10.] 자기 집의 경제 수준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1. 상 2. 중 3. 하
[/box]
이 항목에서 다들 다른 친구의 눈치를 살피면서 열띤 토의가 벌어졌다.
우리는 일단 북한보다 잘사니깐!
우리 집도 밥은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잘사니까.
우리 집은 TV가 있으니까.
각자 나름의 이유로 친구 대부분은 ‘중’을 골랐다. 심지어 피아노는 아니지만, 풍금을 가진 친구는 당당하게 ‘상’을 택했다.
하지만 아이들 수군거림을 듣던 젊은 선생님은 정말 기가 막혔던 모양이다. 얼핏 선생님 얼굴에서 비웃음이 같은 게 보였다. 그러면서 말하길.
“야. 너희가 현실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니희는 마지막 문항에선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전부 3번 쓰면 돼. 알았으면 얼렁 체크하고 뒤에서부터 걷어 와!”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시켜주시던 성시경 닮은 그 젊은 도시 선생님은 몇 달 동안 짧은 담임 생활을 마치고 도시로 전근을 가셨다. 그래도 나름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그날 선생님은 고만고만하게 가난했던 우리를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로 만들어 버렸다.
중산층의 기준이 부쩍 높아진 지금, 마지막 항목은 지금도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와 탈곡기
아버지께서는 가끔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그때는 유난히 고생했다고, 그때는 일하느라고 머리에 이가 생긴 줄도 몰랐다고 그러신다. 말은 안 했지만, 그때 기억이 나에게도 뚜렷하다.
그해 유독 풍년이 들었는지 벼농사가 아주 잘 된 거 같았다. 아버지는 논에서 나락을 묶어서 몇 번씩이나 지게에 한가득 싣고 채 20평도 안 되는 마당에 한가득 쌓아 놓았다. 그리고 땀이 식기도 전에 또 한가득 나락을 묶어 지고 오셨다. 일개미처럼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하셨다.
어느 날, 나름으로 전기에 지식이 있으셨던 아버지는, 못 쓰는 공업용 모터를 구해서 탈곡기와 연결하셨고, 전기세가 걱정되셨는지 집 앞에 세워진 전봇대에서 올라가서 전선을 까고 전기를 연결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보통은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면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날은 빨간 전깃불에 의지한 탈곡기는 쉼 없이 계속 돌아갔고, 우리 형제는 열심히 볏단을 옮겨서 타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전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그 일이 끝났다.
빌려온 탈곡기를 내일 당장 돌려줘야 해서 그랬는지, 다음날 비가 올 거 같아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하신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무사히 쌀가마니를 차곡차곡 다 채운 후, 그제야 아버지는 당신 머리가 몹시도 가렵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그날 밤 모기약을 머리에 한가득 뿌리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주무셨다.
다음날 아버지가 누웠던 자리에는 하얀 재가 한가득 떨어져 있었다. 한동안 일 하시느라 머리를 못 감으셔서 그러시구나 했는데, 어머니 잔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쑥스러웠는지 범인으로 어린 나를 지목하셨다. 내가 이를 옮긴 거 같단다. 내 기억으로는 나보다는 아버지 머리에서 이가 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시절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그 탈곡기는 어쨌느냐고 여쭤봤더니, 20km나 되는 읍내에 아는 친척한테 빌려서 한나절 동안 짊어지고 오셨단다. 지금도 차로 30분 거리를. 그 당시 그 멀고 험한 자갈길을, 지게에 그 무거운 탈곡기를 지고 오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뭐가 그리 잘되는 게 많았는지 손만 대면 잘돼서 쉴 틈이 없었다고 그러신다. 그 재미로 정신없이 아들 셋을 공부시킨 거 같다면서.
아버지의 왜소해진 어깨를 볼 때면 저 무거운 걸 어떻게 지게에 지고 들고 오셨는지 지금도 의아하기만 하다. 돌려주실 때는 그나마 손수레를 빌려서 갖다 줬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아버지는 엄청 부지런하시다.
연필 깎기의 정석
오늘 한 권을 책을 보았다. [연필 깎기의 정석]이라니.

나도 연필깎이에 대한 기억이 참 크게 남아 있다. 아버지는 다른 경상도 어른들처럼 무섭고 엄격한 분이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힘든 시절을 겪어 오시면서 열심히 사셨고, 군인 생활도 하셨던 분이라 더 그랬다.
내 기억에는 항상 말 붙이기도 어려운 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없이 커온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하는지. 어떻게 다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와도 꽤 좋은 추억들이 있었다.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였었나. 혼자 마루에 앉아 연필심이 뭉뚝해져서 연필 칼로 서툴게 깎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아주 큰 낫으로 섬세하고 길게 연필심을 다듬어 주셨다. 아버지의 연필 깎는 비법은 칼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연필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깎는 것이었다.

이후로 나는 연필을 매우 잘 깎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진로를 바꾸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몇백 자루의 연필을 깎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옆에 친구들이 감탄하며 나에게 연필을 깎아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했다.
가끔 연필을 깎을 때마다 긴 낫으로 매우 섬세하게 연필을 다듬어 주던 아버지 모습이 기억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