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그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은 혼돈에 빠졌다.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공항은 마비되었고 여성들은 다시 부르카(눈과 발밑을 제외하고 신체 전부를 가린 여성의 복장)를 입었으며 거리는 한산해졌다. 이에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경쟁하듯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언론의 보도 덕분에 우리는 TV 앞에 편히 앉아서도 서울에서 5,000km 이상 떨어진 카불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언론의 보도 때문에 우리는 탈레반과 전쟁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진다.
아프간 비극, 그저 탈레반의 ‘능력’ ‘성과’로 표현
한국 언론은 이번 탈레반 사태 보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예컨대, 연합뉴스는 ‘탈레반, 우리 달라졌어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탈레반이 달라진 모습을 강조했다. 이는 카불 점령 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탈레반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을 억압하던 과거 탈레반의 태도를 염두에 뒀을 때 믿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탈레반은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총살했다. 연합뉴스가 이를 예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기사에서 기자의 “”아프간 국민이 당신을 용서할 것 같으냐”는 용감한 질문”에 탈레반 대변인이 “참을성 있게 답했다.”고 표현했다. 기자로서 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무장단체의 대변인에게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어쩌면 던져야 할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자처한 탈레반의 대변인으로서도 충분히 답변을 준비했을만한 질문이었다. 여기에 탈레반의 대변인이 “참을성 있게” 답했다는 식의 주관적인 표현을 덧붙일 이유는 없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 각국의 뉴스통신사들과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언론사 210여 곳에 전 세계의 뉴스를 공급한다. 많은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의 국제뉴스 기사를 받아쓰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기사가 중요한 이유다.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에서도 기사 제목에서 무능력한 정부와 달리 탈레반은 인내와 보복을 무기로 다시 일어섰다고 말해 그들의 ‘능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다.
- [연합뉴스] ‘탈레반, 우리 달라졌어요’…TV서 여성 앵커와 마주 앉아 인터뷰 (2021-08-17)
- [연합뉴스] ‘탈레반 ‘핑크빛 약속’에 “본 모습 곧 나올 것” (2021-08-18)
- [경향신문] 정부 무능 속 ‘인내와 보복’ 무기로 다시 일어선 탈레반’ (2021-08-16)

The U.S.Army, afghanistan(2007), CC BY)
줍줍? 전쟁 현장을 오락화하는 언론
한국 언론은 전쟁의 참혹성과 폐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다. 탈레반이 미군의 97조 원 어치 무기와 장비를 획득했다는 보도는 마치 게임의 한 장면을 해설하듯 보도되었다. 뉴스1과 경향신문은 ‘줍줍’이라는 게임 용어를 제목으로 내세워 이번 탈레반 사태를 오락적 요소로 치부했다. 탈레반이 미군의 무기와 장비를 얻은 것이 전 세계 국가에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되는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은 ‘줍줍’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 지워져버렸다.
- [뉴스1] 탈레반, 97조 규모 미군 무기 ‘줍줍’…또 다른 골칫거리 예고 (2021-08-18)
- [경향신문] 탈레반, 아프간에서 97조원 어치 미군 무기 ‘줍줍’ (2021-08-18)

따옴표(“”)안에 대사를 넣는 관행을 사용해, 전쟁 상황을 극처럼 보도한 경우도 발생했다. 19일 탈레반이 그들을 피해 집으로 숨어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때 한국 언론은 ‘총 들고 “출근하세요”’ ‘”똑똑…출근 안하나?”’와 같은 표현을 기사 제목에 담았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탈레반은 집집마다 방문해 겁에 질린 아프간 주민들에게 일하라고 말했다. (Taliban go door-to-door telling fearful Afghans to work.)”라고 쓰면서 탈레반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똑똑…출근 안하나?” 탈레반, 경제 살린다며 총들고 집집 방문 (2021-08-19)
- [세계일보] 경제 마비에 다급해져 집집마다 ‘기습’ 방문한 탈레반.. 총 들고 “출근하세요” (2021-08-19)
탈레반은 반인권적인 학살과 탄압을 자행해온 무장단체다. 한국 언론은 보도를 함에 있어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격하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전쟁의 현장을 오락화·극화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는 전쟁을 직접 겪는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탈레반으로부터 핍박받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식의 보도 행태를 이어나갔을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국가이고, 그 전쟁의 이야기는 작은 쉼표가 찍혀있을 뿐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쟁보도준칙 등을 마련하여 부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를 세심하게 다루는 한국 언론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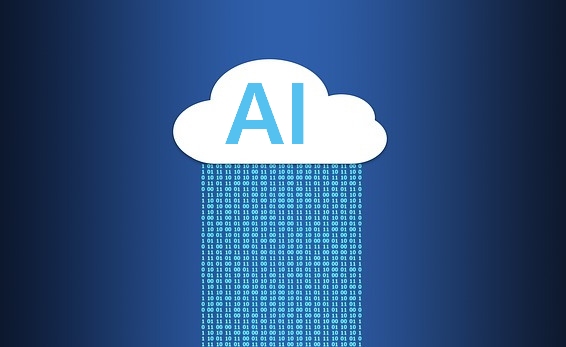

![선방심의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8번째 법정제재](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24/03/20240129503237-768x3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