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사회에 선물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산타 회사’. 필자는 [산타와 그 적들]에 다양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등 우리 사회의 산타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독자와 나눕니다. (편집자)[/box]
잊히지 않는 일화가 있다. 채수선 셈크래프트 대표를 우연히 만났다. 대학로 ‘아름다운 헌책방’에서 열렸던 ‘머니투데이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바자였다. 근처를 지나다 들렀다는 채 대표의 얼굴이 까칠했다. 낯빛도 검었다. 건강을 물었다. 한동안 안 좋다가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피곤하단다. 기력이 없어서 그런지 현금인출기가 터치스크린 방식이면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계가 그의 손가락을 인식하지 못했다.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나 보다 싶었다. 좀 쉬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쉬어야죠. 그런데 쉴 틈이 안 생겨요. 낮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찾아가서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뭣 좀 생각할 것이나 꼼꼼히 할 일이 있으면 밤에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에요. 한 서너 시간 자나. 아침엔 애들 밥해 먹여야 하죠. 애들 밥 못 굶겨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데.”
수제 비누 만드는 장애인 작업장 셈크레프트
셈크래프트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이다. 낮은 울타리 너머 안마당엔 살구나무가 있고 회색 칠을 한 벽과 흰 현관문, 피라미드 모양의 지붕이 동화 속 집 같은 전형적인 3층짜리 가정집이다. 집주인인 채수선·손승렬 부부는 이 예쁜 집을 완공하고 1년 뒤인 2006년, 미혼의 두 딸을 내쫓아 버렸다. 어머니 채수선 씨가 딸들에게 “여긴 공장 차려야 한다. 나가 살아라.” 했다. 당시 23세, 28세였던 두 딸은 집을 떠나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야 했다.

그 집에 장애인 직원들이 들어가 수제 비누를 만들었다. 비누는 좋았다. 셈크래프트 곡물 비누를 쓰고 연극배우 신철진은 머리카락 빠지던 게 멈췄다고 했고, 미백 비누를 써본 비행기 승무원들은 화장까지 지워진다며 신기해했다. 언론이 이 사연을 전하면서 비누 매출이 늘었고, 12명이던 장애인 직원은 16명까지 늘었다. 일반 기업의 이야기라면 대단한 성공담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르다.
늦도록 일하다 잠든 어느 새벽, 채 대표는 문득 눈을 떴다. 장애인 직원 한 명이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반. 채 대표는 일어나 쌀을 씻었다.
“걔는 눈꺼풀만 벌어지면 우리 집에 와요. 배고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출근 시간 되기 전에 와요.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만날 집 안에 앉아 벽만 보고 있던 애들이에요. 집 밖에 나가면 장애인이 되니까.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저희들끼리 모이면 그게 아니거든. 그게 좋으니까 새벽이든 아침이든 그냥 눈 뜨면 오는 거예요. 애들 밥 챙겨주는 것도 큰일이라니까.”

일 이야기를 하면서 채 대표의 피곤한 낯에 어떤 기운이 돌았다.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 특유의 힘이 느껴지는 기운이었다. 그런 이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서 힘을 얻는다. 채 대표한테는 그게 직원들이다. 그에게 셈크래프트 운영은 밥벌이이자, 직원들에게 밥벌이를 주는 일이다.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소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적 밥벌이다.
밥벌이의 지겨움? 세상을 바꾸는 밥벌이도 있다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밥벌이는 지겹다. 고단하다. 그렇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다. 딱 먹고 살 만큼, 때로는 그것도 어려울 만치 적은 돈을 버는 데도 힘이 든다. 빚이라도 지면, 일상은 더 고단해진다. 내일을 대비할 만큼 넉넉히 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밥벌이의 지겨움이 덜한 건 아니다. 때로는 밥벌이를 위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꾸며 현재의 지겨움을 견뎌낸다.
채 대표처럼 이타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일은 밥벌이다. 밥벌이는 힘든 일이다. 게다가 사회적 미션으로 하는 창업은 대개 큰 돈벌이는 되지 못한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해도 대부분 그건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데에 쓰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셜 비즈니스 창업가들은 먹고살 정도 번다. 그라민처럼 사업이 잘 되어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다. 이런 비즈니스의 창업가들은 수익을 자기 사명 혹은 다른 소셜 비즈니스에 재투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가 재창출되지 않으므로 소셜 비즈니스라 할 수 없다.
셈크래프트의 제품 설명 어디에도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문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동정이 아니라 필요, 구걸이 아니라 품질로 소비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다.
“비누 만들어 팔면서 애들(직원들)이 전보다 당당해졌어요. 자폐인 아이도 여기 오면 자기가 먼저 딴 사람에게 말 걸어요. 우리는 돈 벌어서 더 많은 애들한테 떳떳한 일자리를 주고 싶어요.”
밥벌이 정도 하는 일인데도, 자신의 부를 늘리는 일이 아닌데도 이들은 ‘지겹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의 미션이 곧 자기 삶의 미션을 이루는 일이니까. 지루할 수는 있다. 어떠한 것이든 미션을 이루는 여정은 길다. 지루하더라도 그 길에는 자기 성취의 희열이 있다. 그건 예술가나 과학자, 장인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밥벌이 지겨움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무하마드 유누스가 말했듯, 소셜 비즈니스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돈을 버는 일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밥벌이의 지겨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소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창업하든, 취직하든)이 누릴 첫 번째 혜택이다.
두 번째 혜택은 희열이다. 소셜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산업 혹은 사회의 지형을 바꾼다. 그래서 창업가에게 대단한 희열을 준다. 그러나 그 희열은 뜻밖에도 짧다. 혁신의 과정은 지루하고 고단하다. 순간의 희열 밑바닥에는, 정도는 다를지라도 반복해서 오는 지루함과 고단함이 있을 것이다. 그 한계를 뛰어넘었던,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창업가들은 대부분 ‘성실’을 지팡이로 삼았다. 고철환 서울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직업이나 순간의 희열 밑바닥에는, 비록 그 정도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오는 지루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계를 뛰어넘었던, 우리에게 프로처럼 비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실’을 프로의 도구로 사용했음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으리라.”(고철환, 1990년 호남정유 사보)

[산타와 그 적들](2013, 굿모닝미디어), 81~84페이지 가운데 발췌
다음 책 ㅣ 알라딘 ㅣ 교보문고 ㅣ 예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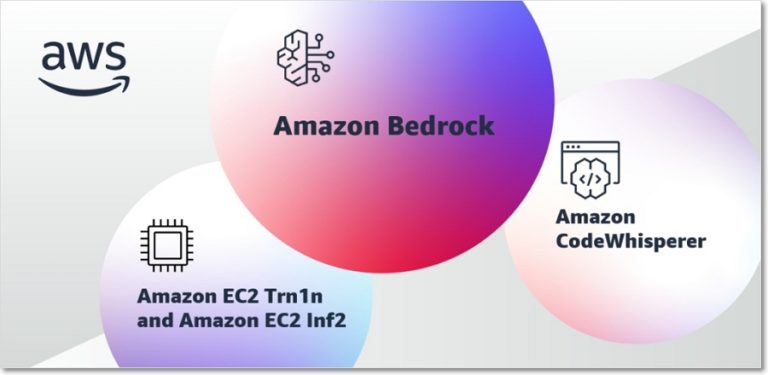
잘봤습니다.
수제비누로 세상을 바꿨다기 보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해야겠군여.
하나 삐딱하게보자면 마냥 찬양일색인 글은
왠지 좀 공감하다 말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이 이타적인 비지니스라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글에서 성실로 표현된 것은 어찌보면 일 밖에 모르는
지금 우리의 자화상을 찬미하는거 같아 속이 뒤틀립니다.
(난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 싶거든여 ㅎ).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답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곧 비누를 사야하는데 셈크레프트를 이용해야 겠어요.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좋은 제품을 소비한다는 느낌이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