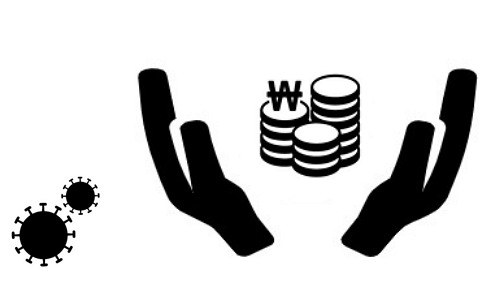소련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심이 많고, 소련스러운 아름다움(?)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100년도 못 버텼던 소련은 분명 실패한 국가였다.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였는데, 그런 나라치고는 당당히 당시 초강대국 미국과 냉전을 벌인 주인공이기도 했었다.
[처형당한 엔지니어의 유령]은 거대한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좋은 논픽션이다. 소련 초기(스탈린 집권 초기), 기술과 사회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제대로 일하기’를 강조하다가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처형당한 엔지니어, 표트르 팔친스키(Пётр Иоакимович Пальчинский)[footnote]주석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 팔친스키의 영문 표기에 대한 해명(?)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의 러시아어 음역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오히려 영어권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표준’ 표기법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기 힘든 법이다.[/footnote]의 일대기이다.
![표트르 팔친스키 (Russian: Пётр Иоаки́мович (Аки́мович) Пальчи́нский; 9 October [O.S. 27 September] 1875–22 May 1929)](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9/12/Palchinskiy_PA.jpg)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인문 사회계는 일단 반동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고, 대체로 공산주의 저작물 외에는 거의 교육이 없기도 했었다. 전공자들에게 일종의 ‘유리 천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공계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이공계 전공자들이 반동분자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므로, 이들을 공학자로 키우기보다는 정말 세부적인 전공만 가르쳐서 엔지니어로 육성하고, 그들을 당 내부에서 승진시켰다. 엔지니어들도 그를 알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얼마나 세부적인 전공만 하냐면, 저자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침내 어느 날 모스크바 근교로 소풍을 나갔는데 자신을 엔지니어로 소개하는 젊은 여성을 한 명 만났다. 어떤 유형인지 물었더니 ‘제지 공장용 볼 베어링 엔지니어’라 답했다. 그래서 내가 “기계공학 엔지니어군요?” 라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제지 공장용 볼 베어링 엔지니어’라 다시 답했다.
믿을 수 없어서 설마 ‘제지 공장용 볼 베어링 학위’를 받았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그 학위를 받았다고 답했다.” (p. 121-122)

로렌 R. 그레이엄 지음 | 최형섭 옮김 | 역사인 | 2017 (원작: 1993)
대단히 편협한 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은 테크노크라트들이 당 지도자로 성장했다. 1986년 소련공산당 정치국에서 기술 교육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의 비중이 89%였다고 한다. 최고위층이 대부분 엔지니어였던 셈이다. 물론 미국도 엔지니어 출신 대통령이 없진 않았다. 허버트 후버가 그 주인공(?)이다. 그리고 후버 임기(1929-1933)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세계대공황’).
앞서 언급했지만, 이들은 상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로지 생산량 목표 달성과 초과에만 신경썼다. 가령, 최초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는 협조적인 사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자본주의자들[footnote]월드 와이드 웹을 탄생시키고, 거기에 어떤 배타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은 팀 버너스-리를 비롯한 소위 ‘인터넷의 아버지’들.(편집자)[/footnote] 덕분에 태어났다. 경쟁 위주의 자본주의자들처럼 행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낳은 것이 아니었다.[footnote]참조하면 좋은 글: ‘소비에트 인테르니옛’[/footnote] 소련 지도층은 엄한 곳에서만 자본주의식 경쟁을 부추긴 것이다.
그렇지만 ‘엔지니어식’ 사고방식이 지배했기 때문에 소련이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구차하다. 당연히 소련 실패의 핵심은 오로지 영광만을 보이려 하고,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실무자들 의견과 전혀 관계 없이 상층부의 정치적 판단만이 절대적으로 옳았던 점에 있었다. 달 착륙에서 소련이 진 것도 결국 같은 이유다.[footnote]참고하면 좋은 글: 소련은 어째서 미국에게 우주개발을 뒤졌는가.[/footnote] 팔친스키가 숙청된 이유는 다름 아닌 ‘팩트 폭력’을 너무 많이 휘둘러서였기 때문이리라.

바로 이러한 실패의 요소들이 비단 소련에만 있었을까? 이게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이다. 소련이라는 단어를 지우자. 오로지 잘 된 것만 보여주고 싶고, 실패나 실수를 위에서 용납하지 않으며, 실무자 의견은 도외시하고, ‘윗분’의 판단만 그대로 따른다. 그렇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소련과 그리 멀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여기저기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