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강단에서의 시야
첫 강의를 시작하던 날, 강단 위에 올라선 나는 무척 놀라운 경험을 했다. 고작 한 뼘 높이의 강단에 올라서니 강의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30여 명 학생의 표정과 몸짓까지 모두, 그것은 나를 향한 호감이나 적대감까지 전달될 만큼 선명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두려움과 긴장감 때문일 것이라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강단에서의 시야는 모두에게 닿았다. 그래서 모두와 소통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우선 들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떠한 배신감이 찾아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커졌다.

선생님의 시선 ‘바깥’에 있는 아이
초·중·고 학창시절의 나는 그다지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다. 손을 들고 제대로 발표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탓도 있겠지만, 용기 내어 손을 들었을 때 나를 지목해 준 선생님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선생님들은 항상 몇몇 특정 학생과 눈을 마주치며 수업을 했다. 발표도, 칭찬도, 모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시야 바깥의 학생들이 손을 드는 것을, 그 선생님들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어느새 내 역할은 그저 조용히 자리를 채우는 이름 없는 학생으로 구획되었다. 나는 대개 이름보다는 무작위 번호로, 혹은 ‘너’라는 인칭 대명사로 불렸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지금은 한 반 정원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반마다 50여 명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탐색하기는 무척 힘든 일일 테니 면대면 수업을 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미뤄 짐작했을 뿐이다. 어린 나이에 그러한 배려를 하고, 일찌감치 발표를 포기할 만큼, 나는 다수 학생과 함께 강단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초등학생 시절,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S’
초등학교 시절, 교무실에서 언젠가 교사들의 대화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다.
“6학년 3반 S학생은 참 수업 태도가 좋아요”
“네, 3반은 S학생만 보고 수업하면 되니까 참 편하죠.”
서른이 넘어서도 어떤 오래된 상황이나 대화가 그 분위기와 질감까지 선명히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나에겐 이것이 그중 하나다. S는 무척 우수한 학생이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녹색어머니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셨다.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겨서, 많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때 나는 ‘나도 S 같은 학생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강단 위에 서 보니, 실제로 S와 같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학생이 몇몇 있었다. 그들은 대개 앞자리에 앉았고,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들었으며, 내가 질문하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나를 향한 호감의 눈빛도 아낌없이 주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 무척 사랑스러운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그 적극적인 태도를 존중하며, 나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기대고자 한다면 강의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그 순간 강의실은 그저 몇몇 특정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된다. 무엇보다도 눈에 먼저 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들의 성실함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 모두를 위한 다짐
성실함이란 강의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유하는가의 정도로 측정되어야 한다. 강의실에 앉은 그 누구라도, 들러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를 해 나가며, 몇 가지 다짐을 만들었다.
① 모두에게 공평한 시선을 주기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거나 몸을 기울이거나 하는 것을 되도록 피했다. 특히 질문할 때는 고개를 좌에서 우로 의식적으로 돌려가며, 모두에게 시선을 주려 노력했다. 어느 특정 학생에게 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무언의 전달이었다. 누군가 의견을 발표할 때도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며 그들의 반응을 함께 살폈다.
② 모두의 움직임을 기억하기
손을 든 모든 학생을 기억했다. 예컨대 약간의 순을 두고 5명이 함께 손을 들었다면, 그 5명의 순서와 이름을 모두 새겨 넣었다. 그리고 순서대로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그에 더해 손을 들다가 말았다든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청했다.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A학생도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발표해 주십시오”
손을 들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서 발화의 가능성을 감지하면 그런 식으로 에둘러 물었고, 대개 해당 학생은 좋은 발표를 해 주었다.
③ 학생 간 위계를 만들어 내지 않기
강의실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내가 어느 특정 학생들에게 집중한다면 그것은 노골적인 ‘편애’가 된다. 학생 간 갑과 을의 위계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강사들을 나는 많이 보아 왔다. 그러면 강의실은 더는 집단지성의 실험실이 아니며, 틀에 박힌 죽은 공간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채 ‘을’로 밀려나 들러리가 된다. 강의실에는 ‘갑’만 존재해야 한다.
인기 인문학 강사에게 실망한 이유
위와 같은 다짐을 한 것은,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시선을 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잠시 긴장을 풀면 어느새 항상 손을 드는 몇몇과 소통하고 있기도 했고, 시야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지루한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도 했다. ‘오늘 강의는 참 학생들 반응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어’ 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돌아보게 했다.
연구실로 돌아가며 그날 강의를 복기하며 몇몇 학생의 얼굴만 떠오른다면, 몇몇 학생의 얼굴과 이름이 흐릿하다면, 나는 그날 가장 나쁜 강의를 한 것이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그 날 강의실에 있었던 모두의 얼굴이, 발언이, 몸짓이, 점점이 떠올라 전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강의’를 한 것이다.

강의를 시작했던 학기에, 나는 서울에 대중 인문학 강좌를 들으러 다녔다. 인기가 많은 강사여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수강생만 매주 100명이 넘었다. 강의는 수강생들의 질문에 강사가 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배우는 것이 많아서,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서울을 왕복하는 수고가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곧 강사에게 실망했다. 그의 시야가 고작 20여 명에 한정된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질문을 위해 세 번이나 손을 들었지만, 한 번도 그의 시야에 들지 못했다. 강사의 선택은 무척이나 즉흥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좋은 인문학 강의를 하고는 있으나, 인문학적 인간은 아니라 규정했고, 곧 수강을 그만두었다. 내가 강단에 서기 이전이었다면 별로 상관하지 않았겠지만, “당신은 나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학생들 모두가 빛날 때
강의실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학생들이 ‘반짝반짝’할 때다. 좁은 시야에 갇힌 몇몇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반짝임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다. 그것은 어떤 감성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에게 가능성이 부여되었음을 자각하고,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를 반짝이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것이 인문학을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아니 모든 학교의 교실에서 지향해야 할 바다.

강의실이 존재하는 것은 교수자와 학생이 서로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을 마주치고, 교감하고, 소통하기에 강의실은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인터넷 강의로 모든 수업을 대체하는 편이 낫다. 모든 학생에게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교무실에서 들었던 그 대화를 앞으로도 오래 기억하려 한다. 애쓰지 않아도 종종 기억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인간으로 강의실에 존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비롯해 강의실 안 모든 학생에게 자신이 시선을 나누어 주었던 모든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와 함께 존경을 보낸다. 모든 학생이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 자신을 성찰하고 가능성을 키워 나갈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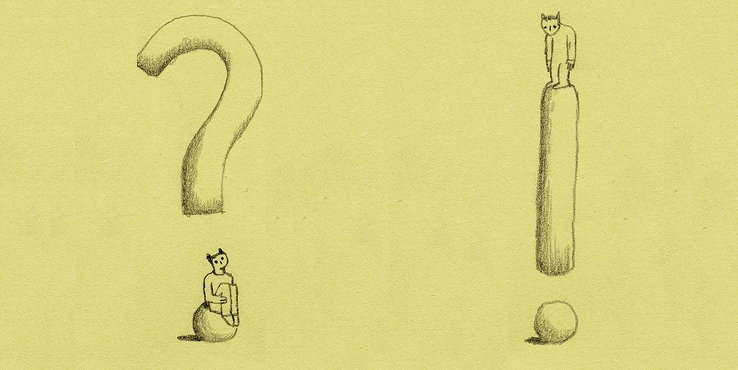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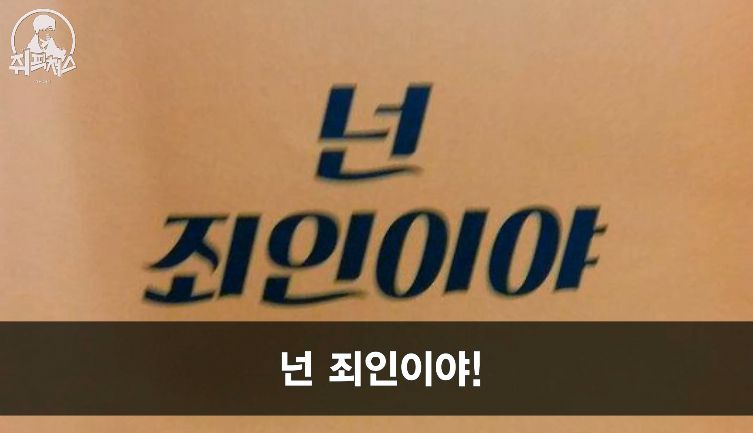
시즌1부터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 인문학적 교수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지 글 잘 읽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ㅎ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따뜻한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