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여름, 나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수료생’의 신분이 되었다. 대학원 수업은 여전히 개설되었지만 나는 수강 자격이 없었고, 조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장학금의 근거가 없어진 나는 함께 일할 수 없었다. 연구실에 기계적으로 출근해 논문을 읽고 공부하기는 했으나 내 포지션을 명확히 하기 힘들었다. 무언가 막막하고 멍한 기분이 몇 개월간 이어졌다.
사실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로 이미 좁혀져 있었다.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다. 논문을 써야 비로소 시간강사 이후의 자리에 이력서를 넣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인문학 연구자는 박사 논문까지 보통 수료 후 4~5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주제를 확정한 것도 아니어서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대학국어 강의 제안
수료하고 어영부영 한 학기가 지났을 무렵,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1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국어 강의를 한 과목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언젠가 ‘강의’를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둘째 치고 학기의 시작이 불과 일주일 남았던 때다.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 두 학기 후배인 조교실장에게 슬쩍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대학원 새내기 때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조교실장도 이제는 후배가 맡아 하고 있을 만큼,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있었다. 후배는 어떤 선생님께서 갑자기 강의를 못 맡게 돼서 곤란한 상황인데 학과장님이 형에게 한번 맡겨 보라 하셨다고 했다. 나는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몇 편의 학진등재지 논문이 있어 강사 자격은 충분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라도 감사한 제의였다. 수료생이 되고 몇 년 동안 강의를 맡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호의가 베풀어진 데 대해 감사히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정말로 곤란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조교실장은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강의가 두려웠다
사실 나는 강의가 너무나 두려웠다. 박사과정을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강의’였다. ‘연구’와 ‘강의’는 대학 제도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데, 나는 연구는 정말로 좋았지만, 강의에는 자신이 없었다. 대중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여러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입이 굳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도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횡설수설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나만 바라보는 50여 명 앞에 서서 강의를 해야 한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 언젠가 한 학기 선배 L에게 말했다.
“나 연구만 하고 강의는 안 할 수 없을까.”
나는 강의만 하고 싶은데 나랑 바꾸면 좋겠다.”
옥상 휴게실에 앉아 넋 놓고 하는 이야기여서 물론 농담이었지만, 사람마다 자신 있는 영역이 다른 법이다. 무엇보다도 고작 1주 동안 갑자기 ‘가르칠 것’이 나올 리도 없다. 수업계획서를 짤 시간조차 버거운 새내기 강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다. 강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망칠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리라 생각했다.
“저기 미안한데 강의는 못 맡겠어. 학과장 선생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학과 사무실을 나섰다. 조교실장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며 나를 만류했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선배 한 명이 나에게 미쳤느냐는 말까지 했지만, 나는 그냥 한 번 씩 웃고 학과장실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때까지 위에서 내려온 어떤 ‘임무’에 대해 토를 달거나 거역해 본 일이 없었다. 그저 일하다 힘들면 “이 지겨운 거 언제 끝나나요?”하고 농담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웃으며 푸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나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이었기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었다.
학과장실 문패가 ‘재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노크한 뒤에 문을 열었다.

“조교실장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맡기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학과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니,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아직 강의를 맡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강의안을 짤 수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한 학기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스스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학과장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말했고, 나는 “죄송합니다”는 말을 거듭하고서 물러 나왔다.
강의를 거절하고 강의 준비에 매달리다
문을 닫고 연구실로 돌아가는데 까닭 모를 현기증이 몰려 왔다. 내가 지금 뭐한 거지? 남들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운 좋게 굴러왔는데 냅다 차버렸잖아! 아마 다시는 강의 제의가 없을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다시 학과장실에 찾아가 강의하겠다고 번복할까.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가 된 것 같아 한동안 속이 쓰렸다. 내가 제의받았던 강의 자리는 다른 선배가 한 과목을 더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뭔가 거창하게 포장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강의 공포증이 표면화된 결과여서 그저 부끄럽다. 내가 언제든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면,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강의 제의를 고사하고 나는 역설적으로 ‘강의’ 준비에 매달렸다.
‘대학국어’는 1학년 학부생에게 제도권의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양 수업이다.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런 것을 한 학기를 두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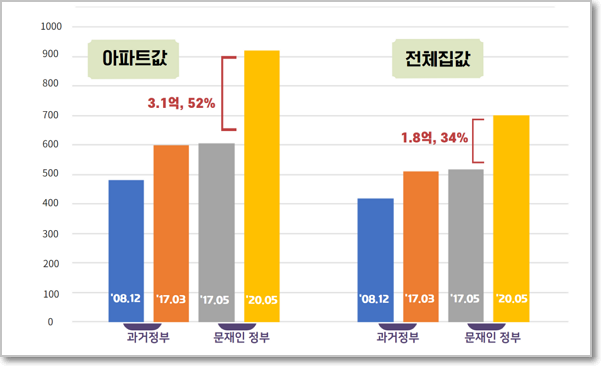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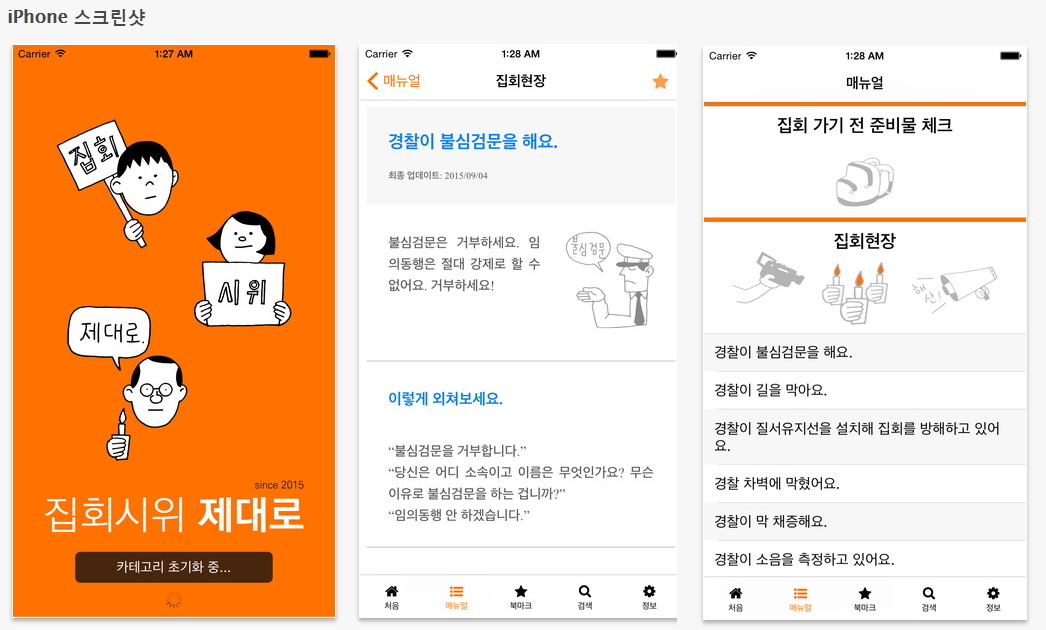


글이 재미있네요. 대단한 결정 하셨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