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가 있었다. 해박한 지식과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많지 않은 나이에 사회사상이나 철학을 다룬 책도 몇 권 냈다.
어느 날 선배의 사무실에 다니러 갔다가, 그가 책상 위에 펼쳐둔 파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얼핏 보니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파일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라든가 정치권 동향 같은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을 줄 알았다.
선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천천히 파일을 넘겨보았다. 그런데 웬걸, 갈피에 빼곡히 찬 기사 조각들은 모두 사회면에 실린 소소한 사건 소식이었다. 누가 누구와 다투다 칼로 찔러 죽였다,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다, 누가 살인강도를 만나 금품을 빼앗기고 살해되었다, 누가 누구와 싸운 끝에 불을 질렀다, 누가 달려오는 지하철 앞에 몸을 던졌다, 누가 불특정 다수를 해칠 목적으로 독약이 든 음료를 방치했다, 누가 채소 값이 떨어지자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파일에 가득 찬 이런 기사를 보며 나는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담. 한 달도 되기 전에 파일 한 권씩 차겠구먼.
이 소식들은 작다면 작은 소식이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우리 같은 사람. 그들이 벌이거나 당한 불행한 사건은 세상의 한구석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 뉴스의 당사자에게는 한 세상이 닫히는 절체절명의 일이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무덤덤하게 읽히고 금방 잊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사회면 기사 속에서 죽고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은, 선배가 쫓던 거대한 주제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선배에게 왜 그런 기사를 스크랩하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다.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했다. 그 선배는 모아둔 기사 파일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글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선배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일상의 죽음이 피로써 증언하는 사회 부조리
인간의 죽음은 모두 사회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죽음에서 사회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꼭꼭 숨어서 자살한 사람의 죽음에서도, 아직 사회적 자아도 생기지 않은 어린이가 숨진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심지어 천수를 누리고 호상으로 돌아가신 이의 죽음에서조차 일정한 사회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각종 사건으로 발생하는 죽음이나 스스로 마감하는 죽음은 그중에서도 사회적 의미가 가장 큰 죽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개인의 실패, 좌절, 곤궁, 분노, 낙심, 절망, 불화, 개인 간의 갈등이지만, 그 뒤에는 이러한 죽음을 불러온 사회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면에 실리는 소소한 죽음들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부조리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나라를 좀먹는 정치인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 속에는 사람의 피와 살이 빠져 있다. 잘못된 정책, 부조리한 정치, 무능한 정치인이 어떻게 살아 숨 쉬는 사람의 목을 조이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부조리한 정치, 무능한 정치인이란, 실제로는 처절하고 참담한 일인데도, 농담처럼 비판하고 농담처럼 비난한다.
신문 사회면의 자잘한 기사들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준다. 기사 속에서 살인하고 살해당하고 자살하는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가 드리우는 검은 그림자를 생생하게 꺼내어 펼쳐 보여준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옥죄는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가, 실패, 좌절, 곤궁, 분노, 낙심, 개인 간의 갈등이라는 모습을 하고 독을 품은 채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그 선배의 기사 스크랩이 가진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모든 죽음에는 사회적 의미가 깃들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서였다. 선배는 아마도 작은 조각을 어루만지며 큰 그림을 쫓고 있었던 듯하다. 부분이 흔들리고 허물어져 가는 현상에서 전체의 병폐를 읽어내려고 했을 것이다.
비슷한 사람끼리만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죽어도 바뀌는 것은 별로 없다. 인기 연예인이 죽으면 화들짝 놀라며, 이참에 법이라도 하나 만드세 하고 바짓가랑이 걷고 나서지만, 소처럼 살아온 농민이 소값이 떨어져 농약을 들이켜고 죽어도, 아이에게 새 신을 사줄 형편이 못 되는 어미가 제 가슴을 할퀴며 죽어도, 좌절한 젊은이가 자신과 똑같이 좌절한, 고시도 보지 않으면서 고시원 쪽방에 깃들어 사는 이웃을 불지르고 죽여도,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삼 년을 싸우고 두 달을 단식하고 하늘에도 올라가고 땅속에도 들어가 봐도, 힘 있는 자는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비슷한 사람끼리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한다.

최근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전해져 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울림이 컸던지, 사회적 죽음의 책임자인 정치인들도 슬퍼했으며 복지를 공약(公約)했다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하루에 39명이나 된다. 세 모녀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 이 간접적 가해자들은, 그 날 세상을 떠났을 나머지 36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감하고 둔감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바로 그 구조가 타인의 비극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술한 사회 안전망은 그대로인 채 이벤트처럼 안타까워하고 돌아서면 잊는 일이 반복되는 동안, 죽는 사람은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죽는다. 부모가 일하러 나가는 바람에 돌볼 사람이 없어 집에 갇힌 아이들이 불타 숨진 1990년 서울 마포의 비극은 20년이나 지난 2010년 경남 마산에서도, 또 2012년 경기 파주에서도 마치 1990년인 것처럼 똑같이 벌어진다.
우리의 죽음은 패배자가 도태되는 과정인가
독일 영화 [타인의 삶]은 동독 비밀경찰이었던 주인공이 한 극작가를 집중 감시하며 겪는 일을 그린다. 극작가는 절친한 연출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동독의 높은 자살률을 고발하는 글을 써서 비밀리에 서방에 공개한다. 병적으로 높던 자살률, 그것은 동독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나를 생생히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자살하는 사람은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죽지만, 그 죽음들의 기저에 공약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라 할 수 있다. 극작가는 자살률 수치에서 동독 체제의 구조적 병폐를 읽어낸 셈이다.
 에서 동독 비밀경찰 주인공 비즐러(울리쉬 뮤흐 연기)는 자신이 감시하는 극작가가 동독의 자살에 관한 글을 써 서방에 공개하는 일을 방조하게 된다.](https://slownews.kr/wp-content/uploads/2014/03/otherslife.jpg)
남을 밟아 누르는 경쟁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 꿈이라는 헛풍선을 아무리 불어도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경쟁에 패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좌절하고 분노하거나 죽을 자유만 주어지는 현실.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한강 다리에 글귀를 붙이고 번개탄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인가.
국가란 일부의, 일부를 위한, 일부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다. 잘먹고 잘사는 이들은 국가가 없어도 깡패로 보디가드 세워 가며 잘먹고 잘산다.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곤궁한 삶을 지탱하는 대다수 국민을 돌아보라고 있는 것이 국가다. 가진 자들이 달러로 터져나가는 장롱이나 더 채우라고 국민이 정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안녕들 하십니까’와 ‘죄송합니다’로 상징되는 지금의 두 비극은, 우리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절망의 너울에 대한 두 개의 항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 명의 죽음이 드러낸 문제에만 주목하여 패치를 붙이는 방식으로는 나머지 36명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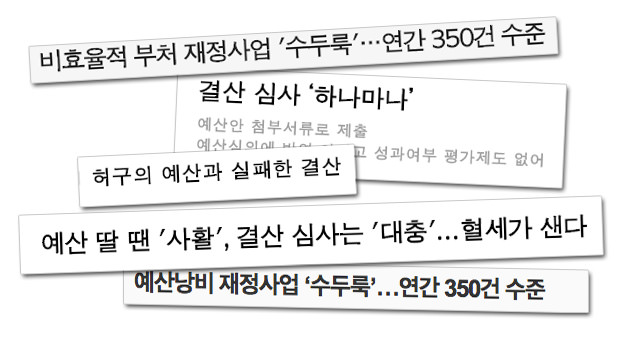


그날 전세계에서 수천명이 굶어죽었는데 그건 모르시나요?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기만 합니다 ᆢ살기싫은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휼륭한글입니다. 마음속깊이공감삽니다.
죽음이라는 결말을 맺지 못한체
‘이런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라고쓴
개인의 실패, 좌절, 곤궁, 분노, 낙심, 절망, 불화, 개 인 간의 갈등 등으로
극한 고통 속에 오늘을 보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