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툭 한 차례 쳤어요!”가 화제다.
허리 하니까 생각난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킬라였다.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에서 스킬라는 암초 속 동굴에 서식하며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납치해다 잡아먹는 엽기적인 몬스터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에 따르면 원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가 연적인 키르케 여신의 미움을 사서 괴물로 탈바꿈한 전형적인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하다. 문헌마다 스킬라의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관된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면 아랫도리에 무시무시한 개 대가리 여러 개가 촉수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것이다. [변신]에 나온 묘사는 이렇다.
- illa feris atram canibus succingitur alvum, (오비디우스, 제13권 732행)
- Scylla’s dark waist is girt with savage dogs (Brookes More 번역, 1922년)
- 후자는 시커먼 허리에 사나운 개떼를 두르고 있다 (천병희 역, 2005년)

스킬라의 생김새 번역에 의문을 품다
예전에 번역본을 접했을 때 나는 왜 허리가 검어야 하는지 도통 납득이 가지 않았다. 허리는 잘록할 수도 있고 두리뭉실할 수도 있고 육감적이고 에로틱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 색깔은 관심사가 아니다. 원문을 찾아보니 두 번역자가 허리(waist)라고 옮긴 원문의 라틴어 단어는 알부스(alvus)였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허리’가 아니라 ‘배’다. 자궁과 창자를 품고 있어 소화나 배변, 임신과 관련되는 신체 부위 말이다. 허리와 달리 배는 제 속에 항상 복잡한 뭔가를 품고 있고 그 부피감 때문에 색깔이 배기도 하고 그림자가 지기도 하며 또 다른 존재를 산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해서 이 오역을 바로잡아 보자면, ‘시커먼 허리’든 ‘시커먼 배’든 우리말로 이상하긴 마찬가지니(배가 시커멓다고 하면 뱃속이 검다는 뜻과 혼동될 수 있으니까) ‘거무튀튀한 아랫배’쯤?
더 나아가 ‘검다’는 데서 힌트를 얻으면 음모가 무성한 불두덩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오딧세이아]를 보면 각각의 대가리마다 세 줄의 이빨이 단단하고 촘촘하게 나 있다고 되어 있다(12권 91행). 아마도 위쪽 잇몸에 석 줄, 아래 잇몸에 석 줄씩 이빨이 박혀 있다는 뜻이겠다. 이건 십중팔구 남자 성기를 물어뜯는 여성의 음부, ‘이빨 난 바기나'(vagina dentata), 거세 공포의 상징으로 볼 만하다. 최근의 영역본을 검색해 보니 알부스를 사타구니(groin)로 옮긴 번역도 있다.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스킬라에게 좀 더 전투성을 부여하면서 사전을 존중한 내 번역은 이렇다.
스킬라는 거무튀튀한 아랫배에 사나운 개떼를 장착하고 있다
근 100년 전의 영어 번역자가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꽤나 곤혹스러워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19세기에 만들어진 사전(Lewis & Short Latin Dic.)에조차 엄연히 나와 있는 뜻풀이를 비껴가면서까지 ‘배’를 ‘허리’라고 옮긴 까닭은 번역자가 이 문장에서 왠지 배가 허리보다 외설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한참 뒷날 2000년대 초반에 와서 천병희 교수마저 이것을 ‘허리’라고 옮겼던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다. 성실하기로 이름난 번역가가 여기선 어째서 사전을 떠나서 비약했나? 외람되지만 천병희 교수의 연세를 고려해 볼 때 혹시 그분도 허리 아래의 앞뒤 모든 부위를 통틀어 점잖게 허리로 통칭하는, 마치 여성의 허리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일군의 허리상학적 인간형에 속해 있었던가?
허리상학적 인간형: 진솔한 소통을 방해하는 권력들
흔한 현상이다. 엄연히 개별적인 대상들을 하나로 뭉뚱그리거나 교묘하게 물타기를 함으로써 진솔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봉건적인 권력들 말이다. 예를 들어 풍부한 19금 보캐뷸러리를 자랑하는 라틴어에서 이루마토르(irrumator)는 오럴 섹스를 하는 사람, 특히 남자 파트너에게 펠라치오를 시키는 남자를 가리키는데, 19세기의 사전은 이것을 ‘짐승과도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로 우회시켜 풀이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전 찾는 사람은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저지르는 음란 행위가 어디 한두 가진가.
뭐 옛날 관행은 그렇다치고, 요즘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자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겐 모종의 단어를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무조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불미스럽다’ 항목은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한 데가 있다’고 풀이돼 있는데, 이런 하나마나한 풀이는 19세기 라틴어 사전이나 다를 바 없이 한심하고 비루하다. ‘주로 성범죄나 성추문을 가리키는 관료주의적 은어’라는 설명을 추천한다.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엔하위키가 필요하다.
윤창중 씨는 기자회견에서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쳤”을 뿐이라고 했다. 아마도 격려의 차원에서 ‘등허리’를 친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 주길 바랐을 것이다. 허리라고 하면 퍽 애매해서 옆구리도 허리에 속하고 등허리도 허리에 속하니 ‘대충 상반신과 하반신의 경계 언저리면 다 허리 아니냐’고 뻗치기를 시전하려는 것인지? 이 흐리멍덩한 단어 선택을 제외하면 사실 윤씨의 기자회견은 세부묘사가 풍부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식권이며 비닐팩 소주며 과자 부스러기며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꼼꼼하게 호출하는 한편 ‘술로 시차를 극복해야겠다’든가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같이 실감 나는 대사를 그때그때 인용해 가며 무슨 변사라도 되는 양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늘어놓는 이 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디테일은 절박한 자의 영역이라는 것.
절박한 사람에겐 자구 하나하나의 무게가 천근과도 같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온갖 세부사항을 있는 대로 나열한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다시피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들은 강약 없고 요령 없는 갖가지 디테일들로 점철돼 있다. 이 디테일이 전달되지 않을 때, 작은 차이가 싸잡아 무시될 때 당사자는 절망한다. 윤씨도 나름 자신의 절박함을 온갖 디테일을 동원해서 전달하려 했지만 그 대부분은 진실에서 시선을 따돌리려는 의도로 고안된 맥거핀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자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는 관료들의 어법 속에서 스킬라의 허리 아래처럼 모호하게 감추어진다. 소시민의 일상은 허리 아래를 죄다 퉁쳐서 허리라고 부르는 작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치사한 싸움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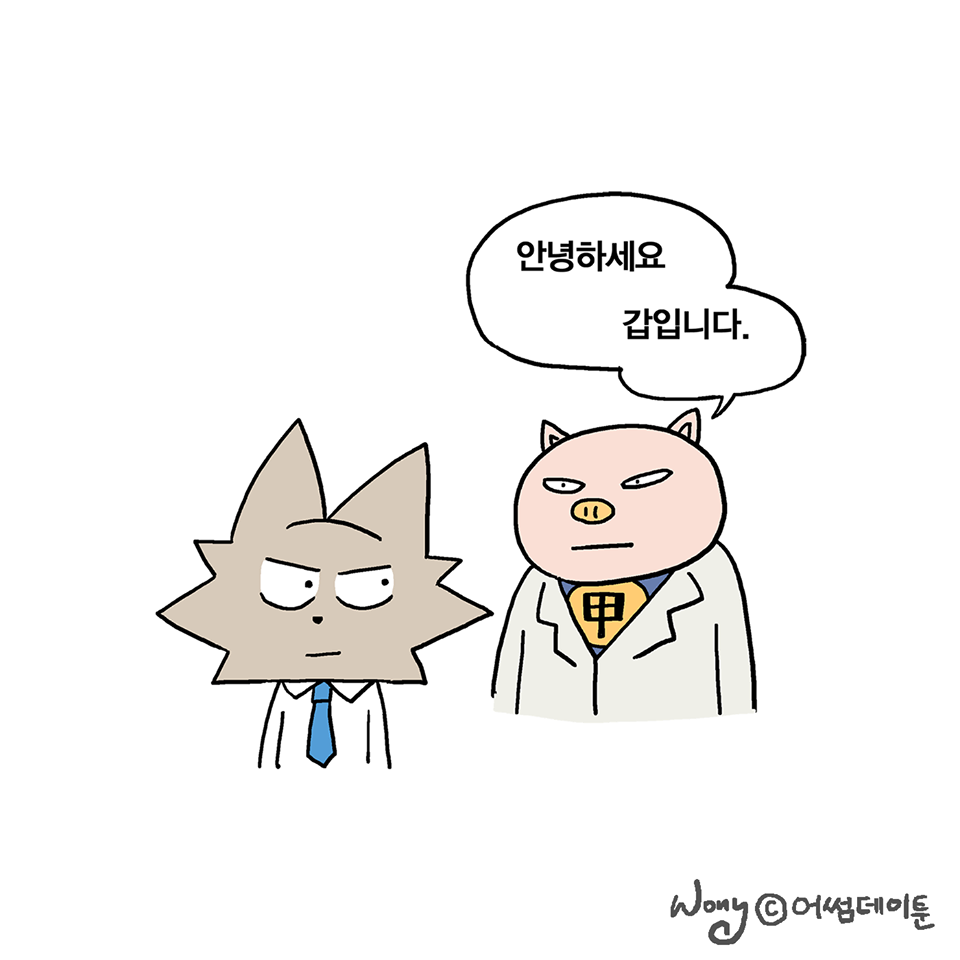

첫 댓글
댓글이 닫혔습니다.